
김영남(49) 시인에게 푸른 빛깔은 슬픔이지만 한편으로는 평화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그의 슬픔은 통곡의 고통과는 달라서 평화에 이르기 위해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의례와도 같은 감정이다. 그래서 그에게 푸른 밤은 ‘둥근 평화’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슬픔의 터널이 된다. 그 지난한 여로가 담긴 세 번째 시집 ‘푸른 밤의 여로’(
문학과지성사)는 푸르고 아늑하다.
“구두가 미리 알고 걸음을 멈추는 곳, 여긴 푸른 밤의 끝인 마량이야, 이곳에 이르니 그리움이 죽고 달도 반쪽으로 죽는구나. 포구는 역시 슬픈 반달이야. 그러나 정말 둥근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내 고향도 바로 여기 부근이야.”(‘푸른 밤의 여로- 강진에서 마량까지’ 부분)
푸른 밤의 끝 ‘마량’은 시인의 고향인 전남 장흥의 바닷가 포구 이름이다. 첫 시집 ‘
정동진역’과 두 번째 시집 ‘
모슬포 사랑’을 내면서 길게 뒤척이던 세월을 지나 고향 포구에 돌아온 시인은 이제 그리움도 죽이고 회한도 버리려 한다. 그렇지만 그가 지나온 길의 들끓는 여정이 없었다면 푸른 밤도 맞을 수 없었다. 그 여정에 대한 기록이 이 시집에 수록된 편편이요, 그 편편에 푸르게 채색된 시인의 감성이 이 시집을 환하게 빛낸다.
“비가 내린다, 비가/ 떠난 그녀가 좋아하던 봄비가 내린다./ 삼각지에 내리고, 노량진에 내리고, 내 창에도 내린다.// 내 창에 내리는 비는 지금/ 고년! 미운 년! 몹쓸 년! 하면서 내린다./ 머리끄덩이를 잡고 끌면서……길게 내린다.”(‘고년! 하면서 비가 내린다’ 부분)
길게 신음하면서 내리는 비, 그 비를 바라보며 미칠 것 같은 그리움을 달래는 시인의 고통은 짐짓 ‘고년!’이라는 속울음 같은 호통으로 미봉하려 하지만 그렇다고 쉬 평화가 찾아들지는 않는다. 그러니 “벚꽃 소리없이 피어/ 몸이 몹시 시끄러운 이런 봄날에는/ 문 닫아걸고 아침도 안 먹고 누워 있겠네”(‘저 벚꽃의 그리움으로’ 부분)라고 탄식할 수밖에. 그리움만 시인을 괴롭히는 건 아니다. 생계라는 밧줄에 목이 매인 장삼이사의 일상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현실의 고통마저 푸르디푸르게 채색하는 시인의 감성은 도심 한복판에서도 새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힘이다.
“잔바람이 아침 햇살을 돌리는 갈참나무숲 노래방. 이 노래방에는 밀실도 고급 음향기기도 없는데 나뭇가지 사이의 노래가 내 몸 구석구석까지 더듬는다. 더듬다가 웃옷을 벗기고 날 눕힌다. 황홀한 하늘도 보게 한다. 내 잠시 숲과 함께 몸을 부르르 떠는 사이, 어느새 뻐꾸기 마이크가 휘파람새 마이크로 바뀐다. 마치 폭스토롯풍이 발라드풍으로 바뀌듯. 새들 노래방에서는 이슬도 알몸이 되어 뒹군다.”(‘갈참나무숲 노래방으로 오라’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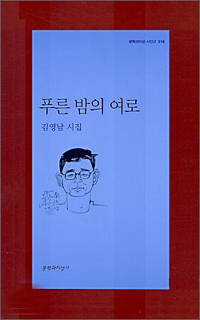
‘이 세상에 없는 그리운 음악’을 듣고 ‘엄마의 분홍치마’ 속에서 잠을 청하려는 시인의 감성은 아무리 어두운 빛깔이라도 푸른 시로 승화시켜 낸다. 그리하여 시인은 짐짓 “푸른 밤을 푸르게 가야 한다는 건 또 얼마나 슬픈 거고 내가 나를 아름답게 잠재워야 하는 모습이냐”고 탄식하지만, 먼길을 돌아와 고향 항구에 서서 이렇게 귀환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허름한 유리창에선 더욱 높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 찬 바람 불면 더욱 슬프게 펄럭이는 어선의 깃발.// 난 그 풍선을 잡고 먼 나라로 가고 싶다./ 항구란 배만 타는 곳이 아니라 그런 풍선을 잡고/ 더 따뜻하고 아늑한 나라로 출발하는 곳임을,/ 풍선에 바람이 빠져버리면/ 예서부터 흔들리는 귀환이 시작되는 곳임을/ 배운다, 마량항 부둣가에 고동처럼 붙어서.”(‘마량항 분홍 풍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