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멕시코에는 ‘로보캅’이 탄생했다. 여기서 로보캅은 팔꿈치에 전자태그(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이식한
라파엘로 마세도 법무장관과 그의 직속 검찰수사관 160명을 일컫는 말. 데이터 베이스를 내장한 칩을 통해 수사요원들은 항시 네트워크와 연결된다. 이 때문에 신상 관리와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소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전 독일의 유통업체 메트로그룹은 RFID 전자칩을 사용하는 슈퍼마켓을 열어 자동계산 서비스를 실현했다. 스페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는 단골 고객에게 마이크로칩을 몸 속에 넣어주는 VIP 서비스를 시행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의류업체 프라다는 미국 맨해튼 매장에서 RFID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객이 입어보는 모든 옷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저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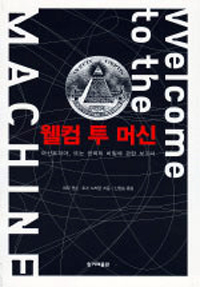 |
웰컴 투 머신/데릭 젠슨·조지 드래펀 지음/신현승 옮김/한겨레출판/1만3000원 |
RFID는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한 후 인식기기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바코드가 단순히 처음 입력된 정보를 지니는 데 그쳤다면, RFID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RFID를 일상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를 테면 기존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운전면허증, 주민증, 의료카드 등은 IC(집적회로) 내장
스마트카드 1장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스마트카드는 몸속에 쉽게 이식되는 마이크로칩으로 대체될 수 있다. 별도로 출입자 검색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개인신상이 인식되고, 병원 수속도 서류 없이 자동 처리되며, 쇼핑한 후 계산대에 머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영화 ‘메트릭스’에서 네오의 몸에 칩을 이식했다가 빼는 장면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즉석에서 신상자료가 자동 열람되고 분석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RFID뿐이 아니다. 영화 ‘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사람이 지나가면 홍채나 얼굴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바이오메트릭스’ 기술도 상용화될 것이다.
이런 세상이 편리하게만 느껴지는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존재가 인식되고, 내 정보와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 읽혀진다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내가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는 일인가. 데릭 젠슨과 조지 드래펀의 ‘웰컴 투 머신’은 인간이 기계를 통해 통제되고 감시되는 사회에 경고를 던진다.
제러미 벤덤이 설계한 ‘파놉티콘(Panopticon·원형감옥)’이 현대사회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파놉티곤에서 죄수는 불을 밝힌 환한 감옥에서 감시를 받지만, 감시자는 어두운 곳에 있기에 죄수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죄수들은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결국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권력자들은 전자태그,
나노기술, 생체인식기술, 생체공학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등에 업고 개인을 더욱 조직적이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알게 모르게 유출된 나에 관한 정보는 내가 모르는 사이 어딘가에 집중되어 있다. 정보와 기술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은 ‘안전 보장’을 내걸고 인간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파놉티콘식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부시 행정부는 그 한 예다.
책은 현대의 기계문명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편의를 위해 기계를 사용하던 인간이 역으로 기계의 지배를 받으며 단순화되고 파편화되는 현실에 경고를 던진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지은이는 기계의 횡포와 권력자의 음모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랄한 비판 끝에 내놓은 해결책은 다소 맥없다. 그러나 과학문명의 장밋빛 면만 바라보는 이들,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술과 권력의 어두운 면을 간과했던 이들이라면 읽어봐야 할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