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의 모든 사생활의 역사
빌 브라이슨 지음, 박중서 옮김 / 까치 / 2011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500여페이지의 인문서가 쉽지 않을거라 생각했지만, 처음 이 책을 받는 순간 '헉'했습니다. 일반 책보다 큰 사이즈와 촘촘한 글을 보니 아늑한것이.. 너무 욕심을 부린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책을 통해 '빌 브라이슨'을 처음 알았습니다. 책을 읽다보니 작가에 관심이 가서 그의 작품들을 찾아보았는데, 이미 유명 작가더군요. 저만 몰랐습니다. ^^;;
이 책은 작가의 이름이 아닌 '거의 모든 사생활의 역사'라는 제목에 끌려서 읽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를 배운다는 시도가 재미있기도 했는데, 특히 원제' At home'이라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의 직접적인 생활반경인 '집'에서 그 역사를 읽는다는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왠지 역사하면 일상생활과는 별개로 특별한 사건, 특별한 장소만을 생각했던것을 너무 쉽게 뒤집었다고 할까요.
발단은 노퍽주의 시골교회였습니다. 단순히 식탁에 놓여있던 소금병과 후추병을 만지다가 왜 식탁에 여러가지 양념중에 이 두개가 놓여있는지가 발단이 되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였다면, 고춧가루가 그 자기리에 더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소와 배경이 영국이다보니 영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중세 유럽 전반적인 역사를 집과 관련되서 찾아보게 되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역사인지라 작가의 속도에 따라가느라 힘들긴했어요. 초반엔 배경이 되는 장소와 연대를 설명하느라 제가 기대했던 부분과 다른것 같아 의문이 생겼는데, 홀(Hall)을 시작으로 진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처음 지냈을때, 도넛을 구입하면서 Dozen(12개)의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단위인데, 요즘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들어오면서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된것 같네요. 그동안 도넛을 사면서 왜 12개의 단위를 사용할까?하고 궁금했지만 그다지 찾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서양은 빵이 주식이듯이 빵의 중량이 정확하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중량이 정확할수 없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덤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빵 10개를 사면서 2개를 덤으로 주면, 중량이 다르더라도 처벌을 피할수 있으니 말이지요. 이렇듯 궁금했지만, 그냥 지나쳤던 주변의 일들을 찾아보는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재미가 아닌가 싶어요.
역사를 배우면서, 그 당시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생활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3명 이상의 하인을 두던 시절, 심지어 하인에게 하인을 두기도 했답니다. 예전에 읽었던 조너선 스위프트의 '하인들에게 주는 지침'이 떠오르더군요. 풍자를 가장한 독설이 가득한 책이었는데, 이렇듯 집이라는 장소가 단순하게 소규모의 사회라 생각했었는데, 어마어마한 수의 노동력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 더 놀러웠습니다. 하지만 비합리적인 일들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 브라이슨'이 말하는 사생활의 역사란, 인간이 점차 편안해지는 과정이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편리함만을 추구하다보면 그 편리함에 대한 댓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할것 입니다. 얼마나 극소수만 그 편리함을 혜택을 받고 있는지, 지금 현재에도 세계의 식량이 부족한것이 아니라 불균형한 분배로 지구 한쪽 편 어느나라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는것 을 알아야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집을 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이야기를 풀어낼수 있는지, 자칫 지루할수 있었던 글을 흥미롭게 쓴 '빌 브라이슨'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이래서 그가 유명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박학다식한 그의 글을 읽으면서, 다른작품들에도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문체가 독특하다며 원서를 읽기를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고보니 책을 읽으면서 원서로 읽으면 재미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했어요. 정말 그의 작품중에 원서로 읽고 싶은 책 하나 발견했는데, 지금은 무리겠지만 언젠가 한번 도전하고 싶네요. 암튼, 이 책 덕분에 좋은 작가를 발견한것 같아 기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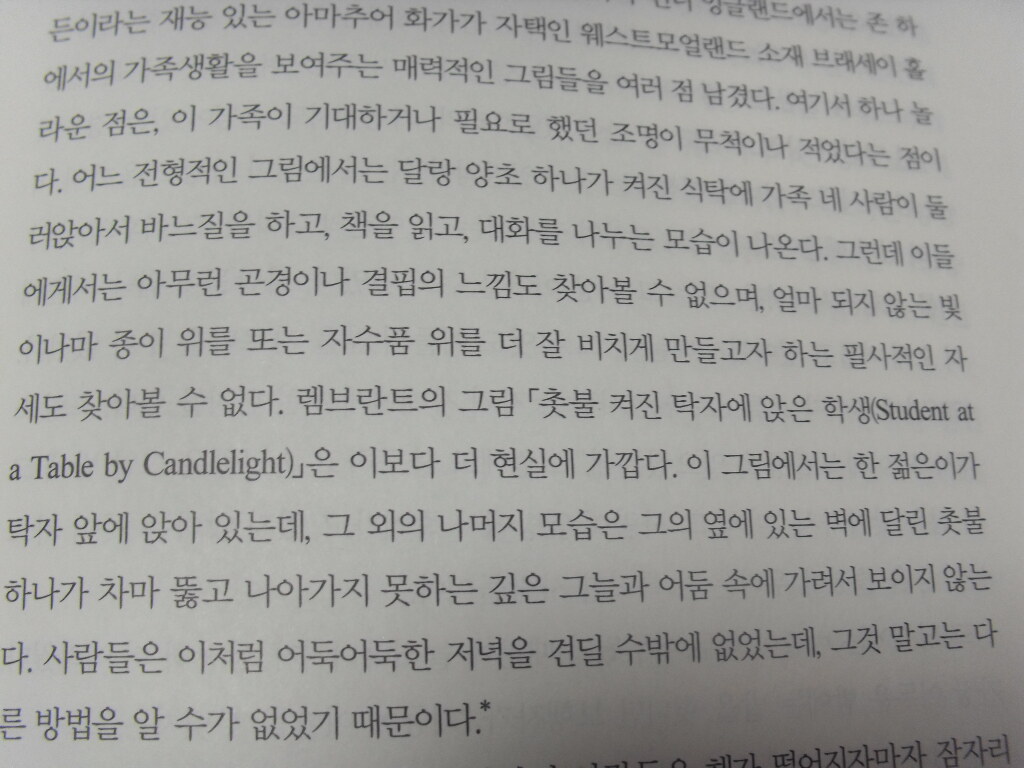
[방대한 책의 분량에 비해 수록된 삽화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시 시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에 사용된 물건이었을까요? ^^;; 무시 무시한데, 리본이 달려있으니 좀 우스꽝스럽네요.]

[극단적인 머리 장식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가채'가 떠오르긴했습니다. 시대와 장소가 다르더라도 종종 비슷한 문화를 보일때 묘한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