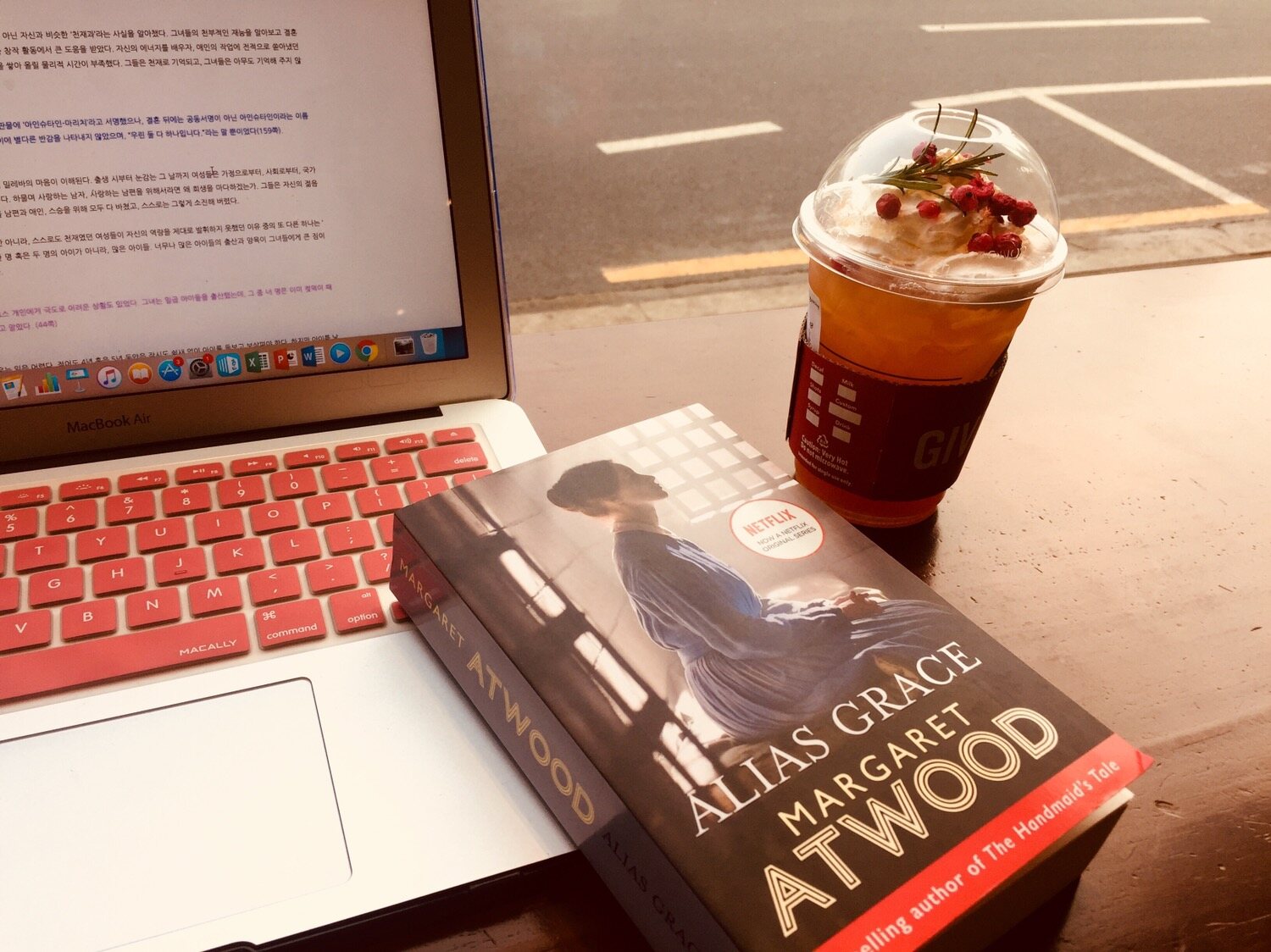나는 작년 11월에 <그녀를 보내며>를 쓰며,
‘그녀’를 그렇게 떠나 보냈는데, 이별 전에
주문한 책들이 연말 쯤 차례로 도착했다. 그래서 읽는다. 책이
왔으니.



<캘리번과 마녀>는 2017년
손에 꼽히는 책 중의 하나다.
이 책이 다루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질문은 근대 초입에
일어난 수십만 “마녀들”의 처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자본주의가 여성을 상대로 한 전쟁과 함께 시작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이다. (33쪽)
농경 사회, 자신만의 영역에서 독자성을
인정받았던 여성의 노동이 자본주의의 도입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절하되었는지, 가내부불노동이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동한 방식은 어떠했는지, ‘마녀 처형’이 유럽을
휩쓴 이후 여성의 지위에 어떤 변화가 생겨났는지를 정교하게 추적한다. 나는 2017년의 마지막을 이 책으로 장식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도서관 책을 빌려서 읽기 시작했는데, 30여 페이지를 읽고 바로
책을 주문했다.
<제2의 성>은 정희진
선생님이 여성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 외워버렸다는 말이 완벽하게 이해되는 책이다. 가히 페미니즘의 정전이라
할 만하다. 나는 여러 번 줄을 치고, 소리 내어 읽고, 그리고는 책을 덮어 숨을 골랐다. 그래야 읽을 수 있었다. 아직도(!?) 몇 백 페이지가 남아 있다. 책을 덮고 숨을 골라야 하는 순간들 역시 남아 있다 할 수 있겠다.
남자는 여자가 자기의 하녀이며 반려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관중이며 심판자이기를 기대하고, 자기를 그의 존재 속에서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여자는 무관심과 야유와 조소로 남자를 거역한다. 남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여자 속에 투입한다. 여자에 대해여 무엇을 말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은 남자가 여자 속에서 자신의 전부를 추구하고, 또한 여자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259쪽)
<양성평등에 반대한다>은 페미니즘 말, 페미니즘 언어로 싸우고 밀고 끌어가는 페미니즘 전사들의 근육을 구경할 수 있는 책이다. <제2의 성> 외우기가
불가능한 나로서는, 22쪽에서 56쪽까지 여러 번 읽어내어
1-2쪽이라도 외우는 것이 목표인데, 뭐든 끈질기게
하지 못하는 성격에 일단 한 번 더 읽기로 방향을 틀었다.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용어와 최신식 이론으로
무장한 페미니즘을 반기지는 않지만, 학문과 철학으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그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무식한 나 스스로를 탓할 뿐. 다만, 정희진님처럼 우리의 언어로 페미니즘을 설명하는,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반갑고 고마울 뿐이다.
이분법은 반반으로 분리된 상황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체와 타자가 하나로 묶인 주체 중심의 사고다… 주체(one)가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삼아 나머지 세계인 타자(the
others)를 규정하는 것, 다시 말해 명명하는 자와 명명당하는 자의 분리, 이것이 이분법(dichotomy)이다. 즉 이분법은 대칭적, 대항적, 대립적
사고가 아니라 주체 일방의 논리다. … 젠더(gender)는
남성의 여성 지배를 의미한다. 양성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성 하나만 존재한다. 남성성은 젠더가 아니다. 남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33쪽)
<맘마이스 86회>에서
평론가 김갑수씨는 “선배님의 일생을 통틀어서 나의 노래다,라고
생각되는 노래가 있으십니까?”하는 질문에, (음악과 노래가
어떻게 다른지를 잠깐 설명한 후)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에 고정되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야거나. 나는 어떤 문학작품, 어떤 책이 제일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건 좋았던 기억을 계속 가져가고, 새로운 걸 안 해요. 계~~~속
새로운 걸 접하면요, 어디에 고정되기가 거의 힘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거는 끝이 없기 때문에.”

<말하다>에서 김영하도 이렇게 말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니 이런 느낌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책을 사랑하는 것이지 특정한 어떤 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 대한 사랑은 변합니다. 때로는 이런 작가를 사랑했으나 곧 다른
작가에게 빠져듭니다. 프랑스 소설을 막 읽다가 일본 소설에 탐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예 소설은 안 읽고 역사서만 읽기도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는 영화 대사도 있지만 변해야 사랑입니다. 책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평생 한 작가 혹은 특정 작품만 줄창 읽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179쪽)
그렇다. 나는 강신주-필립 로스-정희진을 읽었고,
이제는, 정희진-필립 로스-마거릿 애트우드를 읽는다.
내 사랑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것 역시 사실이다. 너무 페미니즘 책을 혹은 페미니즘 책만 읽는게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다. 나는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소설을 펼칠 때의 해방감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소설 읽을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그런데, 소설에
대한 아쉬움을 상쇄할 정도로 재/미/있/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책을 읽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일상 속 고민들의 질문과 답을 한꺼번에 만날 때, 무릎을 친다. 텅 비어 고요한 집을, 아하~ 라는
탄식으로 채운다. 당분간은 페미니즘 관련 책들을 계속해서 읽게 될 것 같다.
작년에 읽고, 어제 2018년의 첫 날부터 다시 읽고 있다는 상황 자체로 본다면, 2017년의
책은 <그레이스>가 아닐까 싶다.
메리 휘트니는 살인 피의자 그레이스 마크스가 캐나다로 도망가는 길에 여관에
서명할 때 사용한 이름이다. 그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하녀 생활을 시작할 때, 그녀를 도와주었던 동료이자 친구이다. 메리 휘트니는 언니처럼 그레이스를
다정하게 돌봐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녀로서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위로해 준다. 또한, 고고한 척 하는 주인들을 조롱하면서, 암울한 현재의 삶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She said
that being a servant was like anything else, there was a knack to it which many
never learnt, and it was all in the way of looking at it. For instance, we’d
been told always to use the back stars, in order to keep out of the way of the
family, but in truth it was the other way around: the front stairs were there
so that the family would keep out of our way. (182p)
재료를 손질해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차리고, 식탁을 정리하고,
옷을 만들고, 옷을 세탁하고, 옷을 개어 옷장에
넣고, 침대를 정리하고, 계절마다 커튼을 교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몫의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진정한 주인이다. 그래서 가짜 주인들은, 앞쪽 계단을 사용해야 한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하인들에게 걸리적거리지 않기
위해.

사슴 눈망울처럼 눈이 크고, 친남매
저리 가라 서로 닮은 학교 후배 부부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풍선을 달아서는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다. 알콩달콩 신혼부부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좋아 보인다 답을 달았다. 네가 잘 지내니, 나도 좋다. 마침 읽고 있던 책에는 이런 구절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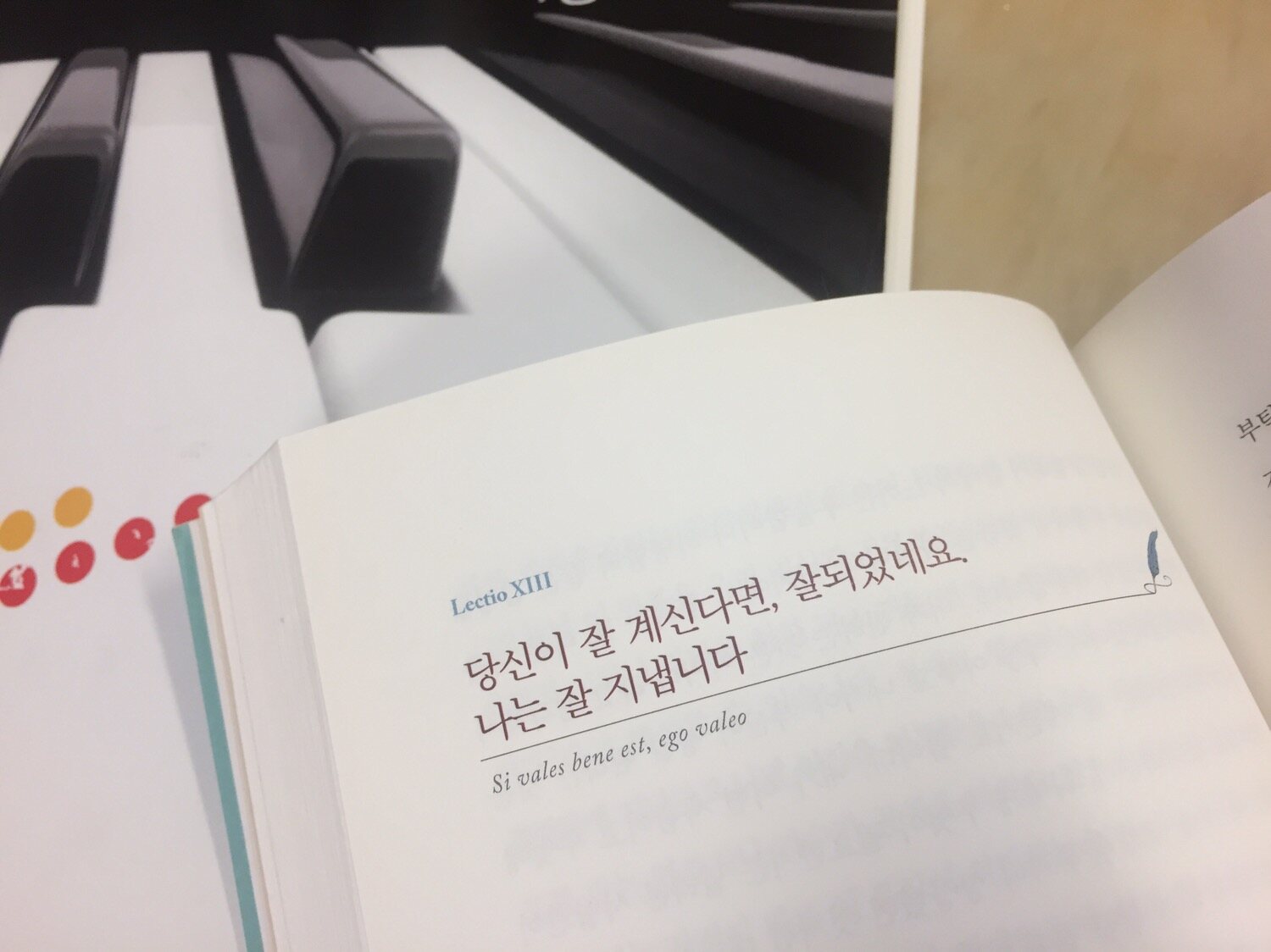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Si vales
bene est, ego valeo.

나는 잘 지내,라고 답하고 보니, <잘 지내나요?>라는 맛깔나게 재미있고, 이모저모 유익하며, 독서열을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이 훌륭한 책이 떠오른다. 다정하고 따뜻하며 보들보들한 아이손을 갖고 있는 저자의 물음을, 2018년,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한 당신에게 그대로 전한다.
잘 지내나요. 나는 잘 지내요.
당신이 잘 계시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