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나 글을 썼다. 10대에는 종잇조각들, 상자, 맥주 받침 뒤에다 끄적거리곤 했다. 공책, 책 앞뒤에 붙은 백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급하게 찢어 낱낱이 흐트러진 종이 쪽지들로 가방이 꽉 차곤 했다. 영수증은 모두 펼쳐서, 납작하게 눌러 뒷면에 반 정도만 알아볼 만한 낙서로 뒤덮었다. 한번은 여성 경찰관에게 붙잡혔는데 그 경찰관이 내시와 운문들을 읽는 부끄러움을 참아야 했는데,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이거 네가 쓴 거니?"라고 물었다. 수치가 증발했다. 비웃을 거라 짐작했다. 대신 그 경찰관이 감동해 나도 감동받았다. 내가 살던 삶이 내게 적합하지 않음을 누군가 생각해줬다는 사실을 알아서 좋았다. (355쪽)
레이첼 모랜이 ‘언제나 글을 썼다’라고 말할 때, 그 문장이 주는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정신질환을 앓는 엄마와 가끔 나타나는 우울한 아빠 사이에서 자란 가난한 소녀가 ‘쓰고 싶어’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한다. 영수증을 납작하게 눌러 거기에 글을 쓰는 마음에 대해 생각한다.
두 번째로 읽기 시작하면서 내 의문은 사실 하나였다. 어제의 글은 이 책에 대한 나의 답이자 결론이지만, 이 책을 읽는 내내 나를 사로잡았던 질문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내 질문은. 어째서 어떤 사람은 이 난관을 극복해 내는가? 이다. 어떻게 레이첼 모랜은 이 지옥 같은 세계에서 탈출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까. 어떤 여성들은, 그녀처럼 우연한 기회에 혹은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발을 디디고, 다시는 거기에서 탈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녀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 크게 낙담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큰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갈까.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힘들어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마저도 용서하는 걸까. 왜 어떤 사람들은 포기를, 또 다른 사람들은 도전을 선택하는 걸까. 질문에 대한 답은 찾지 못 했다. 일단 질문을 여기에 써놓는다. 어디선가 해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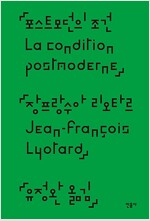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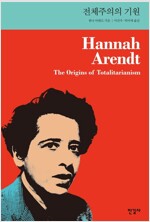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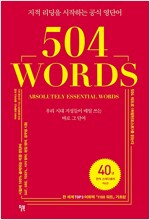
<포스트모던의 조건>은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내내 그 자리다. 구입한 책 아니면 안 읽었을 분위기다. 정희진쌤이 극찬하셔서 구입했는데, 아, 진짜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참고도서나 기타 등등 자료 가지고 계셔서 뭐든지 가르쳐주실 분, 연락 바랍니다! (이 문장 쓸 동안에는 마음 속에 건수하님 두고 있음^^)
<전체주의의 기원>은 밤에 20쪽씩 읽는데 이러다 언제 다 읽나 싶다. 다른 책을 다 미뤄두고 집중적으로 읽어야 할 텐데, 아직은 용기가 부족하여 내내 미루고 있다. 그대, 아렌트. 아직은 내게 너무 멀리 있네요.
<504 Words> 어제 안 해서 하루치 밀리고 오늘도 안 해서 이틀째 밀렸다. 어째 잘 나간다 싶었다.

<거짓의 사람들>은 레이첼 모랜 책의 인용구를 보고 어제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로 받았는데, 시작부터 흥미롭다. 서문 첫 문장.
이 책은 위험한 책이다. 암요, 그렇구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