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난 주에 <여자아이 기억>을 읽었다.
제일 먼저 읽은 에르노는 <얼어붙은 여자>이고, <탐닉>과 <단순한 열정>을 이어 읽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같은 사건의 다른 서술이고, <탐닉>이 에스프레소, <단순한 열정>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아아를 먼저 마셨어야 했는데, 에스프레소 먼저 마시는 바람에 나는 참 고생이 많았다.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는 읽다가 힘들어서(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를 보살피는 딸의 이야기) 포기한 책이고, 다시 펴기 어려울 것 같다. 다음으로 읽을 에르노는 <젊은 남자>인데 목차를 살펴보니 프랑스어 원서가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저는 필요 없는데. 저는 있거든요, 프랑스어 원서. 친구가 파리 다녀오면서 사 왔거든요, 그래서 있거든요. (읽지도 못하면서 자랑 그만!)
1958년의 여자아이. 자신을 ‘그 여자아이’로 호명하며, 에르노는 기억을 새롭게 만들어간다. “이 책을 쓰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던 작가의 고백대로 자신의 과거에 맞선다.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는다. 이 책에서 제일 눈에 띄는 대목은 계급 탈출에 한 걸음씩 다가서는 어린 소녀 아르노에 대한 서술이다.
여왕의 자부심을 지니고. 자신이 1등을 한다는 사실이나-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마리아 성찬회 소속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기숙학교의 영광'이라고 불린다는 사실보다 수학과 라틴어, 영어, 작문, 문학 등 주변사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걸 배운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우쭐했다. 예외적인 존재라서, 친척들로부터 예외적이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꼈다. 노동자인 친척들은 명절 식사를 할 때면 그녀가 배움의 ‘재능’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는지 궁금해하곤 한다. (33쪽)
1등을 도맡아 하는, 기숙학교의 영광. 누굴 닮아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친척들에게 둘러싸인 삶에 대해 생각한다. 탈출하고 싶은 욕망과 탈출이 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1958년의 아르노를 얼마나 추동했을지, 감히 상상해본다.
전등불이 꺼지고, 누가 댄스 파트너를 바꾸라고 빗자루로 쳐서 신호를 주었을 때, 그녀는 또다시 H의 품에 있게 됐다. 그는 곧장 그녀의 치맛자락을 들추고 자신의 손을 그녀의 팬티 안에 거칠게 집어넣는다. 바로 그 순간, 광포한 기쁨이 그녀를 덮쳤다. 첫날 밤 이후, 3주 동안이나 기다렸던 몸짓에서 비롯된 상상을 초월하는 유린. 그녀 안에는 자신의 가치가 실추된다는 어떤 느낌도 없다. 그, H에 의해 소유되고, 순결을 빼앗겼으면 하는, 강간의 욕망만큼이나 맹렬하고 단순한, 날것의 - 화학적으로 순수한 욕망 말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97쪽)
또 한 부분은 1958년 여자아이의 성적 경험에 대한 묘사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온다면 ‘단순한, 날것의, 순수한’ 욕망. 그 욕망에 대한 서술은 언제나 맹렬하고, 뜨겁고, 그리고 솔직하다. 솔직함. 불편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솔직함이 그의 문학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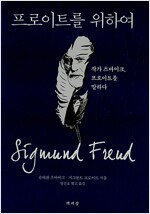
그래서 떠올리는 이런 문장.
솔직함은 모든 천재성의 근원이다. – 뵈르네 (<프로이트를 위하여>, 66쪽)
이 문장은 츠바이크가 <성격 초상>이라는 챕터에서 프로이트를 설명하며 인용한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성적인 행위’로 출현(?)한 것이 아니라는 듯, ‘성’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양식이라는 듯, 프로이트 동시대인들은 모두 성을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을 대했다. 프로이트는 빅토리아 시대의 정신적 모순이 성의 억압과 관련되었음을 알아챘고, 그것에 대해 선배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다만 말하지 못했을 뿐이다. 모두 알고 있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프로이트는 꺼냈다. 시작했다.
모르는 체하지 말고 확인하라는 것이다. 돌아가지 말고 들어가라는 것이다. 눈 돌리지 말고 깊이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외투를 입히지 말고 벌거벗기라는 것이다. (<프로이트를 위하여>, 60쪽)
솔직함이 천재성의 근원이라는 문장을 읽으며 나는 세 명의 친구를 떠올렸다. 자연스러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이었다.
친구 A는 솔직함 그 자체다. 그를 좋아하는, 그의 글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그의 솔직함을 사랑한다. 그의 솔직함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혹은 숨겨진 음흉한 솔직함이 아니다. 그의 솔직함은 언제나 신나고 명랑하다. 짧지 않은 시간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내 경험으로 그의 솔직함은 그의 ‘정직함’과 짝을 이룬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한 사람이라서, 자신에게조차 정직한 사람이라서, 그는 가끔 괴롭고 힘들어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솔직-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솔직함이 천재의 특징이라는 걸 위 문장을 통해 확인하기 전, 나는 솔직함이 작가의 특징이라 생각했다. 작가인 그를 보면서 그런 생각에 더욱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솔직함의 마스코트, 솔직함 세계의 여왕벌 같은 존재이다.
친구 B는 인간의 희로애락에 비켜서지 않고 솔직하게 맞선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고,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골치 아픈 존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인간 욕망에 대한 그의 솔직한 언설, 그의 솔직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아, 그래도 다시 한번, 을 외치며 그의 다정한 말에 동조하게 된다. 다시금 사람을, 인간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인류애의 화신, 아니 진정한 인류애의 운동 여신 되시겠다.
친구 C의 솔직함은 자기 응시 분야(?)에서 제일 빛을 발한다. 나는, 내가 데리고 사는 나, 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일정 정도 사랑하며, 일정 정도 모른 척 한다. 그것이 답이라고 얼버무릴 때가 많고, 아니어도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 그의 자기 직면은 치열하고 그의 자기 인식은 조금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자기의 말로 솔직하게, 자기를 마주 바라본다. 푸코의 현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요즘에 더욱 그러하다.
나는 내 자신이 천재 쪽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천재의 특징이 솔직함 뿐일 수는 없겠지만, 솔직함이 천재의 특징인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내게는 그런 솔직함이 없다. 나는 좀 느리고,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다. 솔직해지기 어려운 성격적 특징을 참 많이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내게도 볕 뜰 날이 있었으니. 천재의 특징을 소유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내 친구라는 사실.

어떤 종류의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 중 누가 사랑하는 이들의 인정을 염두에 두지 않을 채 말하고 행동하는가? 다른 사람의 동의는 일종의 두 번째 양심이 아닌가? …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의지하도록 태어났고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다. 우리라는 인물의 형태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 주조되며, 색을 부여한다. 우리의 감정이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진리의 발견>, 94-5쪽)
아니 에르노를 앞에 두고 나를 비출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분은 너무 멀리 계시고, 나의 존재를 모르시며(흑흑), 그의 친구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 하지만 내게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자그마치 3개나 있으니, 나는 천재는 아니지만, 천재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나는 충분히, 안온히, 편안하게. 다른 책을 읽으리. 또 다른 책을 읽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