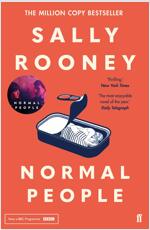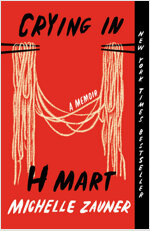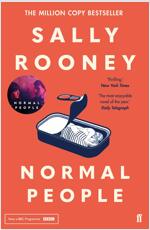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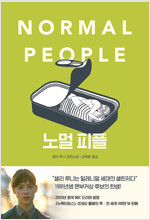
친구들과 함께 읽는 『Normal People』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코넬을 미워했다가 용서했다가 다시 미워하는 시간을 오가고 있다. 먼저 읽은 친구들은 끝까지 읽고 나서 코넬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분위기로 마무리되는 것 같던데, 나는 아직 그런 마음은 아니다. 왜 이렇게 코넬이 싫은가 생각해본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 어느 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의 오류를 발견하는 일은 쉽지 않으니까, 선명하게 인식된 나쁜 기억이란 대부분 과거의 것이다. 과거의 나는 얼마만큼 쪼잔하고 또 얼마만큼 부끄럽다. 그런 면에서 코넬이 싫은 진짜 이유는 그의 못난 생각, 행동, 말의 일부분이 과거 나의 것이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리라. 코넬, 내 안에는 네가 있다.

장강명이 『책, 이게 뭐라고』 팟캐스트 팀원들과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한 독서모임을 했을 때다. 같은 책을 읽는 사람들과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다른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
처음에는 책 이야기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번지는 것에 당황했다. 우리가 너무 수다스럽고 사생활 털어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궁금했다. 그러다 머지않아 이게 여러 독서 모임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97쪽)
이런 일이 독서 모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처럼 놀랐다. 그런 일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데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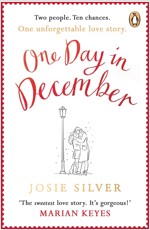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지난번에 친구들과 『One Day in December』를 같이 읽었다. 우리는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남 주인공에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주인공의 선택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분명 우리는 소설에 대해, 소설 속 사건에 대해, 주인공의 선택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나라면?’이라고 묻기 시작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답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글을 썼다. 좋아하는 문장을 옮기고 그에 대한 생각을 적었다. 서로의 글에 댓글을 달았다. 그리곤, ‘아, 그렇게 생각할 너라면, 그렇게 선택할 너라면, 이 여주인공의 소설 속 이런 선택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왔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같은 책을 읽으며 여러 번 생각을 교환했던, 그리고 서로를 어느 만큼 알고 있는 서로에게서 전혀 새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내게는 무의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생각이었다. 나는, ‘나의 말하지 않음’ 속에서 ‘나의 어떠함’을 발견해낸 친구의 안목에 깜짝 놀랐다. 나 혼자 가지고 있던 나쁜 생각을 들킨 것 같기도 했고, 나를 이렇게나 정확히 파악한 친구의 판단력에 왠지 모르게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장강명의 말이 기억났던 이유다. 같은 책을 읽는다는 건 이렇게나 은밀하며 섹시한 일이란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일은 『Normal People』을 읽는 동안에도 일어났다. 나는 처음부터 한결같이 코넬이 싫었다. 코넬 같은 남자도 싫었지만, 여자가 코넬 같아도 별로라고 생각한 터였다. 아무튼 총체적으로 코넬이 싫었다. 코넬 최악의 장면 중 하나로 꼽았던 장면은 코넬과 그의 여자친구와의 대화문이다. 마리앤이랑 너랑 사귄 거 아니냐는 여자친구의 질문에 코넬이 답한다.
It doesn’t have to be weird that she’s your ex, Helen said.
She’s not my ex. We’re just friends.
But before you were friends, you were …
Well, she wasn’t my girlfriend, he said. (166)
매사에 정확한 건 좋은 일이다. Yes 아니면 No. 맞으면 맞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다. 그렇다고 마리앤과 코넬이 그냥 친구 사이였을까. 정말 친구였을 뿐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리앤에게 코넬은, 코넬에게 마리앤은 그 순간에는 삶의 이유였다. 지옥 같은 삶에 한 줄기 구원의 빛이었다.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그가, 고맙다고 여기지 않는 그가, 괘씸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따라 읽고 있는데, 천천히 따라 읽는 동안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사적인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니까, 최초의 육상 척추동물이 막 육지에 발 혹은 지느러미를 내딛었을 때의 일이다. 대학이라는 데를 들어갔더니 축제가 있다고 했다. 보통은 남친을 초대해 같이 술 마시고 노는 분위기인데, 남친이 없으니 부를 사람이 없네, 이러고 있는데, 초등학교 동창이 자기를 좀 불러달라 했다. 너네 학교 축제가 더 재미있는데, 왜 우리 학교 오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지는 않았고. 여대 축제 가보고 싶기는 하지. 그래, 와라.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에 왔다. 서관 쪽 앞 어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놀고 있는데 선배가 지나간다. 안녕하세요? 어, 단발아! 친구 왔네? 남친이야? 아니요, 친구. 하하하, 그래. 다음 선배가 지나간다. 안녕하세요? 어, 단발이 남친 데리고 왔네? 아니에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아, 그래? 친구야? (의미심장한 미소) 그다음에는 교수들이 지나간다. (자리 잘못 잡았나. 왜 이렇게 이 앞으로 지나가시나) Hi! Hi! (의미를 담은 미소) Boyfriend? No. He’s not a boyfriend. Just a friend. 교수님 또 지나간다. Hi! Hello! Boyfriend? No, no. He’s just a friend. 그날, just a friend를 얼마나 많이 말했던가. 확인하려는 듯 그 친구를 바라보는 학교친구들과 선배와 교수들에게 친구는 멋쩍게 마주 보며 웃곤 했다.
그 친구가 나를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나는 누가 날 좋아하고 그런 거를, 그런 소중한 상황과 느낌과 분위기와 공기를 못 알아보는 그런 무딘 사람이 아니다. 근데 난 진짜 몰랐다. (그럼, 무딘 사람인 걸로) 첫 번째는 그 친구 잘못인 것이, 그 친구는 고백을 안 했다. (사랑에는 고백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잘못이라면 내 것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린 단둘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친구들과 우르르 만났을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말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 내 시선, 내 청음 능력, 내 모든 세포는 딱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오로지 그쪽을 향해서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알 수 없었다. 내 사랑이 소중해서, 내 마음만 소중해서, 나는 나에게로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 감정을 알아챌 수가 없었다.
코넬의 문장을 읽는데, 그때의 내가 떠올랐다. 나는 코넬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코넬만큼 용기 없는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코넬의 문장을 똑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동안,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니 내가 코넬 같이 느껴지긴 했다. 내가 코넬 같다는 게 아니라, 나도 코넬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사실이, 난 좀 아팠다.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이 책을 같이 읽은 친구들은 코넬과 비슷한 철없는 자신의 청춘을 기억하면서도 자신의 그러한 면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비해, 나는 그러지를 못한다. 나는 코넬을 계속 미워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지우려 한다. 없던 것으로 만들려 한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과거의 나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과거를, 과거의 나를, 코넬 같은 나를 지우려 한다. 없애려 한다.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코넬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코넬이 있어서.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문장에 줄을 긋는지, 어느 작가를 좋아하는지, 어느 작가가 별로였는지. 그걸 말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일들은 너무나 섹시하고 매혹적인 일이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한 번은 꼭 해봄 직한 일이란 걸 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읽는 책들은 이렇습니다. 전 샐리 루니를 읽으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밤마다 한나 아렌트를 읽고, 에이드리언 리치를 끌어 안고 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