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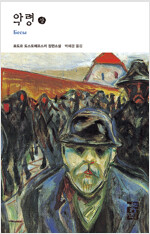
좋아하는 책친구는 장강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책이 나올 때마다 구입해 읽는다. 나는 장강명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책을 아직 한 권도 사지 않았다. 누가 진짜 장강명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좋아한다는 것, 작가를 좋아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워낙 한국 소설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 말하기 심히 부끄럽지만 장강명의 『표백』은 정말 대단했다. 자살에 대해 이토록 치밀하고 날카롭게 서술할 수 있다니. 읽으면서도 읽은 후에도, 이 책은 반드시 한 번 더 읽어보리라 다짐했던 기억이 난다. 책 중간에 <내 인생의 책>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저자가 꼽은 인생책 첫번째가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이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도스토옙스키가 무신론을 비판하기 위해 『악령』을 썼다고 하는데, 저자는 오히려 그 책을 읽고 성당을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표백』이 어떻게 『악령』과 닿아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한다. <읽고 싶어요>가 아니라, <읽어야 해요>에 『악령』도 넣어둔다.
나는 인세로 먹고살고 싶었다(25쪽)는 고백부터 시작해 ‘잘생긴 작가 책이 잘 팔린다’는 출판 관계자들의 푸념을 읽을 때 괴로웠다. 이런 상황은 내게도 책임이 있다. 아주 작은 책임이지만. 나는 대부분의 책을 도서관에서 대출해 읽는다. 줄을 쳐야만 하는 책이 아니면 구입하지 않고, 페미니즘 책이 아니면 구입하지 않는다. 그래도 다 읽지 못한 책들이 산과 같다. 도서관의 책, 특히 도서관의 모든 새 책들을 다 내 책이라 생각하고 살고있다. 하지만, 출판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아니 잘 팔리는 작가로 손에 꼽힐 만한 장강명 정도의 작가조차 인세만으로 생활하기 힘들다는 건 정말 모순적이다. 지금까지 몰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알게 된 것 역시 사실이다. 새로운 정보를, 상쾌한 깨달음을, 기쁨과 슬픔을, 그것도 한글로 전해주는 이렇게 소중한 작가들이 ‘책 쓰는 것’만으로 살 수 없다는 현실. 안타까움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건,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것과 독자들이 책을 많이 구입해야 한다는 정도인데 이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가를 생각하면 또 다시 암울해진다. 평소에 진짜 책을 사지 않는 사람, 이를 테면 일년에 책을 한 두 권 사는 사람마저 ‘사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 모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지만, 땅 파서 먹지 않는 이상(적어도 자기 땅이 있어야함) 다음 책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생활 여건은 마련되어야 한다. 다 자기 좋아서 하는 일 아닌가,라고 말하기에는 책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너무 크고 또 소중하다. 작가를 포함해 예술가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혹은 장학금 혹은 후원금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기를 바래본다. 어제만해도 책상자가 두 개나 배송되었지만, 나역시 더 활발한 책구입을 새삼 다짐해본다.
책은 대화가 뒷담화로 번지지 않게 해주는 무게중심이 되어준다는 것이나(100쪽), 책을 많이 읽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까(154쪽)의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이 흥미롭다. ‘책 한 번 보내봐, 읽어줄게’하며 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차차, 깜빡했네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런 사람과는 연락을 영영 끊는다는 이야기는 통쾌했다. 연락 끊어야한다, 반드시.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 많지만 이 책을 직접 읽으실 분들을 위해 남겨두고. 눈에 들어온 이 문단을 이야기하고 싶다.
군대에 있는 동안 나가지 못했던 하이텔 과학소설 동호회 모임에도 다시 나갔는데, 거기서 누가 <블랙 달리아>라는 끝내주는 소설이 나왔다며 읽어보라고 했다. 월드와이드웹이 막 보급되던 때였고, 네이버도 알라딘도 없던 시절이었다. 괜찮은 책은 늘 그렇게 사람에게서 추천받았다. 취향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시절이었으므로, 그런 추천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159쪽)
여기의 알라딘은 어떤 알라딘일까. 지니 나오는 알라딘이 아닌 건 확실하고. 아마도 알라딘. 지금 이 알라딘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알라딘은 인터넷 서점 알라딘, 중고서적 매장을 가진 알라딘이 아닌 듯 하다. 뒤의 문장으로 추측해보건대, 이 알라딘이란 취향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믿을만한 책 추천이 가능한 곳, 즉 알라딘 서재를 가리키는 것일 테다. 장강명은 알라딘이 없던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건 이후에 알라딘이 있는 시절이 있음을 뜻한다. 알라딘이 없던 시절 그리고 알라딘이 있는 시절.
소소하고 작은 여러 기술적인 문제를 소홀히 대하는 알라딘을 보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놓고 불평하지 않는 건 이 곳에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 곳에서 읽을만한 좋은 책을 추천받기 때문이다. 알라딘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책을 보는 관점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배웠고, 책을 사랑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바로 옆에서 구체적으로 보았다. 책 이야기를 해도 되는, 책 이야기만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책 이야기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번지는 것에 당황했다. 우리가 너무 수다스럽고 사생활 털어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궁금했다. 그러다 머지않아 이게 여러 독서 모임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97쪽)
장강명이 <책, 이게 뭐라고?!> 팟캐스트 팀원들과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한 독서모임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곳에서도 일어난다. 책 이야기를 하면서, 책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던 내밀한 기억과 슬픔, 서운함과 아쉬움, 후회와 결심 그리고 먹먹한 그리움을 말하게 된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듣는다. 한 사람이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단다. 이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상의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만의 새로운 우주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알라딘이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책을 많이 사야겠군) 알라딘 시절이 오래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다음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