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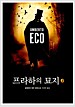
움베르토 에코!
지적 사유의 유희를 즐기기에 내 지적인 수준은 그닥 언급할꺼리가 없어서 움베트로 에코의 책을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수는 없다.
하지만 오랫만에 읽게 되는 에코의 책인지라 기대는 된다. 바쁜 일 좀 지나고 여유가 생길 때쯤 책이 도착하려나?























물만두 추리소설 리뷰대회가 있어서 더 그렇게 보이는건가? 장르소설은 여름이 되면서 마구 쏟아져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도 많이 나오는구나.


겨울에는 누가 뭐라해도 이불 뒤집어 쓰고 읽는 연작소설이 최고였는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없는 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낸다는 것 뿐이고 책을 읽는 것도 예전같지 않다.
어제는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무 생각없이 집에 들어가 후다닥 씻고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비몽사몽 헤매다 자버렸고. - 사실 지금도 모니터 쳐다보고 있다가 졸고 있어서 도무지 일은 못하겠고 새로나온 책이라도 뒤적거리면서 정신 좀 차려야겠다, 싶은 맘에 두리번 거리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여전히 졸음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







날마다 좋은 문장을 읽으면서 하루의 시작을 묵상으로 하던 때도 있었고, 하루에 한마디씩 좋은 글귀를 경구삼아 읽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글들이 마음을 울리기보다는 아무 생각없이 지나쳐버리고 있는 날이 더 많아져 '긍정의 한 줄'이라는 책은 몇년째 먼지만 쌓아올리며 펼쳐놓지 않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글은 어떨까. 정호승 시인의 글은 오래전에 나온 시를 읽으며 좋아했더랬는데.
발표되지 않은 산문들을 골라낸 것이라고 하니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힘들일도 없고 혼자 애쓰면서 기를 쓰고 덤벼들 일도 아니었는데 그당시의 나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며 이리저리 치이고 있었을 때 내 마음을 울린 성경 구절이 있기는 하다. 새번역성경이 나오면서 문구가 좀 바뀌기는 했지만 이전 공동번역에서는 "내가 네 힘이 되어 주겠다"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적혀있었고, 어느날 신부님을 통해 들려온 그 말씀은 말 그대로 내 힘이 되어주는 것이었는데....













관심이 가는 요리책도 있고, 빵을 좋아하니까 그냥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맛있을 것 같아 보이는 빵의 위로도 좋아보이고 채식밥상은 실질적으로 내 밥상에 도움이 될 듯한데... 똑같은 '셰프'라는 제목이 있어도 저 노랑 셰프는 요리책이 아니라 소설책이 되겠다.
두 가지의 연결고리.

선비의 멋 규방의 맛...이 연결고리가 될라나?






어째 요즘은 소설이 눈에 잘 안들어온다.
아니, 가만 생각해보니 거의 모든 책이 눈에 잘 안들어오는데 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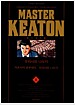



유리가면이 나왔다!
분명 이거 신간알림을 해놓은 것 같은데 메일이 오지 않는군. 재설정!
책 주문을 하고 받은 박스를 채 정리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책 주문을 해야하나, 싶다.


금요일 주문건이 걸리면 망설이게 된다. 월요일 하루배송으로 하면 그날 받을 수 있는데 금요일, 지금 주문하면 대부분 수요일쯤 받게 되니 말이다!
주말을 넘기고 주문해야지. 주말에는 장바구니를 조금 더 채워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