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문학의 상품화’ ’광대의 인문학‘ ’인문학 페티시즘‘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목소리들이 내는 메시지는 지금 세간에 떠도는 인문학은 진정한 인문학이 아니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 목소리들에 경청할 대목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인문학을 상품화하는 광대들의 페티시즘보다 나를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려 드는 이들의 플라톤적 독단이다. ’진짜‘ 인문학과 ’가짜‘ 인문학을 가르는 기준을 누가 가졌을까? .... 온갖 술어로 인문학을 아우라로 포장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인문학을 무슨 이상한 세속종교로 여기지 않을 거라면, 상아탑의 진짜 인문학이 외면을 받고 장바닥의 가짜 인문학이 환영을 받는 현상에서 ’타락‘과 ’말세‘의 징후 이상을 읽어내야 한다. (4-7쪽)
진짜 궁금한 것은 ‘타락’과 ‘말세’의 징후 이상을 읽어내는 일인데, 현 상태가 ‘타락’과 ‘말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타락’과 ‘말세’를 소리 높여 ‘말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일에만 정통하시고, 다른 일에서는 정교함이 부족하신가. 세계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말해주고 그 속에서 의미를 묻는 인문학(104쪽)이, 현재 인류가 처한 여러 위기에 대해 답을 주지 못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암담함은 한층 더 커진다. 삶의 ‘목적’ 자체에 대한 물음과 이에 근거한 사고, 그리고 판단이 요청된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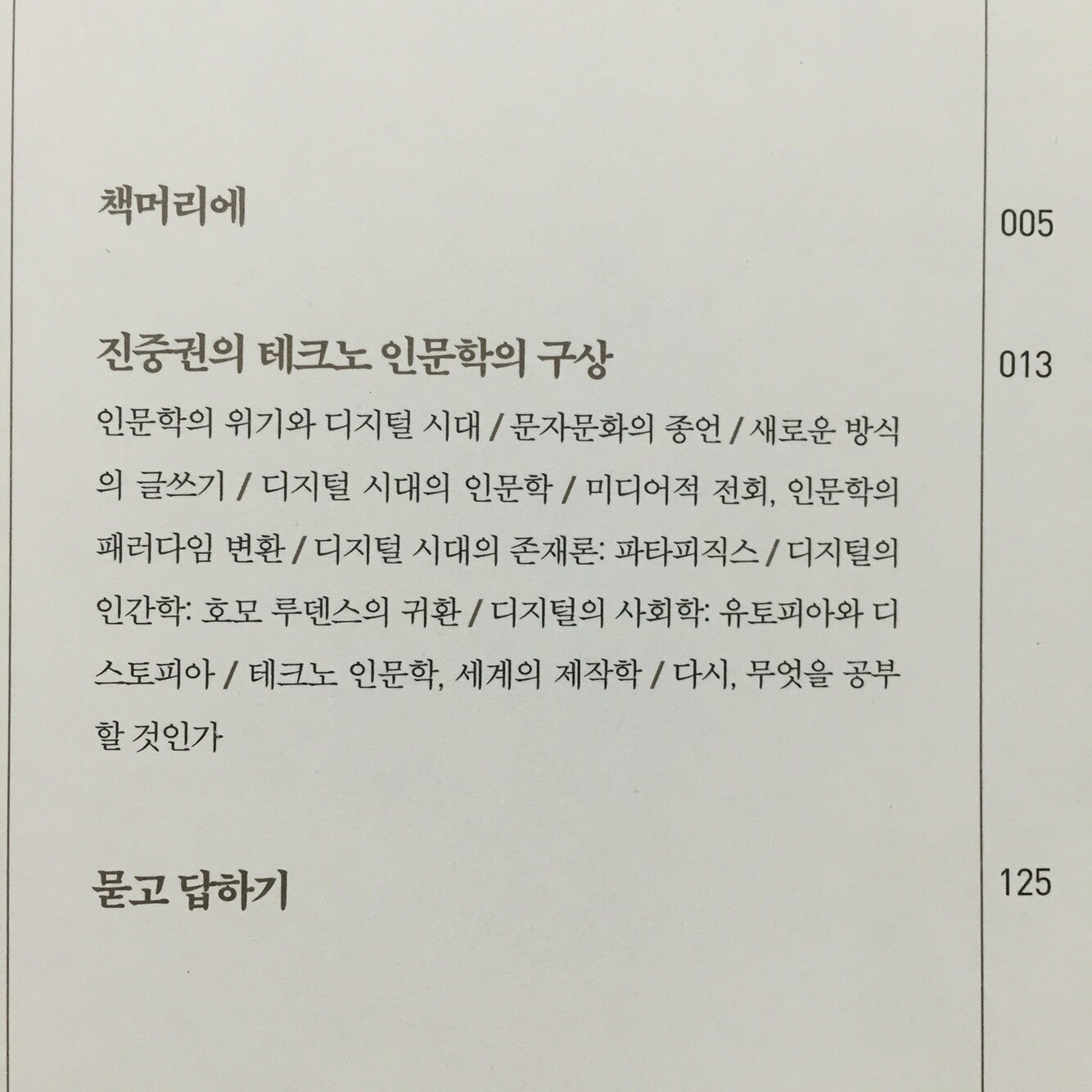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라기보다는, ‘김영란법‘의 ’김영란‘으로 더욱 유명한, 김영란 대법관님의 ’창비‘ 강연을 책으로 엮었다. 강연 자체가 책에 대한 것이다 보니 본인이 읽으셨던 책들이 많이 언급되는데, 저자는 물론 제목조차 처음인 책들도 있어 역시 ’활자중독증‘의 위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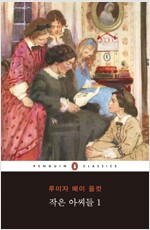








관심이 가는 대목은 『시적 정의』에 대한 것인데, 도서관에서 대출했다가 끝까지 다 못 읽었던 경험 때문이다.
누스바움은 재판관이 갖추어야 할 공적 합리성은 바로 이 공평한 관찰자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문학 작품은 불완전한 길잡이가 될 수 있고 여전히 기존의 법령과 판례 등에 관한 지식이나 재판의 제도적 역할에 대한 인식 등이 전제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문학적 상상력은 재판관이 자신 앞에 놓인 사건의 사회적 현실로부터 고상하게 거리를 두지 않고 풍부한 상상력을 겸비한 구체성과 정서적 응대를 바탕으로 현실을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77쪽)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쓸모 없는 책읽기론'에 대해서는 나 역시 쓸모 없는 책읽기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항상 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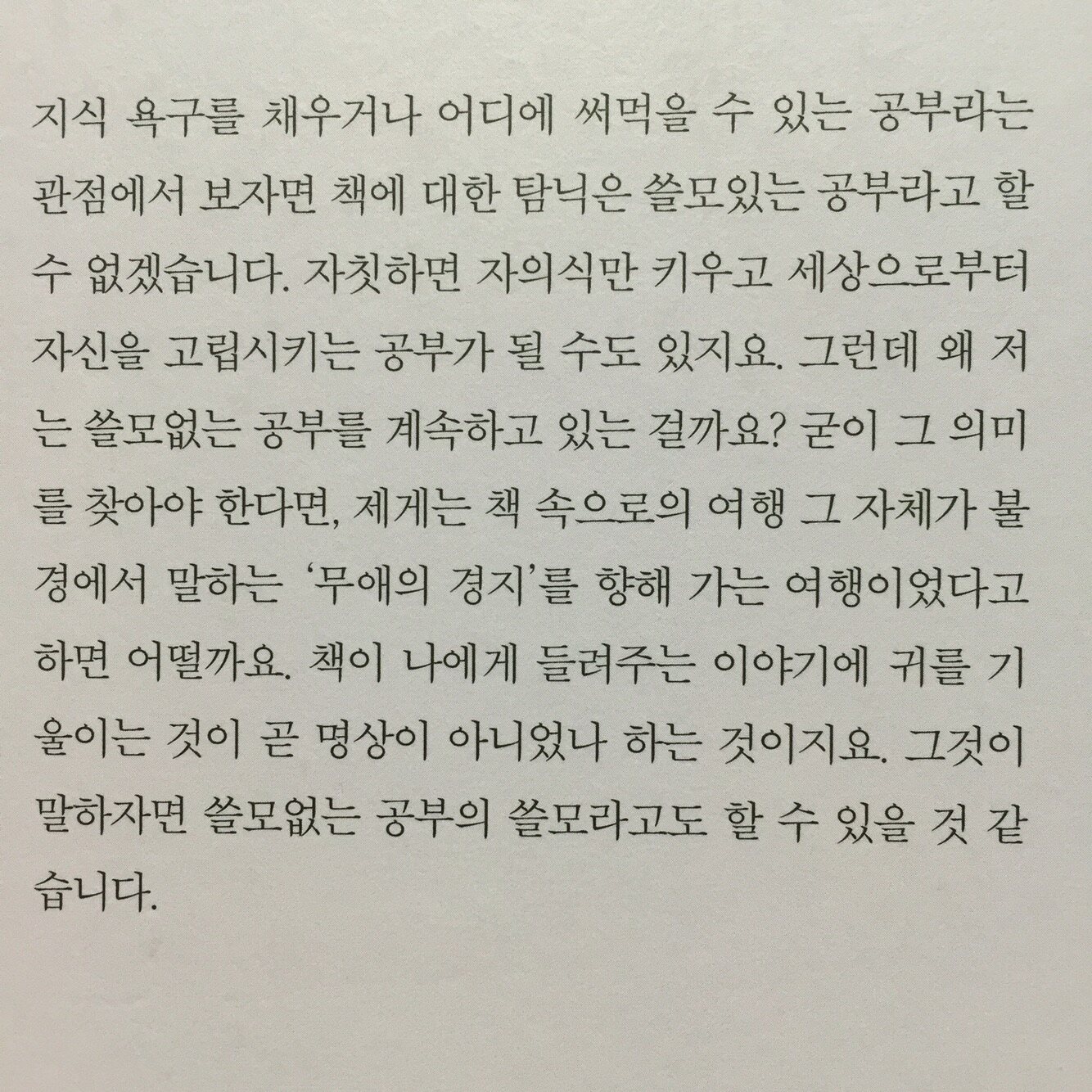
물론, 눈에 확 띄는 대목은 이런 것이다. 판사가 아닌, ‘여자’ 판사로 산다는 것. 판사인데도 그랬으니 다른 직종에서는 얼마나 더 심한 일들이 벌어졌을지 뻔하죠.
요점은 이것입니다. 저는 197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지만, 초기에는 함께 일하려는 ‘남자’ 판사도 드물었고 ‘남자’ 직원도 드물었습니다. 판사이지만 그냥 ‘판사’가 아니라 ‘여자’ 판사였기 때문이지요. ‘여자’ 판사는 종종 출산휴가를 한달도 채우지 못한 채 재판장의 전화를 받고 출근해야 했고, 사무실에서 반말 전화를 받기도 했고(그때마다 항의를 했지만 사과를 받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법정에서 재판 진행권을 침해당하기도 했습니다. 판사인데도 그랬으니 다른 직종에서는 얼마나 더 심한 일들이 벌어졌을지 뻔하죠. ... 여성으로서의 삶 자체가 소수자로서의 삶이었던 시대(지금은 다른가요?)를 살아왔던 제게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것은 따로 계기가 필요하거나 배워야 할 필요가 없는, 마치 평상복처럼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12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