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씨를 너무 많이 읽어 글씨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
글씨를 너무 많이 읽어 글씨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

이 책의 장점은 여러 페미니즘 이론의 ‘정리’에 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라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듯하고, 나는 <6장 :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이 궁금하면서도 어려웠다. 이 책의 278쪽을 보면 이런 서술이 나온다.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많은 논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모든 논쟁이 제1세계에서만 해당되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주체의 죽음, 역사의 죽음, 형이상학의 죽음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은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별 의미가 없다. 자본주의 서구에 사는 여성들에게는 꽤 의미가 있지만 말이다. (278쪽)
최근에, 애정하는 알라딘 이웃 쟝쟝님과 이런 댓글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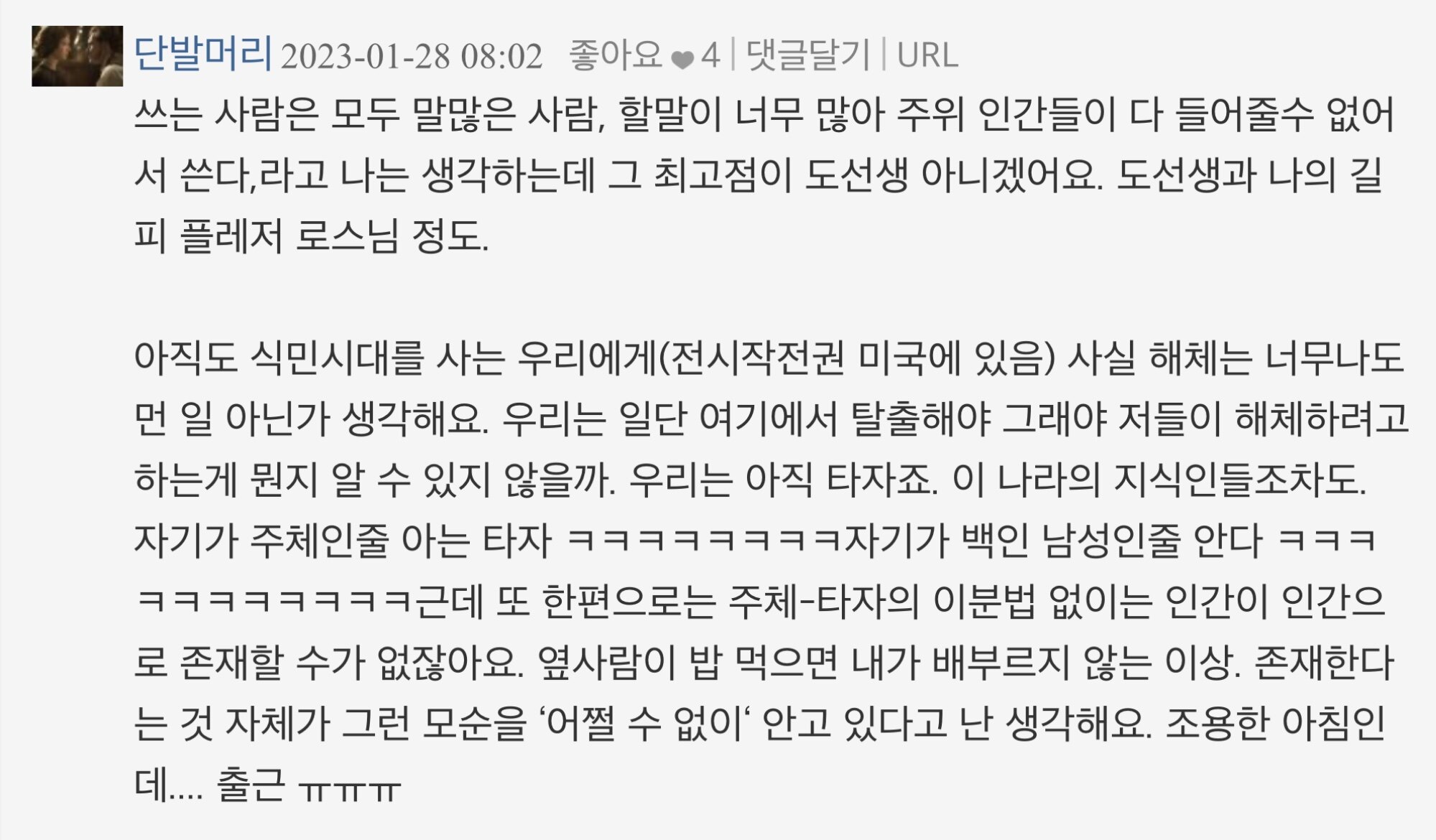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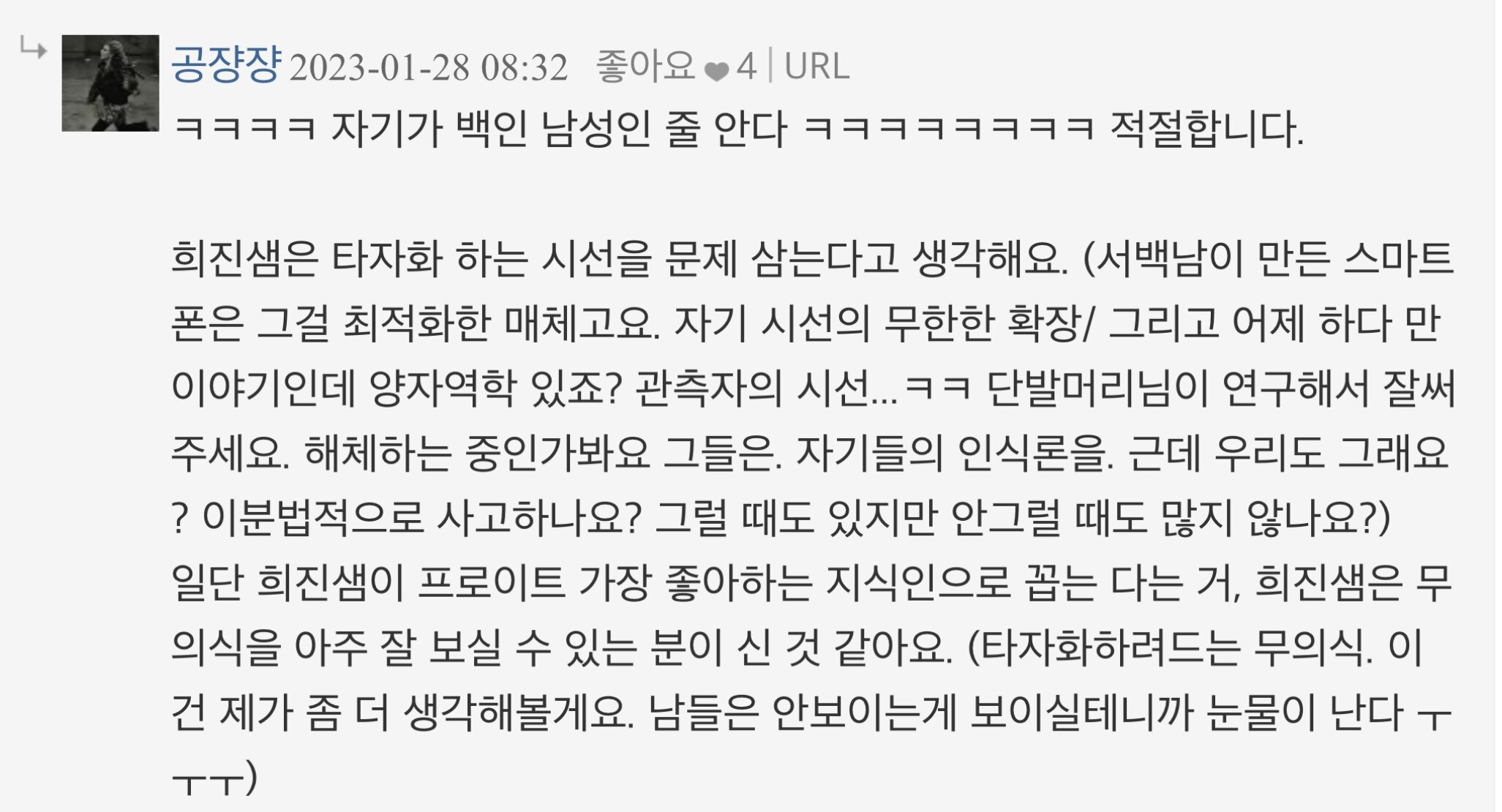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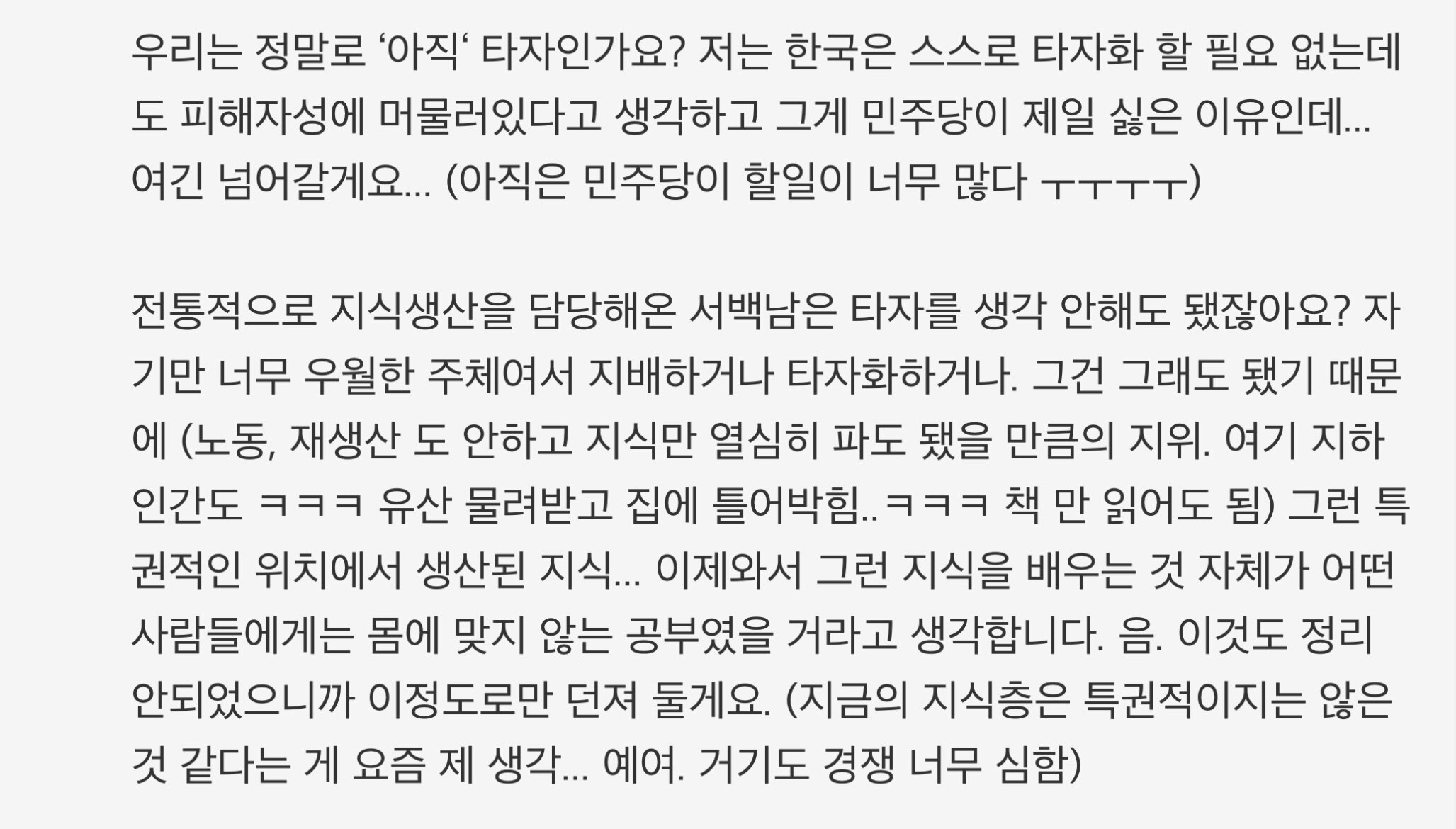
여전히 일본에 대한 향수가 지극하고, 3년 이상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 상태의 분단된 조국의 남쪽, 적대적인 대북관을 피력하는 것만으로도 정당의 지지가 확보되는 정치 지형 속에, 북한 무인기가 내려와 정찰 가능한 지역에 살고 있는 나. 아직도 빨갱이라는 말이 가장 혹독한 모욕이 되는 나라에서, 나를 포함한 온 국민의 비정상적 영어 몰입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내가 생각한다. 여전히 우리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어쩌면 영영 주체가 될 수 없는 운명의… 그런 삶이라면. 어차피 주류에 편입될 수 없는 자리에서, 위치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입장이란 무엇인가. 오래 답을 생각해 보았지만, 아직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다. 발명된 주체의 죽음이 명약관화하다면, 차라리 주체의 ‘옷’을 입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은가.



<7장 : 레즈비안 페미니즘과 퀴어이론>를 읽던 중에 에이드리언 리치 관련 글(300쪽)을 읽고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를 펴서 <강제적 이성애와 레즈비안의 존재>(1980)를 읽고 있다. 내가 산 책에 줄을 그으며 읽을 때, ‘호강하고 산다’고 느낀다. 그 순간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나는 주로 도서관 책을 읽고, 도서관 책으로 읽을 때는 당연히 인덱스를 사용한다. 다 읽고 후에 내용을 ‘간단 정리’하고, 종이 인덱스를 떼는 일을 반복한다. 내 책으로 읽을 때, 특히 그 책이 에이드리언 리치의 것일 때 무한 행복을 느낀다. 형광펜을 긋고 예쁜 색감의 인덱스를 붙인다고 해서 그 지식이, 그 앎이, 그 깨달음이, 그 통찰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환상에 자꾸 빠지게 된다. 이게 내가 누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류의 사치라는 걸 안다. 에이드리언 리치를 읽는 것. 그의 말에 줄을 치는 것.
그래서, 그저께 밤에는 에이드리언 리치의 책을 검색하다가 <문턱 너머 저편>이 절판되었다는 걸 알게 됐다. 아, 그때 샀어야 했는데. 그때, 미리 사 뒀어야 했어. 절망감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알라딘의 떠오르는 샛별 유수님이 그 책을 검색하다가 품절되어 아쉽다는 포스팅을 올리신 것을 보게 됐다. 우리 두 사람을 위해 재출간 될 리 없겠지만(없겠죠, 그런 일은 ㅠㅠㅠ) 꼭 다시 출간되기를 바래본다. 급하게 <모성과 모성 경험에 관하여>를 구입했다. 리치의 저서는 아니지만 리치의 이야기니 그걸로 아쉬움을 달래본다.
1월이 이렇게 간다. 책을 조금밖에 못 읽었고, 일기를 많이 못 썼고, 집에 내내 있었고, 종종 병원에 다녀왔고, 그리고 가끔 심심했다. 1월의 사건은 정희진쌤의 실물을 오래간만에 영접한 일이고, 1월의 책은 <마틴 에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