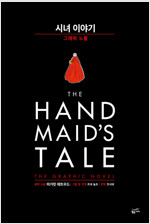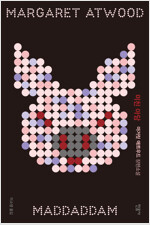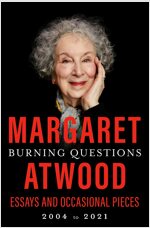

분명 어젯밤에는 <페미니즘의 이론과 비평>을 읽고 있었다. 참고하겠다고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을 페미니즘 책장에서 꺼내 옆에 두고 말이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이 책을 읽었는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서 읽고 있다. 반납일이 이틀이나 지났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ㅜㅜ) <어슐러 K. 르 귄의 말>을 읽으면서 르 귄과 마거릿 애트우드 사이의 ‘SF 논쟁’에 대해 알게 된 나는, 마침 집에 있던 이 책 속에 애트우드가 자신의 글이 SF라는 걸 인정하면서 두 사람 간의 대화를 썼던 에세이가 들어있나 찾아보았다. (알고 계시는 분, 저 좀 알려주세요^^) 제목을 보면서 추측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글을 찾지 못했고, 대신 <우리는 어슐러 르 귄을 잃었다. 우리에게 그녀가 가장 필요할 때>를 보게 됐다. 그다음에는 <도리스 레싱>이라는 제목의 레싱에 관한 추모글을 읽었고, 글쓰기와 이메일 & 편지 쓰기, 그리고 ‘레시피 박스’에 관한 유쾌한 일기인 <글 쓰는 삶>을 읽었다. 그리고 이 글 <<시녀 이야기>를 회고하며>를 읽었다.
그때 우리 파티에 온 작가들 중에 35세의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심장마비가 올 것 같다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전에도 심장마비를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큰일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거실에서 몰아냈고, 제가 911에 전화하는 동안 그레임은 여성과 함께 심호흡을 했습니다. 얼마 안 가 젊고 건장한 남성 구급대원 두 명이 응급처치 도구들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몸들이 근육으로 터질 것 같더군요. (구급대원들은 근육질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쓰러진 사람들을 이리저리 나를 수 있어요.) 대원들은 우리를 방에서 내쫓고 응급처치에 착수했습니다. (381쪽)
알라딘 서재의 글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터질듯한 근육질의 사람들 이야기를 읽으며 누군가를 떠올리실 거라 생각한다. 맞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람 맞다. 근육질을 좋아하는 그 사람, 그 사람 딱 맞다.
<시녀 이야기>에 대한 회고, 작품의 배경을 설명하는 애트우드의 이 강의는 당대 페미니즘의 역사를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그려낸다.
『시녀 이야기』는 두 가지 사변적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제시합니다. (1) 만약 미합중국이 독재국가나 전제국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정부가 될 것인가? (2) 만약 여성의 자리는 가정인데 여성이 집을 나와 다람쥐처럼 사방을 돌아다닌다면, 그들을 다시 가정에 몰아넣고 거기 머물게 할 방법은 무엇인가? (388쪽)
해답은 389쪽부터 쭉 이어진다. <시녀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찾아서 읽어보실 만한 좋은 글이라고 말씀드린다. 이 문단은 요즘 읽는 책과도 겹쳐 남겨 두어야지 싶다.
프리던의 <여성성의 신화>는 대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너희의 진짜 학위는 미시즈(Mrs)라고 세뇌당했던 미국 여성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젊은 여성들에게는 이런 '집안의 주인' 세뇌가 크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후미진 곳에 살았고, 여전히 하늘을 나는 말괄량이 어밀리아 에어하트의 날개 아래 있었습니다. 거기다 우리에겐 『샤틀레인(Chatelaine)』이라는 여성 잡지가 있었죠. (384쪽)
마지막 문단(398쪽) 속의 ‘책의 운명’에 대한 애트우드의 의견은 정희진 선생님의 것과 아주 똑같아서 역시 ‘대가들은 서로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된다. 대가들은 서로 통한다.
애트우드의 소설은 시녀 이야기, 그레이스, 미친 아담 3부작, 눈먼 암살자, 증언들,을 읽었으니, 총 8권을 읽었다. 전작을 결심했던 작가이니 마저 읽는다면 올해 읽자, 하는 마음이다. 살아계실 때 읽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
존경하는 애트우드 대모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