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르토벨로의 마녀
파울로 코엘료 지음, 임두빈 옮김 / 문학동네 / 2007년 10월
평점 :



루마니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브람 스토커가 만들어낸 드라큘라로 유명해진 트란실바니아.
그 곳의 어느 집시 여인에게서 태어나
베이루트의 상류층 가정으로 입양되었다가
레바논 내전으로 영국으로 이주해서 살게된
"평범"이라는 수식어는 다소 어색한
한 여자의 이야기다.
"마녀"라는 중세 암흑기의 컴컴함이 책을 선뜻 펼치지 못하게 했지만,
코엘료라는 영혼의 보증수표로 일단 읽고 봤다.
지금 이 후기 비슷한 것을 쓰는 순간에도
책 제목이 프로벨로인지 포르토벨로인지 헷갈린다.

왜 코엘료는 영국의 많은 지명 중에 "포르토벨로"에 주인공 아테나를 살게 설정하고
그 동네를 이야기의 발상지로 선택했을까라는 쓸데 없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나의 무지함을 위로해주는 구글이 첫 검색 페이지에 보여준 것은
저 사진이 있는
1,000개 이상의 가게가 밀집한 세계에서 가장 큰 골동품 시장인 포르토벨로 시장 사이트였다.
"포르토벨로의 마녀"가 그리스의 남신 이전의 여신까지 거슬러 올라가 거론하며,
전통 춤이며 서체, 게다가 접신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저 골동품 시장이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3인칭 다 (여러 명) 관찰자 시점은 이 책의 시작을
진흙탕에 빠진 후륜자동차를 빼내야하는 것처럼
귀찮고 짜증나게했다.
그리고 초반부 시간의 순서가 보이지 않는 전개는,
그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는 각 섹션을 찢어서 다시 조판해야하나라는 두려움이 들 만큼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영혼의 보증수표는
"읽음"에 대한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었고 이렇게 (결국?)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머리를 막 감고 아주 푹신한 베개에서 9시간정도 정신 없이 자고 일어난 사람의
(웬만한 드라이나 빗질로는 수습이 안되는, 그래서 결국 다시 감는)
알수 없는 방향으로 굵게 헝클어진 머리처럼
마음과 머릿속이 카오스 상태가 되어버렸다.
새기고 싶은 많은 말들로 인해
꽤 많은 페이지의 위 아래가 두서 없이 접혀졌지만,
책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는 마음에 와닿게) 찾지 못한 불안함은
끝내 떨칠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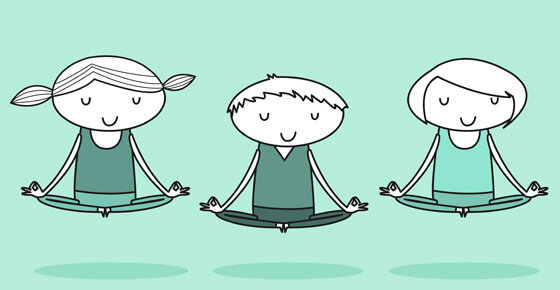
하지만, 아이와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대화를 하다 갑자기 난,
중세 사악한 주술과 세치혀로 사람들을 현혹해 화형에 처해져야한다는 마녀가 아닌,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Liviathan)의 거대한 괴물 같은 정부처럼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하는 남신이 아닌,
무한하고 지혜로운 사랑으로 가득한 여신의 존재를 인지한 것만으로
삶의 복잡한 여러 층 너머의 진리를 보는 통찰력을 가진 마녀처럼
아이와 함께 잠시 명상을 했다.
(다들 그렇듯이)
처음엔 웃기고 이상해하며 (조금 긴장하며) 웃던 아이가
잰다는 것이 의미 없어진 시간이 지난 후
그 조그마한 입에서
깨우침의 진리들을 말하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나는 책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있던
포르토벨로의 마녀가
(위대한 마법사의) 진귀한 스펠북인냥 처다보았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공간만 존재하기에 나는 현재형으로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