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 최후의 날에 관한 대화편이 <파이돈>이다. 철학자의 마지막답게 매우 철학적이다. '철학적'이라는 말에 여러 함의들이 있겠지만, 나같은 일반인에게는 보통 어렵다, 사변적이다 등을 의미한다.

어려운 <파이돈>을 좀 이해해 보기 위해 『철학 고전 강의』를 뒤졌다. 2016년 출판되었을 때 샀던 책인데, 강유원 선생의 고전 강의 시리즈 중 가장 어렵지만, 철학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 꽤 열심히 읽었다. 물론 관심이 이해를 길러주는 것은 아니어서 뭣도 모르고 읽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철학 중에서도 형이상학만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플라톤의 <파이돈>이다. 플라톤이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키고 있는 라파엘로의 저 유명한 그림, <아테네 학당> 덕분에, 플라의 철학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지상이 아닌 저 너머의 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어원이야 어찌 되었건 '너머의 세계' 가 metaphysics, 형이상학이다. 『철학 고전 강의』 의 표제를 수식하는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에서 추측할 수 있듯 저 너머의 세계는 무한자의 세계이다. 유한자는 무한자를 감각할 수 없지만 사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이상학을 존재케 하는 것 같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없기에 오로지 이성으로만 사유 가능한 세계에 대한 탐색은 원대하지만 진리로 인정 받기가 쉽지는 않다. 이성이 이 세계를 탐색한다 해도 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믿음으로만 열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어떤 사람들에게 형이상학이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일축되는 것이 그리 이상한 것도 아니다.

<파이돈>도 그렇다.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리인가 싶다. 독배를 마시는 날,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소크라테스와 나누는 대화가 죽음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은 자연스럽다. 차마 그를 보내기 힘든 추종자들은 슬픔에 가득 차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마침내 사유로만 추론하던 '너머의 세계'에 직접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푼 듯하다.
이렇게 하여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며 시작된 대화는 철학과 죽음, 영혼의 불멸성, 형상과 이데아, 기억 상기설 등 플라톤 철학의 핵심 개념으로 알려진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로 전개된다.
그 과정은 소크라테스가 늘 그랬듯이 변증술을 통한 것이다. <파이돈>에서 펼쳐지는 논박술과 산파술, 즉 변증술은 사실 내 눈에는 궤변에 가깝다. 현대의 과학적 관점으로는 말도 안 되고, 여지없이 반박될 것이 뻔한 것들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개의 논박들이 진실인가 아닌가라기 보다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들 즉 그 방법론이 철학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아닐까 싶다. 또한 그것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도 중요하다.
오늘날 지구상의 반 이상의 인구가 믿고 있는 '종교' 역시 비종교인의 입장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영혼론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종교인들이 모두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비과학적인 것도 아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종교는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를 읽는 방식을 제시한다. 사실 최고의 형이상학은 종교가 아닐까.
『철학 고전 강의』는 얼핏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파이돈>의 대화에서 읽어 내야 할 의미들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길잡이가 된다. 왜!,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불멸해야 하고, 그 영혼은 형상에 대한 확실한 앎을 가져야 하고, 인간은 그 앎을 기억해내야 하는지, 그 모든 형이상학적 논변의 기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좋음(올바름)위에 단단히 뿌리 내리기를 염원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간절한 신념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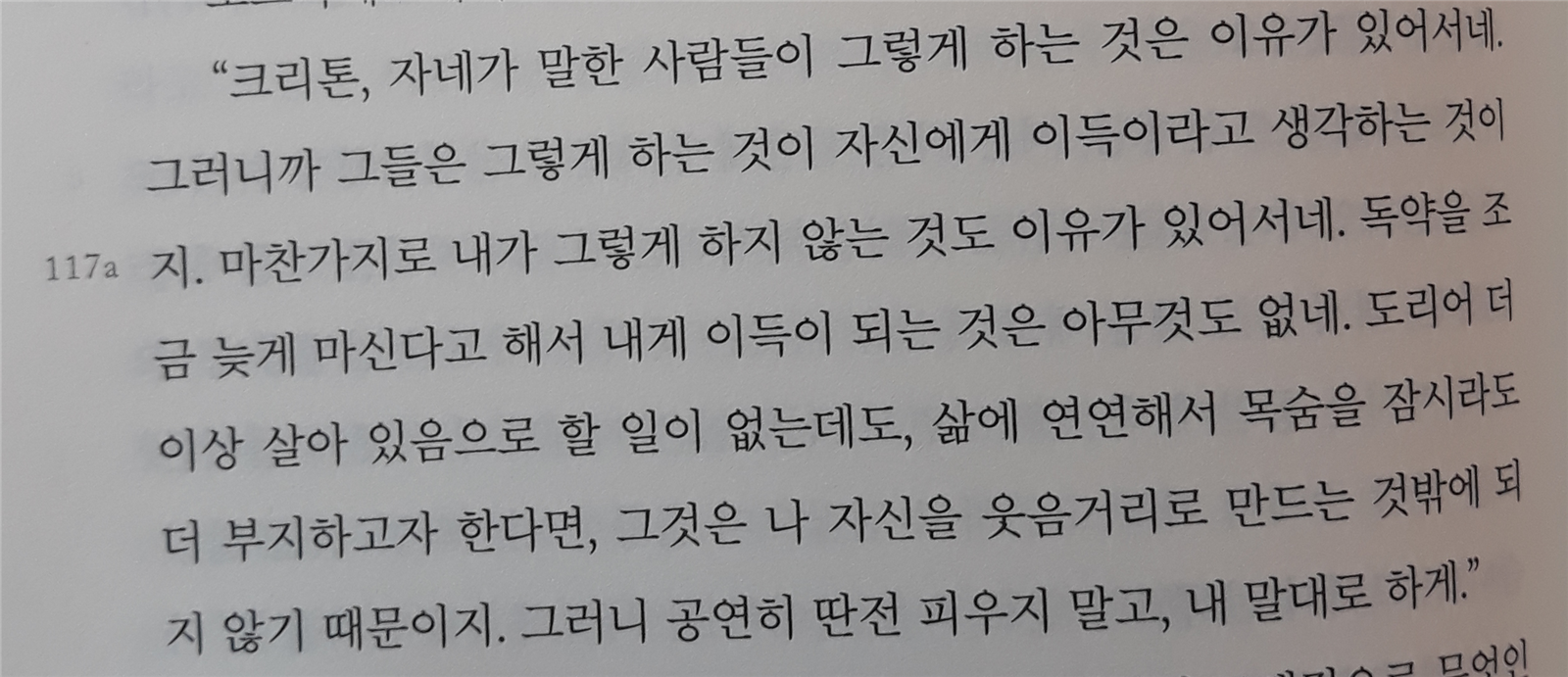
<1권 116e~117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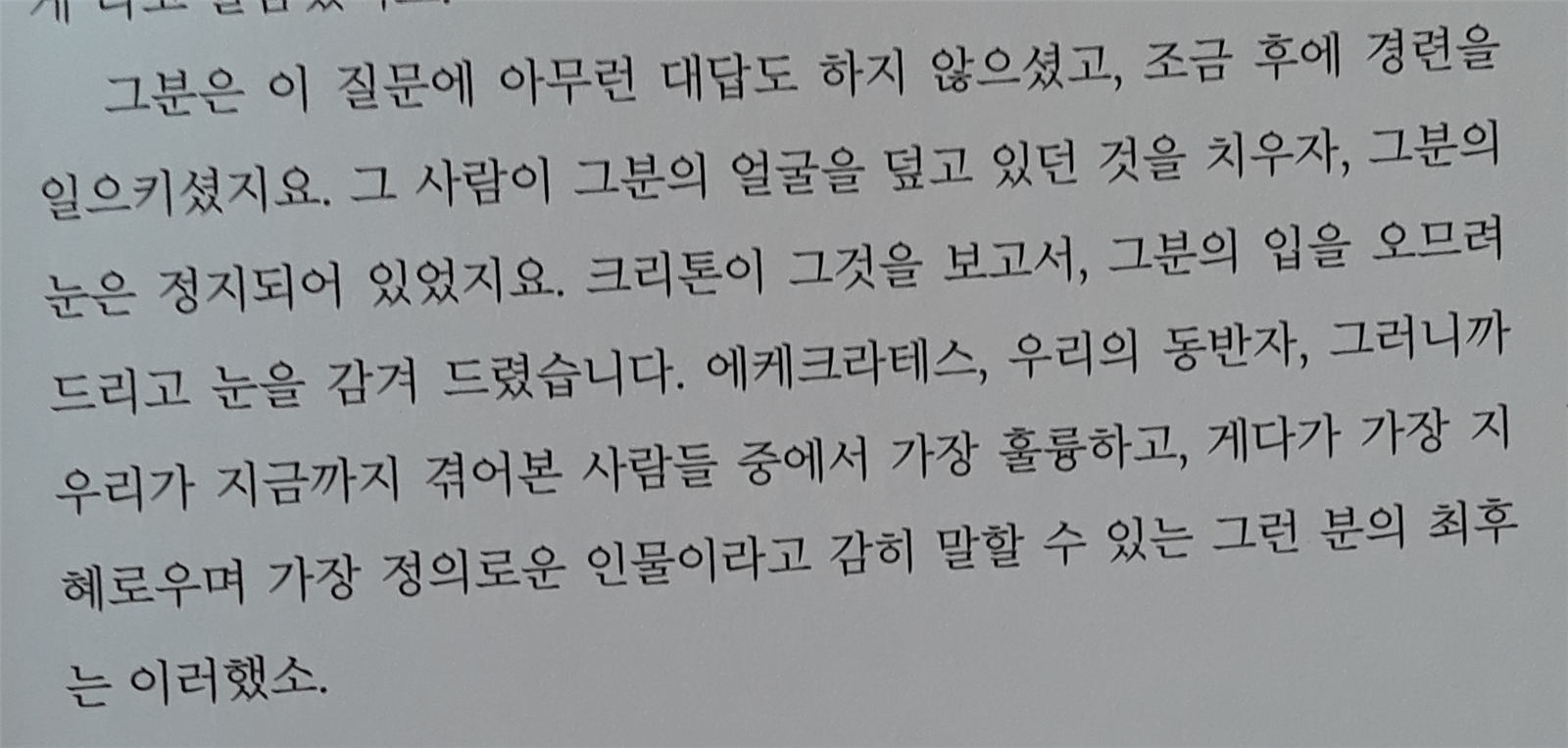
<1권 118a>
우리의 철학자는 영원한 형상의 세계인 이데아로 가뿐하게 날아 올랐지만, 현실 세계의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생을 마감했다. 가장 훌륭하며,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정의로운 사람, 소크라테스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