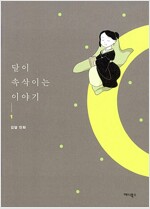


어제는 추석.
오가는 친척도 없고 - 아니, 고모가 잠깐 다녀갔고 뭐 그리고...
아니, 어쨌든 추석 차례를 안지내니 우리 집에는 오히려 더 먹을만한 음식이 없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반찬들을 뒤섞어 비빔장에 야무지게 비벼먹고 배 두들기며 있다가, 저녁에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 그르렁대며 코를 골고 주무실즈음.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맥주 한 캔을 꺼내들어 마른 오징어와 땅콩을 열심히 씹어 먹으며 마셔댔다. 술을 잘 못마시는 탓에 삼백미리 조금 넘는 맥주 한캔을 다 마시고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다가 문득.
아, 오늘은 추석. 수퍼문이 뜬다는데, 라는 생각에 휘청거리며 밖으로 나가 달구경을 했다. 달보다 더 환히 집 마당을 비추는 가로등불빛때문에 달님의 훤한 빛을 제대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좋았.... 지? 추석이니까. 이러니저러니 말이 많아도 어쨌든 만물이 풍성해지는 추석이니까.
지난 금요일 다들 서둘러 퇴근해버리고 나도 뒤질새라 급하게 사무실 정리를 하고 연휴동안 읽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책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짐이 무겁다는 핑계로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누군가 저 사람 괜찮나, 하고 있었는데 조는건지 뭔지... 다들 별다른 신경을 안쓰고 있고 나 역시 휴대폰 화면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졸고 있던 아주머니, 결국은 졸다가 뒤로 확 넘어진 거다. 아무리 앉아있었다 해도 의자 높이가 있어서 뒤통수가 쿵, 하고 소리 날만큼 맨바닥에 부딪힌거라면... 좀 걱정이 되는데 - 사실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난 후 누군가 그렇게 훅 넘어지는 걸 보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한다. 휴대폰만 잡고 멀뚱히 서 있는 나와는 달리 앞쪽에 있던 학생이 재빨리 일어나 아주머니 일으키고 옆쪽에 있던 아주머니 한분도 보호자 전화번호 말하라면서 계속 말을 걸며 안정을 취해주고 있었다.
음... 근데 그 분. 정말 아픈게 아니라 졸고 있었던 게 맞는 듯. 옆에서 부축하던 아주머니가 '술 마셨구나? 집이 어디예요! 가족 전화번호 없어요? 어디 가는거예요?' 라고 묻는 걸 보니 술에 취해 드러누우려고 했던 것 같다. 하아...
그런데. 술에 취해 정신없는 아주머니. 고개를 돌리시는데 얼굴이 웃고 있다. 어떤 일로 술을 마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찌들어 힘들어도 왠지. 술을 마시고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짠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진다. 술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모든 것 내려놓고, 웃을 수 있다는 것. 왠지 그때야 비로소 '추석'이구나, 싶어졌던 것.
아, 그래서 나도. 백만년만에 맥주 한 캔을 마셨는데. 지난 주 메니에르로 어지러워 쓰러져있었던 것이 다 낫지를 않아서. 힘들었나보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뛰어대서 괜히 새벽까지 잠도 못자고. 쓰읍.
아무튼. 목요일 책 주문을 하고 싶었지만 택배가 밀리는 상황에서 어차피 추석연휴가 지나야 받을 수있을 것 같아서 미뤄 뒀다.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뭘 사려고했지? 하고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