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에도 나의 위안은 나뿐 아니라 동시대의 모든 인류가 사랑을 마스터하지 못한 ‘사랑 바보’라는 것이다. 나는 그들과 안데스의 장터에 주저앉아서, 혹은 메콩 강에서 나무보트를 타고 가면서, 혹은 심해의 바닥처럼 푹 꺼진 어느 게스트하우스의 낡은 소파에 마주 드러누워서, ‘똑같이’ 모자란 머리를 맞댄 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장터와 나무보트와 푹 꺼진 소파 위에서도 가감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오대양 육대주의 우리가 모두 사랑을 ‘잘’ 하고픈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나의 위안은 나뿐 아니라 동시대의 모든 인류가 사랑을 마스터하지 못한 ‘사랑 바보’라는 것이다. 나는 그들과 안데스의 장터에 주저앉아서, 혹은 메콩 강에서 나무보트를 타고 가면서, 혹은 심해의 바닥처럼 푹 꺼진 어느 게스트하우스의 낡은 소파에 마주 드러누워서, ‘똑같이’ 모자란 머리를 맞댄 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장터와 나무보트와 푹 꺼진 소파 위에서도 가감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오대양 육대주의 우리가 모두 사랑을 ‘잘’ 하고픈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그 어떤 경우이든지간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케이크의 장식처럼 맨 위에 환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랫단에 침전물처럼 상처가 가라앉아 있었다. 이야기는 늘 케이크의 맨 윗단에서 시작해서 맨 아랫단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길어졌다. 환희는 대충 돌보아도 알아서 잘 자라는 반면, 상처는 잘 돌볼 때만 썩지 않는 까닭이었다.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놀랍게도, ‘발화發話’되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한 번의 상처와 한 번의 회복은 언제나 한 번의 성장이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장하지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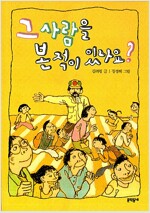 때로는 힘들고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테지요. 어른들도 부족한 게 많아 번쩍 안고 원하는 곳으로 옮겨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덜 힘들게 덜 아프게 덜 무섭게 그 시기를 건널 수 있도록 건널목이 되어 줄 수는 있습니다. 친구라도 좋고 이웃이라도 좋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도 괜찮고, 누군가 먼저 내민 손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_김려령
때로는 힘들고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테지요. 어른들도 부족한 게 많아 번쩍 안고 원하는 곳으로 옮겨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덜 힘들게 덜 아프게 덜 무섭게 그 시기를 건널 수 있도록 건널목이 되어 줄 수는 있습니다. 친구라도 좋고 이웃이라도 좋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도 괜찮고, 누군가 먼저 내민 손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_김려령
 이 책은 우리의 농경문화 속에서 민초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풀과 나무를 그 민초의 생활 속 눈높이로 바라본 나무 이야기다. 특히 수림樹林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천연기념물 제93호인 성황림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자가 오랜 세월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해온 풀과 나무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여타의 나무식물학 서적이나 나무 에세이류와는 구별이 된다. 특히 농사꾼이자 목수였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무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과 어머니나 주변 어른들, 때로는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풀과 나무의 갖가지 생활상식과 민담 등을 놀라운 기억력과 애정으로 갈무리하여, 그것을 강원도 영서지방 구전 민속의 구성진 내용들과 버무려 ‘민초’의 관점에서 두드러지게 조망하고, 나무의 생태학을 마치 민중의 자서전과도 같이 써내려갔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화되지 않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지, 또한 그것이 현 시점에서 얼마나 새롭고 진귀하게 여겨지는 지에 대해서 여실히 깨달을 수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산업체를 경영하는 저자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성황림마을의 자그마한 오두막집을 주말마다 오가면서 텃밭을 일구고, 현지의 식생과 민속, 마을의 민속지를 부지런히 관찰하고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끝에 그 내용의 일부를 이번 책으로 엮어냈다. 이 책은 저자가 그린 그러한 큰 밑그림의 일부이며, 그런 점에서 현재진행형인 이 책이 쓰여진 시간은 지난 수십 년이요 거기 들어간 역사적, 심리적, 문화적 에너지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의 농경문화 속에서 민초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풀과 나무를 그 민초의 생활 속 눈높이로 바라본 나무 이야기다. 특히 수림樹林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천연기념물 제93호인 성황림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자가 오랜 세월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해온 풀과 나무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여타의 나무식물학 서적이나 나무 에세이류와는 구별이 된다. 특히 농사꾼이자 목수였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무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과 어머니나 주변 어른들, 때로는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풀과 나무의 갖가지 생활상식과 민담 등을 놀라운 기억력과 애정으로 갈무리하여, 그것을 강원도 영서지방 구전 민속의 구성진 내용들과 버무려 ‘민초’의 관점에서 두드러지게 조망하고, 나무의 생태학을 마치 민중의 자서전과도 같이 써내려갔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화되지 않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지, 또한 그것이 현 시점에서 얼마나 새롭고 진귀하게 여겨지는 지에 대해서 여실히 깨달을 수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산업체를 경영하는 저자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성황림마을의 자그마한 오두막집을 주말마다 오가면서 텃밭을 일구고, 현지의 식생과 민속, 마을의 민속지를 부지런히 관찰하고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끝에 그 내용의 일부를 이번 책으로 엮어냈다. 이 책은 저자가 그린 그러한 큰 밑그림의 일부이며, 그런 점에서 현재진행형인 이 책이 쓰여진 시간은 지난 수십 년이요 거기 들어간 역사적, 심리적, 문화적 에너지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