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도나 해러웨이
도나 해러웨이의 사상과 삶, 저작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도나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자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도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부분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비판 중 최선의 버전은 자신이 비판하는 이론에 자신도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비판은 다르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자원을 이론으로부터 끌어내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의 실천에 관한 도덕적, 윤리적 입장과 함의를 더욱 깊이 탐구한다. 비판과 해체를 위해 반드시 파괴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진지하고 강인한 겸손에서 이득을 얻는 경우도 많다. (14쪽)
파괴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지하고 강인한 겸손을 통해, 문제의 핵심에 다다르고, 한계를 넘어서고, 그래서 더 나은 비판으로 갈 수 있다는 제안. 스스로에 대해 자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닌가 싶다. 도나 해러웨이를 기본값으로 하고, 조지프 슈나이더를 새롭게 발견한다.


2. Rebecca / 레베카
작년에 두 번째 읽으면서 이 책을 더는 읽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건, 맥심이 키우는 개 제스퍼와 관련한 화자의 속마음 토크 때문이었다.
나는 맥심 팔에 몸을 기대고 그 소매에 얼굴을 묻은 채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내 손을 톡톡 치면서 비어트리스와 이야기를 했다. '이건 내가 재스퍼를 대할 때와 똑같잖아.’ 나는 생각했다. '지금 나는 재스퍼처럼 굴고 있어. 그는 생각날 때마다 나를 어루만지고 그럼 난 기분이 좋아지지. 그는 내가 재스퍼를 좋아하듯 나를 좋아하는 거야.’ (158쪽)
화자 ‘나’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재스퍼와 같다고 느낀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가 자신의 지위를 깨닫는 이 장면이 싫었다. 인간이 아닌, 인간보다 못한 계급으로서의 ‘여성’을 인식하는 순간에 느껴지는 불쾌감과 비슷했다.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농경을 통한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인류 초기 사회에서 통용되던 가부장제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여성은 자신을 하나의 집단으로 의식하지 못했다. 여성의 역사 자체가 가려졌고, 여성의 목소리는 지워졌다. 여성은 다른 계급의 여성보다는 같이 사는 남성에게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성의 지위와 상관없이 ‘여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은 전 세계 ‘보편의’ 현상이다. 여성은 판사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지만, 여성이라는 굴레, 여성이라는 존재로부터 발생하는 억압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여성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과 관련된 억압만으로 이 세계의 모든 불평등이 구성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각 여성은 자신의 인종, 계급, 젠더, 나이에 따라 다른 위치에 설 수밖에 없고, 그 위치에서 자신이 사는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의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로 인한 억압은 오히려 당연한 측면이 있다. 우리가 ‘개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이 개에게 요구하는 순응과 충성을 각자가 요구받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담보로 일하고, 그 대가로 일정 정도의 (대부분, 노력보다 적은 금액의) 돈을 받는다. 부모를, 상급자를, 고용주를 굴욕적인 태도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삶에는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 손을 쓰다듬는 그 관계에, 그 무심함에 결국에는 적응한다. 소설 속의 ‘나’, 소설 속의 ‘여자’ 주인공만 그런 것은 아니란 의미다.
이번에 읽으면서는, 범죄의 고백과 공모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강한 애착을 느끼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비밀을 공유한 사이에서만 가능한, 눈빛으로 오가는 대화. 비밀을 털어놓고 난 후에야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자의 비겁함. 그런 순간들이 새롭게 다가왔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안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알 것 같았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이해하고 싶어하는) 내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화자의 기쁨이 선명하게 전해져 좋기도 했다.
내가 고른 문장은 여기. 한글에서도 이런 말장난이 재미있지만, 영어로도 역시 재미있다는 걸 확인한다.
I understood it all. Frank knew, but Maxim did not know that he knew. And Frank did not want Maxim to know that he knew. And we all stood there, looking at one another, keeping up these little barriers between us. (34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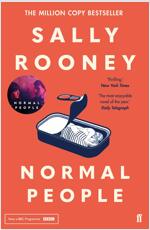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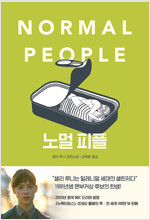
3. Normal People / 노멀 피플
이런 비유를 쓰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굳이 말해보자면, 내게는 『Pachinko』가 훨씬 쉽게 읽혔다. 『Pachinko』가 특별한 구성의 변화 없이 시간 순으로 전개되는 서술 방식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Pachinko』에서는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비교적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마치 원작인 한글 소설을 영어로 번역한 것처럼, 한글 소설을 읽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Normal People』도 구문의 구조나 단어로 보았을 때 어려운 소설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내게는 어렵게 느껴졌다.
그저께 도서관에서 대출한 번역본을 읽어보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영어 때문이 아니었다. 한글로 읽어도 어려웠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코넬과 마리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이 싫었고, 그런 행동이 ‘시크하게’ 그려진 것이 싫었다.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싫었고, 그런데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에 짜증이 났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 모든 걸 주고 싶고, 이미 주어 버린 사람 앞에서, 얼마나 시크할 수 있을까. 얼마나 시크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어느 정도 적당한 사랑이 ‘쿨한’ 건가. 이런 모든 물음을 가득 안고서 다음 챕터로 넘어간다. 시작했으니 끝내야 한다. 혹시 모르는 일 아닌가. 소설을 다 읽을 때쯤에 코넬을 좀 더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4. 작은 파티 드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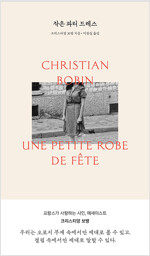

프랑스어 책읽기 진도가 한참 밀려 있을 때, 부지런히(진도 밀렸을 때, 특히) 읽어가고 있을 때, 만난 장면이다. 대리석 테이블을 마주 보고 기자가 작가를 인터뷰하고 있다. 작가의 책을 읽지 않았음이 분명한 기자가 하나 마나 한 질문을 하고, 작가는 하나 마나 한 답변으로 응한다. 지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만년필과 수첩을 챙겨 떠날 채비를 하면서.
엄청난 사랑이, 열정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상대방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는다. 그건, 막을 수 없겠죠. 그 앞에선 완전히 속수무책일 겁니다. 사랑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세상 무엇보다 훨씬 더.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입을 다문다. 기자도 입을 다문다. 두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게 덩달아 입을 다문다. 한마디 말이 발해진 시간, 기만을 떨쳐버린 휴식의 한순간, 거짓을 던져버린 영원의 한순간이다. (114쪽)
이 기자의 물음이 바로 내 친구,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그 친구의 물음이다.
조나단을 주세요 https://blog.aladin.co.kr/798187174/13569472
엄청난 사랑이, 열정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나단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완벽한 혼란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던 바로 그 질문. 입을 다물게 만드는 물음. 기만을 떨쳐버리는, 거짓을 던져버리는 물음.
엄청난 사랑이, 열정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