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미래의 한국에서 존엄사(안락사)법이 통과되는 짧은 소설을 읽었다.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삶을 늘려나가고 그리하여 삶의 길이를 조절하는 것이 선택이 된다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라는 질문을 친구들에게 물었다. 항상 생의 의지로 가득한 이는 자신의 너무도 자명한 존재함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조차 할수 없노라고 했다. 나는 끝까지 살아있겠다, 가능한한 오래, 기왕이면 건강하게. 길지 않은 삶에 겹겹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껴들곤 했다는, 그것들이 너무 가까이있어 괴로웠다던 친구2는 말했다. 나는 고통이 너무 싫어. 그걸 피하고 싶어. 만약 죽음이 고통스럽다면, 기술로 고통만 정말 깨끗하게 제거된다면 기꺼이. 어쩌면 그건 내일이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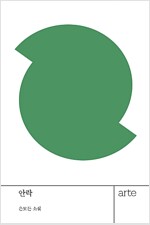
나는. 나의 경우 그것은 선택이 아니길 바랐다.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듯 죽는 것 또한 내 선택의 영역은 아니었음 싶었다.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선택이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자연사하고 싶어. 이런 저런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고통스럽더라도 삶을 더 늘려볼래? 기구에 의지해볼래? 부작용이 있는 약을 먹을래…? 등등 그런 진지한 질문을 마주하지 않은 채로. 어느 날 문득 생명이 다해서 병원에는 가지 않는 채로 그냥 죽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선택해야하는 것은 그 자체로 괴로움이다. 과거의 인류였으면 앓다가 갔겠지. 나는 나의 죽음을 모르고 싶다. 나는 나의 삶의 기한을 정하고 싶지 않다. 내 삶은 내 책임이더라도 죽음까지도 책임지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태어나는 건 막 태어났잖아. 어쨌든 그때 나는 그랬다.
우리가 나눈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삶에 대한 토론이었던 걸까, 고통 혹은 병에 대한 토론이었던 걸까, 아직은 건강하고 젊은 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철 모르는 고준담론일까.

비슷한 시기에 읽은 다른 단편집도 있다. 도덕관과 정치적 견해로 끝없는 논쟁을 하던 젊은 부부는 존엄사를 위해 스위스 행을 택하겠다는 건강한 이모를 말리지 못한다. 소설에서 이모가 결심하게 되는 장치로 설계되어 있는 소재는 혼자서 키우는 고양이 한마리를 떠나보냈을 때다. 등을 보이며 앉아있는 내 고양이를 바라보며 나도 울었다. 이대로 너랑 쭉 지내며 늙어가면서, 이모처럼 담담해질 수 있을까.
친구 A는 요즘 늦바람(내 생각에는 안늦었는 데)난 재테크 공부에 푹 빠져있다. MBTI로 따지면 나는 꽤 확실한 N인 것 같고,친구는 아마도 S일 것으로 추정된다. 공상적인 내 발이 땅에서 떨어질 때 마다 A는 내 어깨를 두드린다. 야야, 너 지금 5cm 정도 세상과 괴리되어 있어. 그럼 나는 구름을 보다가 발 아래를 본다. 탁, 땅으로 내려온다. 오, 이제 안전하다. 현실과 접하는 지점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물적 토대를 만드는 일에는 A에게 조언을 구하는 편이다. 너랑 마블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지만, 너랑 돈 이야기하는 건 더 재밌어라는 건 어마어마한 칭찬 아닌가. 마블급으로 재밌어야할 나의 돈 이야기는 우주적 스케일로 다룰 것이 많은 어마어마한 자산의… 그러면 좋겠지만. 나는 가난하다. 가난에 익숙한 데다가 직장에서까지 뛰쳐나온 나에게 친구가 이 책 좀 제발 보란다.

친구가 왜 나에게 추천했는 지 너무 알것 같은, 돈 없는 글쟁이의 반성어린 고찰을 읽고… 당연히 통장을 네가지로 나눴어야 했으나, 와따시가 한짓은 양배추즙을 주문하고, 스위스 존엄사 비용을 검색하는 일이었다…;; 대략 1300만원, 마지막 여행비용 및 이런저런것들 까지 포함해서 약 3000만원정도는 따로 모아둬야 할 것 같다. 만들자, 웰다잉 적금. 언제 죽을지는 차차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죽을지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혼자 고스란히 겪어낼 수 밖에 없는 삶과 딱 붙어있는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한다면, 삶이 더 굳건해지는 것 아닐까.
혼자서 살기로 마음 먹은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 혼자인데다가 아프고 가난하기까지해서 결국은 혼자이고 싶지 않았을 때 가장 혼자가 되는 것일 거다.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죽을 때 곁에둘 사람을 살 수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곁에 둘 사람을 돈으로 사서라도 외로움을 방어해야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갖추면 되는 일 아닐까요? 정답. 그러나 내게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돈 만큼이나 불가해한 영역이다. 돈은 측량이라도 가능하지. 어쨌든 어떤 결단을 내려야하는 순간에 스위스라는 선택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니까.
아무래도 걱정되기 시작한 알콜 의존증 때문에 근 5년만에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다. 다시 한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는 데, 엊그제가 3회째 였다. 하는 운동있냐는 질문에 달리기를 이야기했다. 맙소사, 쌤은 하프 마라톤은 너끈히 달리는 러너셨다. 혼자서 달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저런 다른 재미들도 알려주시길래 귀담아 들었다. 전국 팔도 강산에서 좋은 풍경끼고 계절마다 아름다운 달리기 대회들이 열린다고… 어제 산책하다가 3월 중순쯤에 벚꽃 테마로 10km 달리기 대회가 있다면 그걸 참가해보는게 어떨까 싶어 번뜩했다. 좋아. 이번 겨울을 끝내면 나는 벚꽃을 맞으며 10km를 달려낸다. 의지 활활! 상담시간의 끝 무렵에 ‘함께’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다 없으면 못살 것처럼도 여겼던 이 단어를 매우 답답하게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쌤이 함께를 이야기하시는 순간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쌤 왈, 우리 그 단어는 금지 단어로 지정할까요? 혼자가 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게 얼마전까지의 내 인생이었다…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렇게 변해버린 걸까나.
이별을 경험할 때, 없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고통을 감각할 때, 혼자를 마주볼 때 — 역설적으로 내 자신이 생생해진다.
내가 단단해지면 내가 없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생님의 말은 가능성처럼 느껴졌다.
내가 있어지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 같은 무게로 내가 없어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토요일 오전을 달리기로 한다. 일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