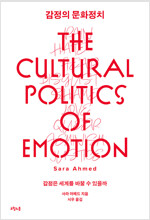
계획이 없는 사람이기는 한데, 원래 계획으로는 이 책을 다 읽고 리뷰를 쓰리라, 잘 정리된 리뷰를 쓰리라 했는데, 그렇게 했다간 아무것도 못 쓸 것 같아, 일단 1장을 정리해 둔다.
1장의 제목은 <고통의 우연성>이다. 도입은 ‘지뢰 제거 사업’의 후원자를 모으기 위한 소식지의 일부이다. 발신자인 자선단체는 사회경제적 관계로 인해 고통 당하는 이들을 후원하며 돕는 ‘훌륭한 일’에 서구의 ‘독자’를 초대한다. ‘착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행세’하려는 이들에 대한 사라 아메드의 평가는 박절하다. ‘서구는 먼저 빼앗고 난 뒤에 베푸는 셈이다(61쪽)’. 그다음 단락부터는 ‘고통’의 근원적 의미에 대해 추적이다.
프로이트는 자아란 “다른 무엇보다도 신체적”이라고 주장(65쪽)했는데, 아메드는 그중에서도 신체적 자아의 형성이 표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인간에게 있어 표면은 어디일까. 피부? 피부. 로즐린 레이가 이야기하듯이 “자아와 세계를 구분하는 경계인 피부를 통해…… 모든 인간 존재는 수많은 인상을 받게 된다.” (67쪽)
개별적일 수밖에 없는 고통. 고통당할 때, 고통받는 이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고통 혹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한다.
고통은 주로 '이미 있는 것'으로 경험된다. 고통은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렵다. 과거의 고통이든 현재의 고통이든 설명하기 쉽지 않다. 고통을 겪은 경험을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이를 '나의 고통'으로 간주한다.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77쪽)
사랑하는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기를 바랄 뿐 아니라 상대를 대신해서 고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이때 사랑은 공감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렇게 바라는 이유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주체는 상대가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것을 '느낀다’. (78쪽)
고통받는 사람은 주위의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한다. 고통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해와 공감이다. 하지만, 자아 경계 밖의 외부에서 그를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근본적으로 타인의 고통은 이해 불가능하다. 그가 나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듯이, 나 역시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각자의 ‘육체’ 속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나는, 내 육체 속 나의 고통만을 인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통받는 사람의 옆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엄기호는 이렇게 썼다.

고통은 동행을 모른다. 동행은 그 곁을 지키는 이의 곁에서 이뤄진다. 그러므로 고통을 겪는 이가 자기 고통의 곁에 서게 될 때 비로소 그 곁에 선 이의 위치는 고통의 곁의 곁이 된다. 이렇게 고통의 곁에서 그 곁의 곁이 되는 것, 그것이 고통의 곁을 지킨 이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고통의 곁에 선 이는 고통을 겪는 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다.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249쪽)
나눌 수 없는 고통, 전할 수 없는 고통을 함께하는 방법.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 있다가 그의 고통에 같이 침몰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그는 말한다. 고통의 곁에서 그 곁의 곁이 되라고.
<고통의 정치>에서 아메드는 호주 원주민에 대한 백인 정부의 잔혹한 정책(원주민 어린이를 원가족 및 원주민 공동체로부터 강제로 분리시켜 백인 가정에 보냈던 일, 약 70년 동안 강제 분리 정책으로 최소 10만 명의 원주민 어린이가 고통을 겪었다고 알려짐)을 고발하면서, 호주인들이 개인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 <이제는 이들을 집으로>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쓴다.
몸으로 형상화된 국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통에 반응하면서 원주민의 몸을 대신한다. 원주민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타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해석하는 일, 타자의 몸(여기서는 국가의 몸)을 회복시킨다는 이유로 타자에게 공감하는 일은 폭력을 수반한다. 그러나 타자의 고통이 국가의 고통으로 전유되고 타자의 상처가 국가의 손상된 피부로 물신화되는 일에 대해 타자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을 듣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89쪽)
핵심은 ‘타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해석하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공감’은 타자에 대한 폭력이다. 섣부른 이해, 과한 공감이 타자의 고통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들어야 한다. 고통에 대해 듣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이 불가능한 일을 함께하는 것. 그녀/그에게 듣는 것. 그것을 배우는 일이, 외부로서의 내가,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다.
연휴 첫날에는 시아버지를 모신 곳에 다녀왔다. 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 앞에만 서면 순간적으로 ‘멍해진다’. 연휴 둘째 날에는 시댁에 갔다. 아침을 먹고 치우고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먹고 치우고 과일을 먹고 돌아왔다. 연휴 셋째 날에는 교회에 갔다가 엄마 아빠와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돌아왔다. 연휴 네째 날에는 밀린 빨래를 하고 배불러서 밥은 많이 먹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커피를 마셨다. 책을 링크할 수도, 제목을 말할 수도, 작가 이름을 말할 수도 없는 로맨스를 한 권 읽었다. (궁금하신 분 비댓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분에게만 살짝쿵 ㅋㅋㅋㅋㅋㅋㅋ) 가끔 주위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한다며, (내) 영어 공부의 목표가 무엇이냐 물을 때가 있다. 누가 묻던지 내 대답은 하나인데, 영어책을 ‘빨리’ 읽고 싶어요, 가 내 답이다. 읽고 싶은 책을 빨리 읽는 것. 내가 이렇게 빨리 읽는 사람인지 몰랐다. 0.6일, 정확히는 4-5시간 만에 한 권을 다 읽어버렸다.
어제 아침에는, 음식이 뜨거울 때는 간이 잘 안 느껴진다는 걸 알게 됐다. 몰랐던 건 아닌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자 까맣게 잊어버렸던걸, 친구가 알려줬다. 너무나 확실한 ‘맛없음’에 실패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육전이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육전으로 변신한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
나는, 그만두고 갔으면 좋겠는데. 세월은 뭐가 그리 좋은지. 내가 그리 좋은지. 손목을 휙 잡아채서는 확확 끌고 간다. 이렇게 시간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