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덕분에 <경향신문>을 구독하게 되면서 책을 읽게 되는 시간은 이래저래 줄게 되었다. 매일같이 신문을 읽어내려가는 것은 짜증나면서도 재밌는 일이다. 나는 토요일자 신문을 유달리 기다리는데, 토요일에는 따끈따끈한 신간 소식들이 잔뜩(?) 실려오기 때문이다. 신문 덕분에 책은 덜 읽게 되면서도, 쟁여 논 책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가니, 혀를 찰 노릇이지만, <경향신문> 하나로는 부족해서 토요일이면 꾸준히 <한겨레>를 편의점에서 사서 책 소식을 유의깊게 살펴본다. 어제 <한겨레> '책과세상'에 시집 출간 소식이 있어, 리뷰기사를 옮겨 온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책 소개를 보고는 보관함에만 담아 두고 말았는데, 이제는 좀 더 유의미하게 챙겨두고 볼 작정이다.(2009년은 좀 한가로워져서, 쟁여둔 책들을 꺼내 읽을 작정이기도 하다.) 알라딘의 몇몇 분들께서 인문사회나 문학분야 신간 소식들을 스크랩해서 알려주시지만, 시집은 좀 소홀하지 않나 싶다. 물론, 시집 출간 소식들을 신문에서도 뜸하게 다루고 있는 것도 나로서는 좀 불만이다. 일단 나를 위해서, 그리고 시집에 관심 갖고 계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시집 소식만이라도 꼼꼼히 챙기는 2009년이 되도록 하고 싶다. 춥고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집은 효과적인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방송작가 20년 접고 ‘시로 마음을 방송하네’"(최재봉 문학전문기자)
<한겨레> 2008년 12월 27일 토요일, 13면.

말이란 소통의 도구인 동시에 오해와 갈등의 진앙지이기도 하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 주기도 하고 살천스럽게 끊어 놓기도 한다. 말은 야누스의 얼굴을 지녔다. 그것은 물론 말을 부리는 인간의 본성이 야누스적이기 때문이다.
김경미(49)씨의 새 시집 <고통을 달래는 순서>는 말과 인간의 그런 야누스적 속성을 탐사한다.
“비천과 험담 그치지 않는 입을 만났다/ 찻집 화장실에 가서 입을 몇 번이고 헹궜다/ 다 헹구고 거울 속 입안을 들여다보니 혀가 두 개였다”(<무언가를 듣는 밤> 첫연)
“단체버스, 늘 맨 뒷자리에 혼자 떨어져 앉는다/ 내 귀가 어색하고 허랑한 내 말을 좋아하지 않아/ 내 입과 좀 떨어져 앉으려는 것이다”(<조금씩 이상한 일들 3> 부분)
비천하고 허랑한 말을 내뱉는 혀에는 남과 내가 따로 있지 않다. 하나의 입 안에 두 개의 혀가 있는 바에야,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 불가능한 노릇은 아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남을 기망하는 혀 놀림 앞에 시인의 섬약한 자아는 무시로 상처 입는다.
“저녁밥 빛깔로 입속에 앉힌 묵언/ 그 재속(在俗)의 하안거 며칠/ 지나/ 고양이 걸음에 연꽃 떠받치듯 나선 외출//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가슴에 대못이 박혀 돌아왔다”(<상심> 전문)
“몇 날이고 수도승처럼 눈만 감다가 모처럼 나섰다/(…)// 다정한 모임 속 네가 갑자기 내 머리에 못을 박았다”(<그날의 배경>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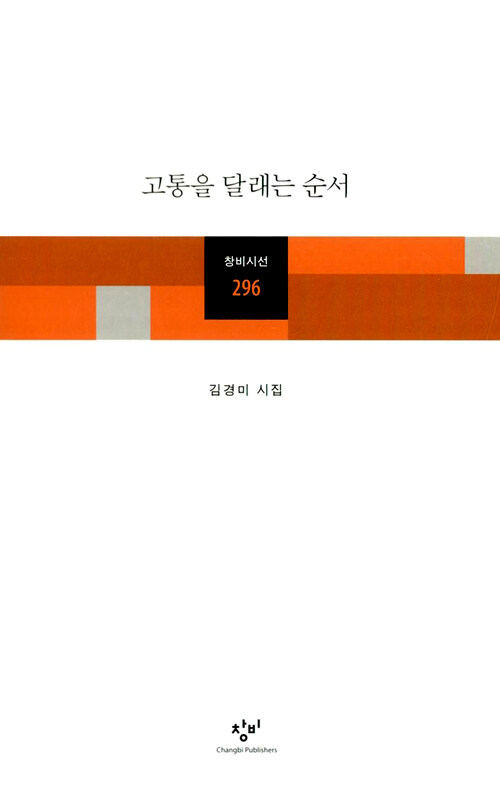
상처 받는 것이 두려워 집에 틀어박혔던 시인은 모처럼 용기를 내 바깥 걸음을 한다. 그러나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만다. 그것도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동일하게. 은둔과 상처가 일종의 패턴처럼 반복되는 형국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세상과 사람들이 유독 그에게 적대적인 걸까? ‘끔찍하게 민감한 마음’이란 국내에 번역되었던 버지니아 울프의 산문집 제목이지만, 시집 <고통을 달래는 순서>의 화자야말로 바로 그런 마음의 소유자로 보인다.
“안심할 때만 골라서 뒷머리에 돌을 맞거나/ 시작하려 하자마자 떠나거나/ 애절하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거나/ 한밤중에 깨어 일어나 찬밥을 먹거나/ 한낮의 버스에서 쇼핑백 터지듯 울음이 터지거나,”(<눈물의 횟수> 부분)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는 것이다. 재수가 없다거나 불운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무언가가 여기에는 있다. 아홉 번을 울어야 할 때 달랑 한 번만 울고 마는 고장난 뻐꾸기시계처럼 시인과 세상은 서로 리듬이 맞질 않는다. 그 어긋남이 그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연희>에 따르면 그의 이런 기질은 선천적인 것이다. <글씨의 시절―방송국에서>는 그가 지난해까지 20년 넘게 해 온 방송작가 일(=‘지렁이 환전’)이 그런 기질을 더욱 악화시켰음을 알게 한다. 그렇지만 이 두 시는 그의 선천적이며 후천적인 인간혐오증과 염세주의가 개선될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열한살 너의 봄 때문에 사람들이랑 잘 못 놀아준 봄들을/ 돌려세우는 저녁이란다”(<연희> 부분)
“바로, 그 지렁이 환전이, 밥솥의 김 같은 것이어서/ 그토록 오래도록 저녁 해거름이면 밥 먹어라,/ 나라는 동네 어귀에 대고 어머니처럼 불렀구나”(<글씨의 시절> 부분)
시인의 도저한 비관주의가 자기반성을 거쳐 포용과 화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시는 시집 전체를 관류하는 커다란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인용된 두 시에서도 그러하지만 시집의 압도적인 시간대는 저녁이다. 그 저녁은 “세상에 정 주고 저물녘, 마음 허물어지지 않은 날/ 하루도 없으니”(<해질녘>)에서 보듯 상처를 확인하는 무렵이자, “저녁이라는 이름 하나면 이곳에 속했던 추억 충분히 벅차다고”(<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 말하게 되는 충일과 행복의 시간이기도 하다. 방송작가로서 보낸 20여 년 동안 그에게 저녁이란 밥벌이용 글쓰기가 끝나고 시인으로 돌아오는 무렵이었다. 두 개의 자아가 엇갈리면서 환호와 탄식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저녁의 복합적인 심상은 그 시절 저녁을 맞이하던 그의 착잡한 심사를 비추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