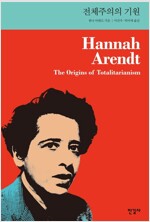
일전에 『전체주의의 기원』을 읽으면서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글로 남겨두지 않고 생각만 했던 것인지, 글을 썼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8장 <대륙의 제국주의: 범민족 운동>에는 '공통 기원'의 감상적인 표출인 민족주의(432쪽)을 통해 유럽의 여러 민족들이 '국민 공동체'를 구성해가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민족 공동체라는 이상을 통해 내부를 통일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렌트는 범민족 운동이 선민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 주장에서 출발한 점에 주목했다.(435쪽)
범민족 운동의 종족주의와 한 민족의 '신적인 기원'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한 개인의 가치가 우연히 독일인 또는 러시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좌우된다'라는 것이다.(439쪽) 국가는 단지 부차적인 것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민족'이라는 범민족 운동의 주장에 제일 반대편에 위치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국가도, 제도도 없는 민족이었고, 그들 역시 '신적인 기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체화했던 것이다.
인종주의자들의 유대인 증오는 신이 선택한 민족, 신의 섭리로 성공을 보장받은 민족이 자신들이 아니라 유대인일지도 모른다는 미신적 우려에서 나왔다. 거기에는 결국 모든 외양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에서 마지막 승자로 등장할 것이라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보증을 받았다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민족에 대한 의지박약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다. (『전체주의의 기원』, 451쪽)
여기에서 밑줄을 그어야 하는 지점은 ‘신의 섭리로 성공을 보장받은 민족이 자신들이 아니라 유대인일지도 모른다는 미신적 우려’다. 주체는 누구인가? 그러한 의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인종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믿었다. 신의 섭리로 성공을 보장받은 민족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민족이 유대인보다 우월하고,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심 불안했다. 신의 섭리로 성공을 보장받은 민족이 자신들이 아니라 혹시 유대인인 건 아닐까. 쉽사리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다.
놀라운 지점은 인종주의자들의 우려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자기 확신이다.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의 특별함을 확신하고, 신화를 통해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은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며, 신의 아들이고, 신의 아내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 자체로 신으로 여겨지고, 일본 역시 신들의 결혼으로 만들어진 나라이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나름 소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친가는 하늘에 속한 집안(아버지 환웅)이지만 외가는 땅에 속했다(엄마는 웅녀).
유대인 역시 자신들이 신에 의해 '선택 받은' 민족임을 강조한다. 여기는 유별난 지점이 아니다. 특이점은 유대인의 그 말을, 그들의 이웃이, 다른 민족들이 믿었다는 데 있다. 유대인들이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라 주장하는 유대인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된 사실/진리/미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주변 민족들의 증오심은 더더욱 강화되었을 거라고, 나는 추측한다.

이 책은 반유대주의가 어떻게 죽은 이들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효과로 살아 있는 동시대 유대인의 시민권까지 박탈하는가에 대한 래디컬한 문제 제기다. 책은 지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신랄하고 유려하다. 융합적 방식으로 공부한다면, 서양사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텍스트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죽은 유대인을 사랑한다』, 해설, 정희진, 353쪽)
정희진 선생님의 해설을 숙고하면서 반유대주의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려고 꺼낸 책을 다른 책들과 함께 쌓아두고, 큰아이에게 내게 주려고 했던 간식을 미리 달라 하니, 김치냉장고인게 너무 티나는데 꼭 거기에 책을 쌓아두고 찍어야겠냐고 묻는다.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느니. 국밥집에서 스피노자 읽어주는 것이 이 동네의 국룰이거늘, 김치냉장고 위의 아렌트는 사소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