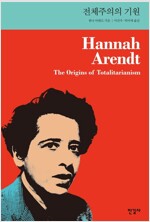
방학은 끝나가고 (아직도 방학이었던 사람^^ 오늘, 출근 날짜 확정됐습니다. 하하하!) 겨우내 놀기만 하고, 두꺼운 책 한 권도 끝낸 게 없어서 ‘읽고 있어요’ 중에 가장 두꺼운 책 꺼내왔다. 6장부터 읽으면 된단다. <인종주의 이전의 인종 사상>.
인종 사상의 기원은 18세기지만, 19세기에 모든 서구 국가에서 동시에 출현했다(320쪽). 제국주의 정치의 주된 이데올로기적 무기(323쪽)로써, 제국주의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설명’과 변명을 위해 고안한 장치(359쪽)이기도 하다.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주의와 관료주의의 상관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보어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어인들은 17세기 중반 인도로 항해하는 배에 신선한 야채와 고기를 공급해주기 위해 케이프에 머물렀던 네덜란드 정착민들의 후손이다. (371쪽)
극히 척박한 토양과 종족 단위로 조직화해 유목 사냥꾼으로 살고 있는 많은 수의 흑인 주민들 사이에서 보어인들은 쟁의 조종의 형태로 노예 제도를 유지시킨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보어인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과 같아서는 안 되는 어떤 것에 대한 공포’(372쪽)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이것이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사회의 근본이 되어주었다.

조셉 콘래드의 <암흑의 핵심>(이 책은 <암흑의 심장>이라고 번역함)> 속, 커츠씨의 독백이다.
“… 지구는 이 세상 것 같지 않았고 인간들은・・・・・・ 아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닌 존재가 아니었다. 그렇다. 가장 나쁜 것은 - 그들 역시 인간 존재일지 모른다는 의혹이었다. 그런 생각이 서서히 들었다. 그들은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껑충껑충 뛰었으며 빙빙 돌면서 무시무시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너를 전율시킨 것은 그들이 – 너희들처럼 - 인간이라는 생각, 네가 이 거칠고 격정적인 소란과 먼 친척뻘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암흑의 심장>, 370쪽).
고전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암흑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은 ‘문명이라는 이름의 야만, 혹은 제국주의에 대한 폭로’라거나 또는 ‘인간 내면에 대한 탐구’ 정도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다. 문학에서 모든 글이 ‘폭로’일 수 없고, ‘폭로’일 필요도 없지만, 많은 순간에 문학은 ‘폭로’이고, ‘고백’, 정확히는 ‘자기 고백’이다. 원주민들 사이에서 ‘왕’처럼, 정확히는 ‘신’처럼 살고 있는 커츠와 그를 떠받치는 원주민들에 대한 묘사가 ‘메타포’로만 이해될 수 있는가.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생각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이 책을 26년 전에 읽었기 때문인데, 계산해 보니 그때 나는 일곱 살이었던 터라 그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원주민들에게 복종의 대상이자 ‘신’의 자리에 있었던 보어인들을 아렌트는 이렇게 평가한다.
서구인이 스스로 창조하고 제조한 세계에서 살면서 느끼는 자긍심에서 전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최초의 유럽인 집단이 보어인이었다. (374쪽)
원주민들을 ‘원료’로 취급하면서도 그들에게 의존해 살았던 보어인들은 ‘타인의 노동에 대한 절대적 의존’과 ‘노동과 생산성에 대한 총체적인 경멸’ (374쪽) 속에 살았다. 그들은 새로운 문명과 사회로 발전하지 못했고, 겨우 살아가기에 충분한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인종주의가 제국주의의 도구로 확정되기 이전에 백인과 흑인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인종주의는 ‘낯선 어떤 것에 대한 끔찍한 경험’(376쪽)을 바탕으로 한다. 생김새, 체취, 의복, 식문화를 비롯해 언어까지. 흑인들은 완강하게 인간적 면모를 나타냈기에 백인들은 자신들을 인간 이상의 존재인 ‘신’으로써 스스로를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376쪽)는 것이다. 아렌트의 결론은 이러하다.
인종주의는 … 노동에 대한 경멸, 지역적 제한에 대한 증오, 일반적인 뿌리 상실과 신이 자신들을 선택했음을 믿는 행동주의적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380쪽)
그랬던 인종주의가 어떻게 한 국가의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 발전했는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일단 한 템포 쉬고. 딸기 좀 먹고. 청소기 돌리고. 저녁 멕이고.
그다음에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