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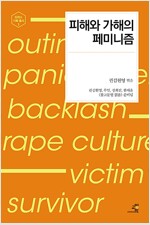
리베카 솔닛의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는 여성 혐오, 미국 대통령 선거, 인종 차별, 기후 변화, 젠트리피케이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흥분하지 않으면서 차분히 그리고 특유의 조소를 더해가며 현 상황을 설명하고 전망을 말하는 리베카 솔닛의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의외로 흥분에 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태도, 이런 시선, 이런 글쓰기는 언제나 나를 들뜨게 한다.
‘성가대에게 설교하기’를 우리나라 정치에서 자주 쓰이는 ‘집토끼 vs 산토끼’ 비유를 들어 표현하자면 ‘집토끼 먹이주기’ 정도로 바꿀 수 있겠다. 이미 의견이 일치하는 청중에게 의견 내기.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에게 호소하기. 리베카는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중도파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애하려다가 그만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배신해버린 실수를 ‘성가대가 아닌 이교도에게 설교하기’로 설명했다. ‘성가대에게 설교하기’의 가장 좋은 예로는 1963년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연설을 꼽았다.
그 연설은 성가대에게 하는 설교의 가장 좋은 사례였다. 킹은 비방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지자들을 북돋기 위해서 연설했다. 그는 온건주의와 점진주의를 일축했다. 청중에게 그들의 불만은 타당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고, 그들이 극적인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인 동지들도 필요하겠지만, 흑인 활동가들이 굳이 그들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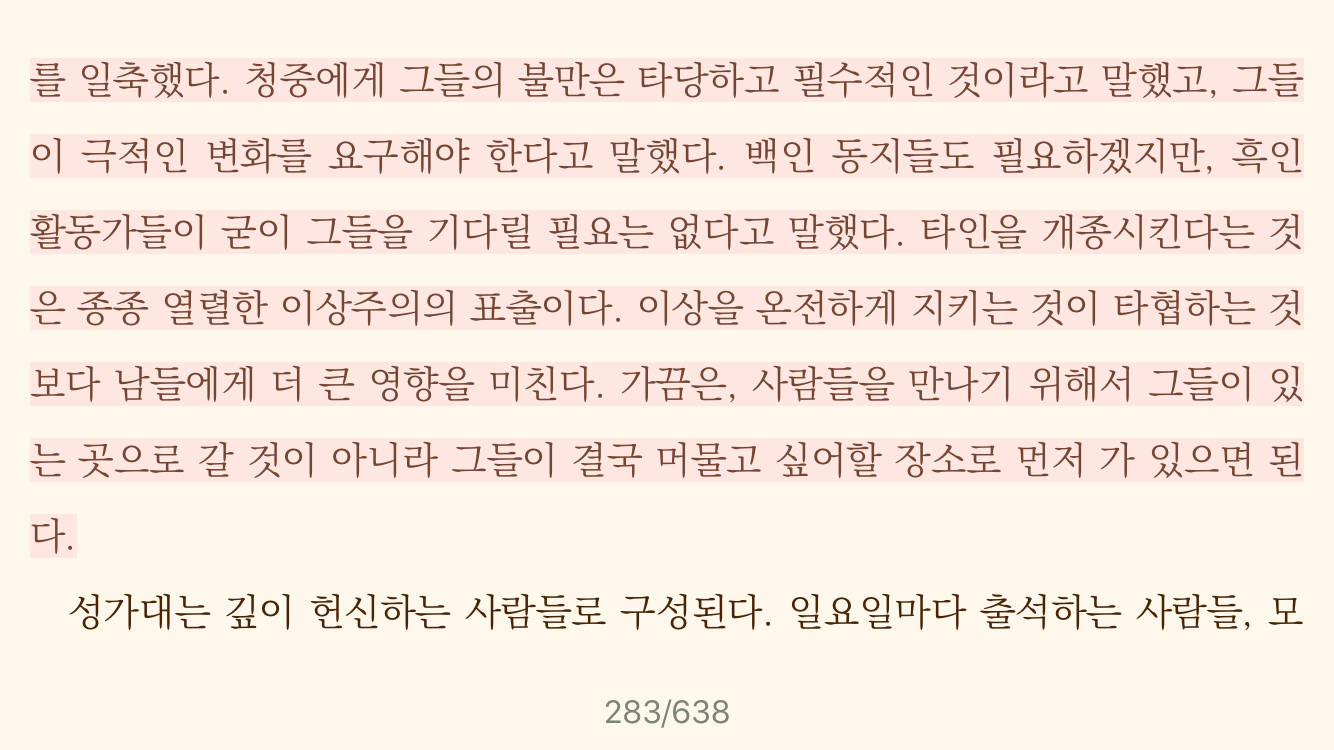
페미니즘 책을 읽고 감상을 읽고 쓰고 알라딘서재 이웃님들의 글을 읽고 같이 분노하면서 ‘이런 책들을 읽어야 할 사람들은 읽지 않고, 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읽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페미니즘 책을 찾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성들은 불합리한 대우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문화, 과학, 통념의 이름으로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무자비한 공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아니 그러한 공격들을 지금도 견뎌내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이렇듯 치밀하게 감추어져 있고, ‘안정’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양보’가 강요되는데도 그에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왜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절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가. 읽어야 하는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말에서 답을 찾는다. “백인 동지들도 필요하겠지만, 흑인 활동가들이 굳이 그들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나는 페미니즘 책을 10권 이상 읽은 후에야 ‘성’이 ‘계급’으로서 작동한다는 말을 이해했다. 현실을 직시하는 건 쉽지 않다. 핏줄처럼, 근육처럼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생각들과 결별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남성은 제1신분으로서 출생시부터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건, 그래, 남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일 테다. 인정한다.
‘나도 메갈리안이다’라고 쓰는 진중권 같은 남자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겉으로는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의식화된 여성 혹은 『82년생 김지영』을 읽는 여성을 ‘꼴페미’, ‘메갈년’, ‘페미니즘이라는 정신병에 걸린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자신의 이런 생각을 용기(?) 내어 말하고 그걸 또 친절하게 노래로 만들어서는 정성껏 부르며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초점은 그런 사람들, 그런 남자들이 아니다.
현재의 불균형, 즉 ‘지나치게’ 각성한 상태의 여성과 술에 덜 깬 혹은 자신이 술에 취한지도 모르는 상태의 남성(『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정희진, 203쪽) 중에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편이 낫다는 뜻이다.
성가대에게 설교하기.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