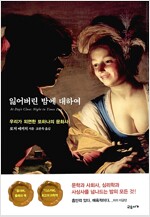
예전부터 읽고 싶은 책이었다. 로저 에커치의 '잃어버린 밤에 대하여'는...
원래는 돌베개에서 '밤의 문화사'란 제목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 그 제목을 보았을 때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는 일로, 공부로 허다하게 밤일 지새웠던 시기였다.
밤에 많이 깨어있다 보니 밤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 그런 밤의 문화사를,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알려준다는데 어떻게 노크 한 번 안 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그런 마음조차 어느덧 잊고 이 책의 존재를 다시 떠올리게 된 건 우연히 이렇게 다른 제목, 다른 모습으로 출간된 걸 보고나서였다.
출판사도 바뀌어 있었다. 바뀐 제목은 '잃어버린 밤에 대하여'였는데, 원래 제목은 'AT DAY'S CLOSE'라서 낮이 저물 때라는 뜻이니 이걸 번역한 건 아니다.
아무래도 '밤의 문화사'가 보다 낭만적인 느낌의 제목인 '잃어버린 밤에 대하여'로 바뀐 것은 행여나 '밤문화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본다.(물론 농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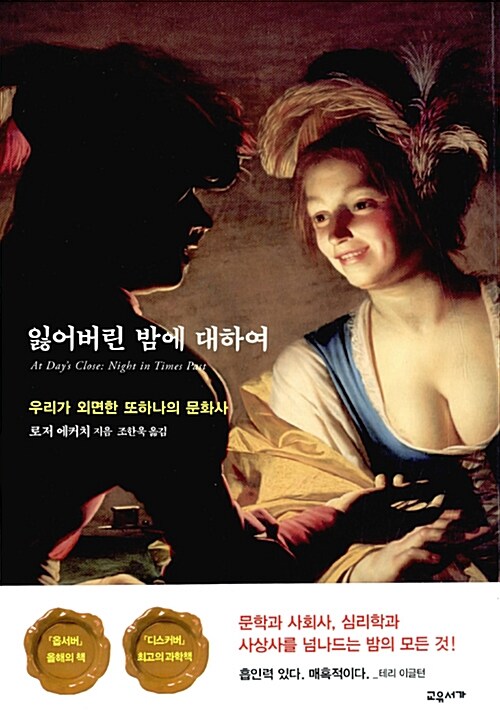
저자는 '인간 역사의 절반은 전반적으로 무시되어왔다'고 말한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절반은 '밤'을 뜻한다.
저자의 말 그대로 밤은 역사의 시선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미시사 분야가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에도 '밤'은 그다지 주목 받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류 역사에서 허다한 밤들은 오직 낮 동안의 계속된 노동으로 고단한 몸을 쉬게 만드는 수면으로 꽉 차 있었을테니까 말이다. 그렇게 많은 시대 동안 권력도, 돈도 없는 보통의 서민이나 노예들에게 밤이란 낮의 보충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런 내 생각이야말로 무지의 장막 속에 있다는 걸 이 책은 말해주고 있다. 그런 밤들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충분히 귀기울여 들을만한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향유되었던 것이다. 그걸 저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비롯하여 세계 각지로 직접 답사하면서 20년에 걸쳐 모은 편지나 일기, 법정기록, 속담, 시, 정기간행물 등 온갖 기록물들을 바탕으로 증명하고 설명한다.
한낮 못지 않게 밤 또한 문화의 강을 유유히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나 저자는 수면 형태의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잠의 역사라 할 만 한데, 우리가 자는 형태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인위적으로 조정된 것이라니 흥미롭다. 어쨌든 오래도록 읽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책을 이번 기회엔 꼭 읽어볼 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