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퀴어 ㅣ 펭귄클래식 에디션 레드
윌리엄 S. 버로스 지음, 조동섭 옮김 / 펭귄클래식코리아 / 2020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잭 케루악과 더불어 미국 비트 세대의 대표적인 작가 윌리엄 S 버로스. 마약 중독자로서의 자기 고백이 물씬 담긴 소설 '퀴어'는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진 작품이다. 일단 이 소설은 '정키'의 후속작이다. 1953년에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정키'는 버로스의 데뷔작이자 작가로서의 그의 명성을 높여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속편 '퀴어'는 묘하게도 한참 나중에 발표되었다. 그것도 무려 32년이 지난 1985년에. 버로스가 그제서야 '퀴어'를 썼던 건 아니었다. 원래는 '정키' 바로 뒤에 집필했으나 스스로 도저히 세상에 발표할 수가 없어 원고를 서랍에 고이 묵혀두고만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있다. 펭귄클래식 코리아 판 '퀴어' 앞부분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버로스의 육성이 담겨 있는데. 거기서 그는 원고를 쓰긴 했지만 다시 읽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고 하고 있다. 과거 자신의 고통과 절망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하자면 이러하다.
'퀴어'의 원고를 흝자, 읽지 못하겠다는 생각만 든다. 나의 과거은 운이 좋은 사람만이 탈출할 수 있는 독이 든 강이었다. 기록된 사건들이 이미 수년 전의 것이라도, 보자마자 위협을 느끼게 되는 독이 든 강. '퀴어'에 대해 쓰기는 커녕 읽기조차 힘들다는 사실을 뼈져리게 느낀다. 말 한 마디 몸짓 하나에 진저리가 난다. (...) 이 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실은 애써 피한, 한 사건이 동기가 되어 만들어졌다. 1951년 9월, 내 아내 조앤을 총으로 쏘아 죽게 만든 사고다.(p. 20)

예전에 나온 '퀴어'의 리커버 판. 마치 프랑스 국기를 연상시키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마음에 든다.
소설의 주인공은 리. 말할 것도 없이 작가의 분신이다. 그는 '정키'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작품에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는 거기에 대해 작가가 직접 한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내 첫 소설 '정키'에서 주인공 리는 조화롭고 자족적인 인물,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퀴어'에서 리는 분열되고, 절박하게 만남을 바라고, 자신과 자신의 목적에 전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인물이다.(p. 14)
왜 이렇게 달라져 버렸는가? 한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마약이다. '정키'의 주인공은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다. '퀴어'의 주인공은 마약을 끊었다. 바로 이 차이가 리에게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온 동력이다. 그렇다고 이 작품이 마약의 유용성 따위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앞서도 말했듯, '퀴어'는 읽는 것마저 커다란 아픔을 느낄 정도로 작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자신의 잘못으로 아내가 죽은 사고에서 태어난 작품이다. 사는 순간 모두가 온통 후회와 자책 밖에 없도록 만드는 비극을 겪고나면 삶을 보는 눈도 제법 달라지곤 한다. 작가는 그 비극을 관통하며 마약에 기댔던 삶의 시간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었더라도 모두 거짓 환락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뼈져리게 느낀다. '정키'에서 눈 앞에 보여진 길은 착시의 산물이었고 자신이 세상과 조화롭게 영유하고 있다는 것 또한 오산의 결과일 뿐이었다. '퀴어'는 그런 환상이 모조리 사라진 뒤에 잔류한 것을 아주 진솔하게 기록한 소설이다. 썰물이 남겨놓고간 해변의 검은 해조류 사체와 같은 것을.
'퀴어'에서 리는 청년 앨러틴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어서라도. 그러나 필요할 때만 리에게 곁을 내어줄 뿐, 앨리틴은 리에게 내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다. 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 시티의 온갖 곳을 그를 찾아 다니지만 어렵게 찾아낸다 해도 앨러틴은 쌀쌀한 반응을 보일 뿐이다. 자신에게 무관심한 앨러틴의 관심을 받기 위해 리는 이런 말 저런 말 마구 쏟아내지만 종국엔 앨러틴은 이미 가 버리고 계속 혼자 떠들고 있다는 자각 뿐이다. 나중엔 어떻게든 앨러틴을 꼬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는 약, '야헤'를 찾아 에콰도르로 간다. 그러나 거기서도 야헤는 찾지 못하고 세상의 환대는 커녕 박대만 받을 뿐이다.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한 그는 소설 내내 내리막길이고 외롭다.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아서 구차하다. 눈 앞에 놓인 길은 도통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미로 뿐이고 그런 길을 걸어갈만한 의지조차 한 조각도 그에겐 남아있지 않다. 진실과 황당한 소문을 자신의 머리로 더이상 구별할 수 없게 된 리는 눈 앞에 보이는 앨러틴이라는 현실적인 존재와 스스로 비루하다고 여겨질 때마다 소환하는 과거의 기억에 기대어 버텨 보지만 마약을 복용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건 다만 덧없이 흘러갈 뿐이고 남는 건 여전히 한없이 외롭고 왜소한 자신에 대한 쓰디 쓴 자각 뿐이다. 버로스는 이걸 투명하게 담는다. 물론 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자신의 내면 풍경을 말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나 보다. '퀴어'를 읽지 않고선 버로스를 참되게 이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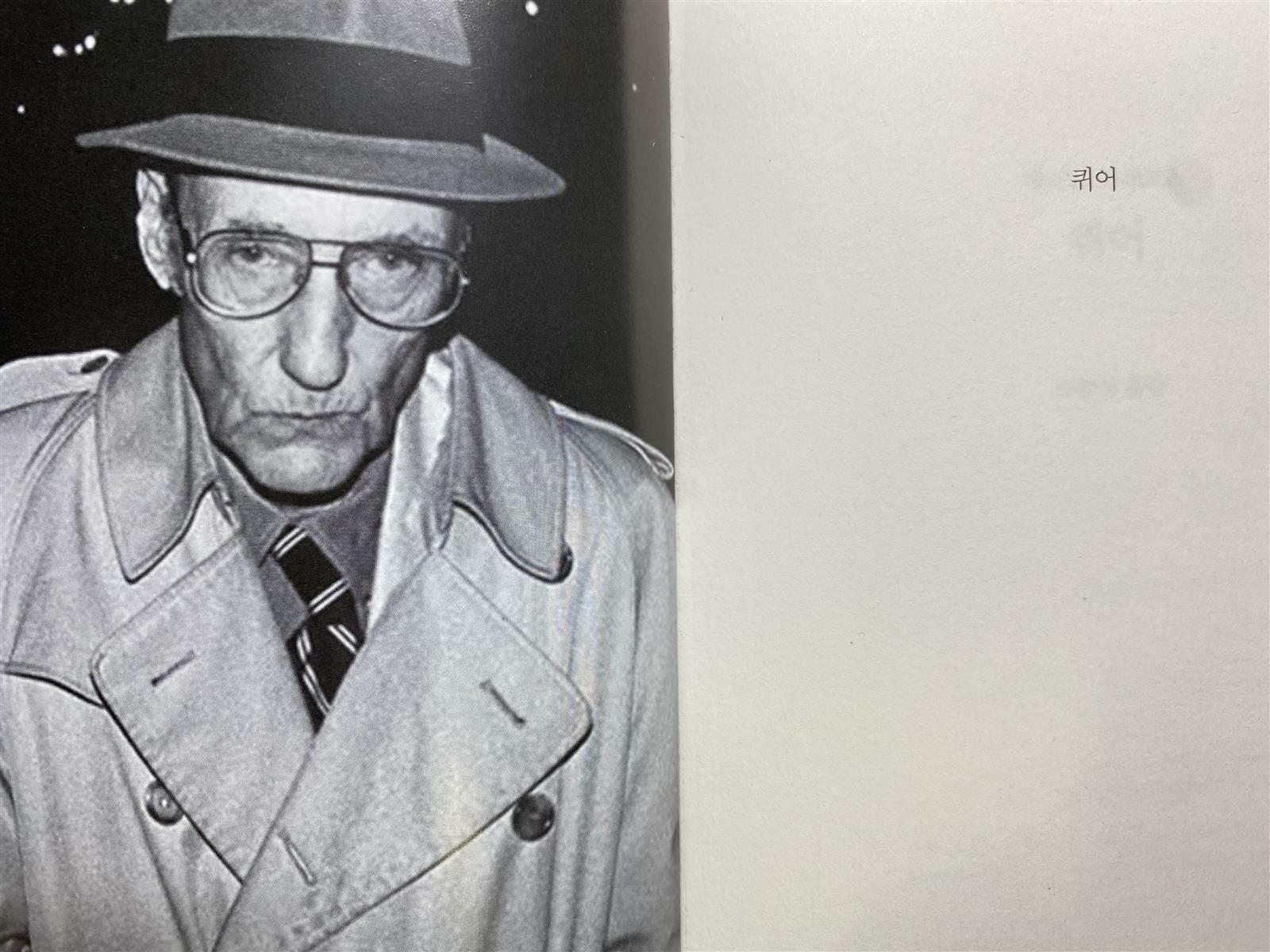
겉표지를 넘기면 바로 나오는 윌리엄 S 버로스의 초상.
밝음의 저편엔 어둠이 있다. 둘은 이 세상에 '정키'와 '퀴어'처럼 같이 공존한다. 그러므로 세상이든, 삶이든 제대로 헤아리려면 이 둘 모두를 다 횡단해야 한다. 인생의 밝음만을 추구하는 이에게 버로스의 '퀴어'는 선뜻 발을 디밀기 어려운 세계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버로스의 작품들은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우리네 삶이 주머니 속에 숨겨 놓은 비애를 후미진 골목길에 봄이 와도 녹지 않고 남아 있는 길바닥의 눈처럼 눅진하게 그려내는 이 소설은 분명 독특한 경험이 되어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