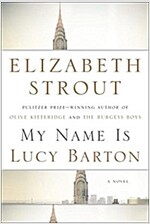200쪽의 얇은 책인데다 여러 챕터들로 나눠져 있어서 한 편의 소설을 읽는다기보다 여러 장의 쪽지, 스케치, 기억의 단편들을 화자와 함께 더듬는 느낌이다. 병원에서 9주 동안 있던 경험으로 시작해서 화자의 어린시절로 돌아가는데, 하나씩 꺼내 "생각하고" "느낀" 기억들은 아프고 슬프다.
Lucy는 글을 적어 내려가면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자신이 만나서 '관계'를 만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인생,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미국 중서부 옥수수밭 돼지농장 옆에서 자라던 소녀가 뉴욕에 가서 자리잡는 인생성공담이 아니라 소녀가 만난 사람들, 책 속에서 만난 인물들, 성장기에 만난 사람들과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모여서 책을 엮어나가고 있다. 그 결과가 이 책이고, 자신의 인생이고, 자신의 이름 Lucy Barton을 또박또박 적는 일이다. 작년에 읽은 아룬다티 로이의 책이 전통, 여러 세대의 업보와 역사가 겹겹이 무겁게 쌓여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발한 이야기였다면,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책은 여러 인물들 각자의 사연이 주인공과 만나 생기는 인연과 에피소드들이 하나하나 작은 구슬처럼 엮여 반짝거린다. 얇은 책이라 금방 읽었지만 다시 읽어야만 할 책이다. 이제 나는 첫 장부터 화자를 Lucy 라고 불러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