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읽은 인문교양서는 여러모로 감동적이었다.
일단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뇌과학, 심리학, 철학을 혼용하며 푼다. 오늘날의 인문학이란 것은 당연히, 당대 과학의 성과들을 반영해야만 한다. 특히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질문은 뇌과학이나 심리학의 도움없이 단지 '철학사'적인 연구로만 푼다면 이는 오늘날의 질문에 대한 '철학적' 대답이 아니라 철학사적 정리일 뿐이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 당대의 과학들과 대화하면서 글을 썼듯이 (라이프니츠, 칸트, 다산 등), 오늘날의 인문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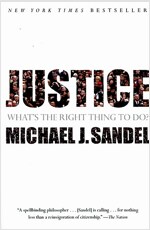
그 다음에는 그렇게도 한국에서 유명세를 떨쳤던 센달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아직 번역본을 보지는 못했지만, 원작이 쉽게 쓰여진 만큼 번역도 괜찮을 것이라 믿어본다. 이것도 '정의란 무엇인가'를 정의에 대한 철학사적 주석이 아니라, 지금-여기(미국)에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예를 들면 카타리나 폭풍의 이재민들을 상대로 엄청난 액수로 바가지를 씌우는 판매업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테러리스트를 고문해서 설치한 폭탄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무인도에 표류했을 때 3명이 살기 위해서 1명을 살해해서 먹은 사건(실제로 최근에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한다.)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등등 '정의'라는 것이 단지 추상적으로 철학사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물으면서 칸트, 벤담, 밀, 롤즈 등의 논의를 자연스럽게 끌어온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철학이 아닌가.
이 두책이, 오늘날 진정한 의미의 인문교양서라고 생각한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플라톤, 칸트, 마하 등의 생각을 오늘날의 인지심리학, 생물학, 뇌과학 등에 융합하여 사유하는 것. 또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지금-여기의 논란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물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정의에 대한 철학적 사유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한국의 학자들도, 이 '지금-여기'를 통해 이런 물음을 충분히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쌍용차 사태, 삼성 백혈병, 원전사태에 대한 인문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