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로 보는 3분 철학』을 재미있게 읽었다. <밀리의 서재>로 읽어서 들고 다니는 맛은 좀 덜했지만(아이패드는 무겁기만 하고 폼은 덜 남), 짬짬히 읽어가기에도 좋고 인덱스해두고 다시 찾아보기에도 편리해서 앞으로도 자주 이용하겠다 싶다.
기라성 같은, 이름은 알지만 정작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여러 철학자들 중에서 2권의 주인공은 스피노자로 꼽았다. 동서양 철학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비교하겠다 하는 거 자체가 우스운 일이기는 한데, 그냥 쉬운 말로 풀자면, 동양보다는 서양이 '인간'에 대한 애정이 깊어 보인다.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 절대적인 차이를 두지 않으며 인간을 위시한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를 중생이라 보는 불교의 전통이 깊은 동양 문화권에 비해 기독교, 헬레니즘이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서양 문화권의 경우 이 모든 사물, 사건, 환경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
특히 서양 문화권의 신의 개념이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에 방점을 찍을 수 밖에 없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 혹은 신들이란 인간이 갖지 못한 초인적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너무나 '인간적'인데, 특히 사랑과 정념과 질투와 섹스가 그러하다. 기독교의 신 역시 성경 전체를 통해 조망되는 신의 '모습'은 다분히 '인격성'이 강조되는 모습이기는 하다. 그런 전통하에서 등장한 스피노자.
짜잔, '신은 자연!', '자연은 신!' 이 주장이 얼마나 파격적이었을까. 충분히 상상 가능하다.

"스피노자가 생각한 신은 세상과 따로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동일한,
그 자체로 세상이 되는 존재였어요.
자연은 스스로 창조하고 창조되는 하나의 큰 신이란 거죠."
3권의 시작은 역시 니체. 인간이 삶을 지탱하기 위한 모든 가치가 허상이라는 주장 아래, 도덕, 진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모두 다 사라졌다고 외치는... 신은 죽었다!의 그 니체. 의지할 것이 모두 사라진 세상에 그가 말하는 '초인'의 모습, 초인의 생활. 힘과 욕망을 마음껏 뽐내면서도 절제미가 조화된 인간.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라 말하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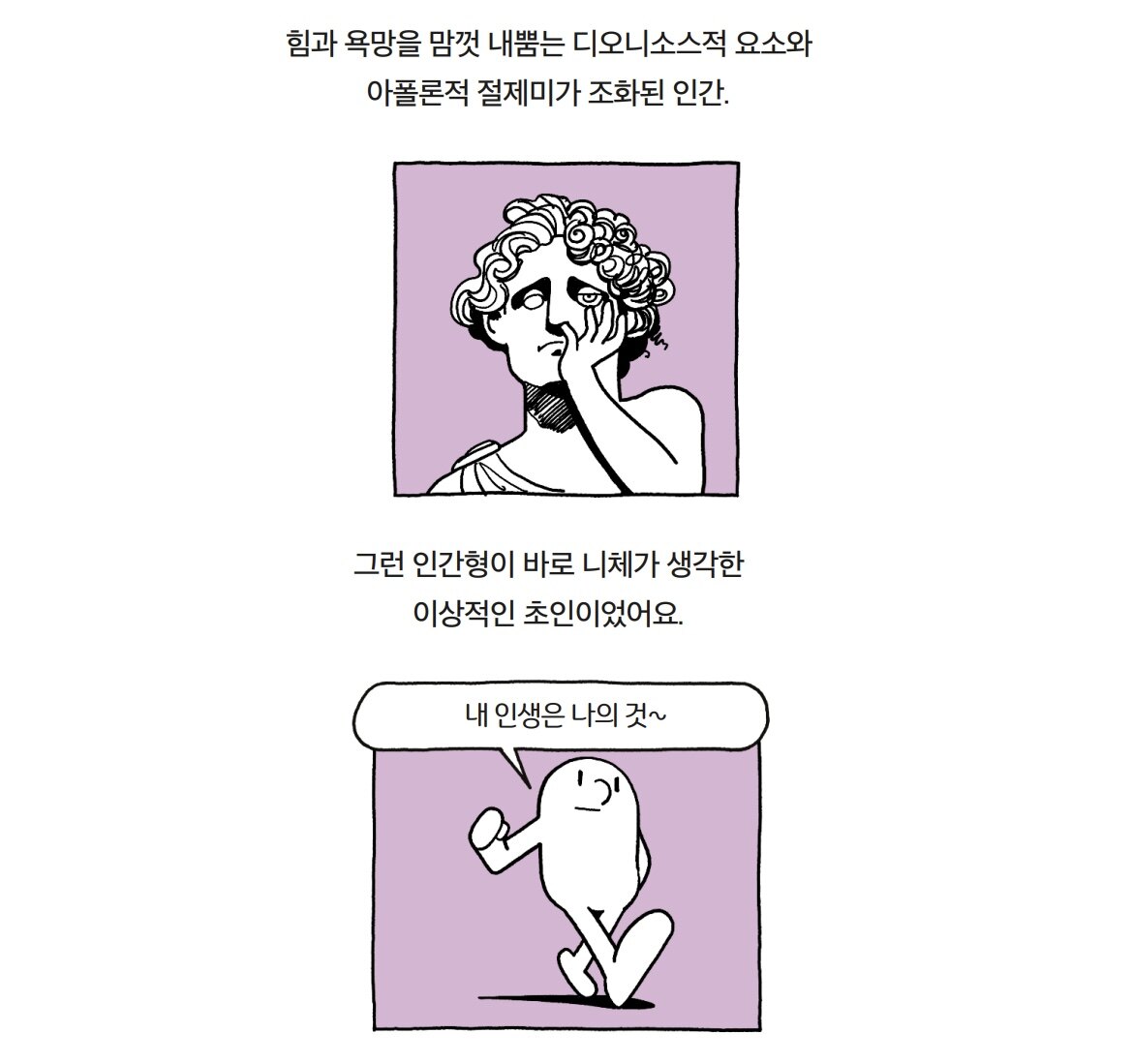
소쇠르 부분에 '구조주의'가 포함되어 있어 좀 흥미롭기는 한데, 나한테는 좀 어려웠다. 쟝님의 이 페이퍼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다. 주소는 바로 여기(https://blog.aladin.co.kr/jyang0202/15874192).
하이데거쪽은 아렌트 생각 나서 읽기 싫은데 읽기는 읽었고. 보부아르 생각하면서 사르트르 읽는데, 이런 주장들은 니체와도 닿아있구나 싶다.

최근에 친구가 읽는 책이 사르트르의 바로 이 책. 쪽수에서부터 존재에 대한 커다란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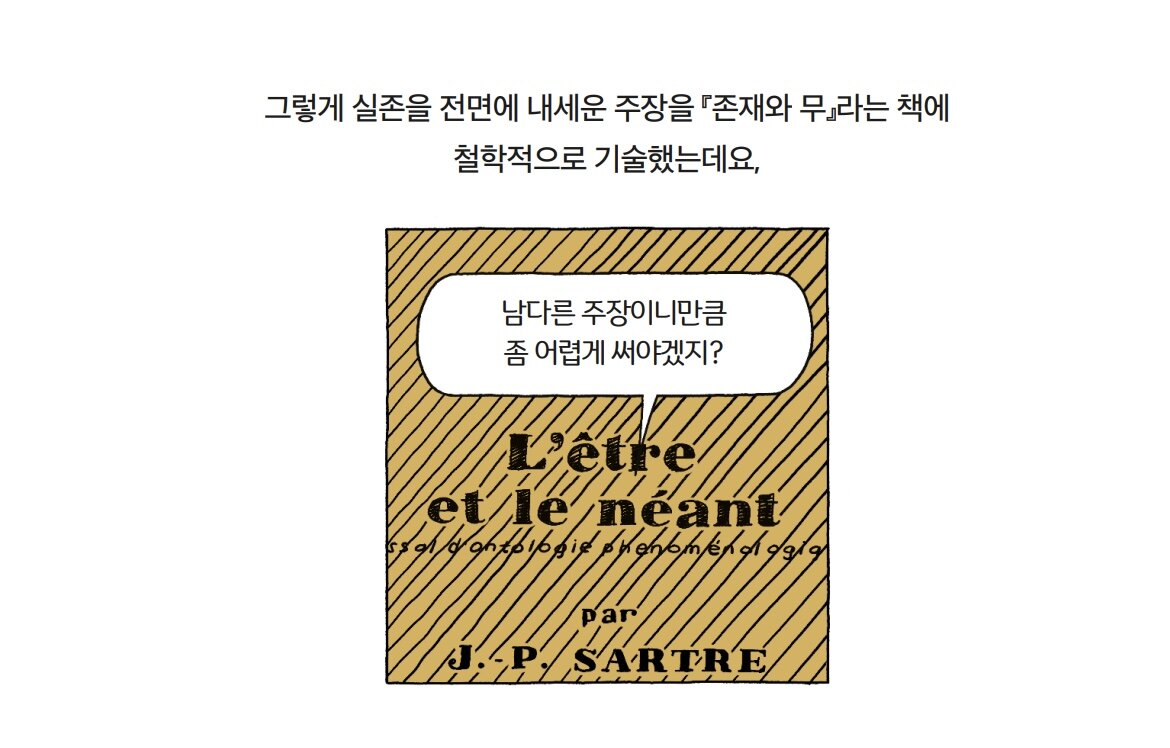

사진 좀 쓰겠다 했더니 지금 다른 책 읽고 있다는 친구. 부지런한 친구의 부러운 현장.

마지막은 역시나 라캉이다. 인간은 결코 돌이킬 수도 채울 수도 없는 상실과 결핍의 상태로 살아가야한다는 말이 새롭게 들린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 어느 것이 더 무겁다, 가볍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하고 엉클어진 자신만의 사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