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점심 급식을 먹기로 했다. 작년에는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높은(?) 분들이랑 식사하는 거 싫다고 하셔서 도시락을 먹었다. 올해도 1학기 때는 그렇게 대충 ‘홈메이드' 아닌 ‘냉동밥’을 대충 데워서 도시락을 준비해 왔는데, 아침에 준비하는 게 귀찮아서 2학기에는 급식을 신청했다.
‘혼밥’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언제 어디서든 ‘혼밥’ 가능했던 나. 하지만 여기는 직장이고, 첫날이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으로 향했다. 배식해 주시는 분이 식탁 닦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라, 애들이랑 앉을 자리가 부족하다, 말씀하셔서 "괜찮아요. 저는 혼자예요."라고 답하면서 식판을 내밀었다. 많이도 주셨어라. 크게 반절을 올리고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날은 저녁을 안 먹었다.
둘째 날, 또 식판을 내밀었더니 이번에는 다른 분이 고개를 앞으로 내미시고 말씀하신다. "선생님, 교과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에요." "선생님, 저기 반대편에 직원 식당 있어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먹을게요." 어리버리해서 어디서 밥 먹는지도 모르는데 살뜰히 챙겨주시는 분에게 반절. 콩나물을 담뿍 담아주시는 분에게 반절. 고기랑 무를 넉넉히 담아 소고기뭇국을 담아주시는 분에게 반절. 내게 맛난 밥을 차려주시는 고마운 분들에게 반절.
『오, 윌리엄!』에서 윌리엄과 그의 세 번째 아내 에스텔은 윌리엄의 두 딸을 집에 초대한다. 윌리엄의 두 딸은 에스텔이 얼마나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지 말한다. 루시가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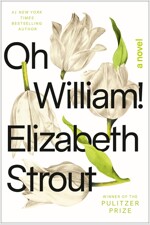
두 딸 모두 에스텔이 요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듣기만 해도 지겨웠다. 나는 요리를 좋아해 본 적이 결코 없었다. (『오, 윌리엄!』, 85쪽)
이 표현을 보고 통쾌하다고 말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다. 나는 그랬다. 너무 통쾌했다. 시원했다. 그랬던 나, 요리하는 게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었던 나. 그런 나에 대해 이해받는 느낌이었다. 비슷한 표현은 헬렌 니어링의 책에 나온다.

요리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요리가 힘들고 지루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좋다. 가서 요리의 즐거움을 만끽하면 된다. 하지만 식사 준비가 고역인 사람이라면 그 지겨운 일을 그만두거나 노동량을 줄이자. 그러면서도 잘 먹을 수 있고 자기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 31쪽)
맛있는 음식을 싫어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잘 차려진 밥상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다. 맛있는 음식은, 잘 차려진 밥상은 언제나 환영이다. 그냥 환영 아니고 대환영. 요는 그 밥상을 차려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여성에게 예상되는 혹은 강요되는 성역할 중에 가장 ‘난감한’ 역할이 나는 ‘식사 준비’라고 생각한다. 반복되는 일, 끝나지 않는 일, 잘해야 본전, 못 하면(그런 경우가 80%) 비난이 쏟아지는 일. 아이들을 낳고 진짜(?) 전업주부가 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다. 모두 나처럼 이 일을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 먹는 일, 음식을 준비하는 일, 장 보는 일,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나보다 훨씬 어린대도 무슨 음식이든 눈 깜짝할 사이에 척척 내놓는 능력자들이 내 주위에 많다는 것도.
지난여름에는 군산, 전주, 부여, 공주 등을 돌아보는 국내 여행을 다녀왔다. 꼼꼼한 동선과 가게 될 식당 & 커피숍 서치는 그렇다 치고. 가게 될 식당과 커피숍에서 어떤 메뉴를 먹을지, 어떤 디저트를 먹을지 미리 정하자 주창하는 두 명의 J를 앞에 두고. 천생 P인 아롱이와 나는, 한 의자에 굳이 둘이 구겨 앉아서는, 서로에게만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는 다 괜찮다고,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진짜 그렇다고. 쟤네 둘은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둘은 이런 사람들인 것이다.
식당에서 돈 내고 밥 먹는 것처럼, 점심 밥값도 내가 낸다. 모든 여성을 '어머니'로 보는 건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급식실에서 밥을 해주시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기혼 여성이다. 아이가 있는 곳에 가까이 있고 싶어서, 오전 시간만 일하고 오후에는 내 아이를 돌보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었다. 그분들의 밥 짓는 마음을 나는 어렴픗이 안다. 내가 엄마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럭저럭 괜찮은 밥을 지을 줄 아는 그런 엄마여서가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밥 짓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역할이라 정해졌던 특정한 노동의 반복 수행. 나는 그 반복 수행를 힘겹게, 너무 힘들게 이어갔던 사람이고, 이제는 그 일을 국가와 학교에 외주 준 사람이다. 그분들이 내 밥을 해주신다. 하루의 식사 중 영양학적으로 가장 균형 잡히고 건강하고 맛있는 밥을, 내게 내어 주신다. 반절을 안 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의 존경과 감사를 담은 "감사합니다!"와 반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추석 때 숱한 싸움의 시작은 '음식 준비'라 한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한 상에 둘러앉아 맛난 거 먹는 건 참 신나고 행복한 일이기는 한데, 그 일이 여성만의 일이라 '상상'될 때, 먹고 즐기는 그 행복한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참기 힘든 고역이 될 것이다.
귀한 음식을 내어놓는 손길에 대해서는 반절을, 아니 봉투를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 식구들 편하게 하자고 외식을 하자 하면 그것 역시 다른 분의 손을 빌리는 일이라 고맙고도 죄송하다.
답은 하나다. 간단히, 조금만 먹을 것. 그게 내가 내린 결론이다. 어머니는 각종 나물을 준비 완료하셨고, 호박전, 고추전, 표고 버섯전을 마친 동서는 오후에 생선전을 만들어 보겠다 하더라. 나만 저런 결론이어서 어쩔까 싶다. 다들 음식 만들기에 한참인 이 때 또 장 보러 갈 수도 없다. 닭강정과 찹쌀도너츠는 어제 다 먹었다. 손재주 없는 큰며느리는 걱정이 크다고 한다.
반절을 올릴게요. 반절을 백 번. 백 번,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