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성
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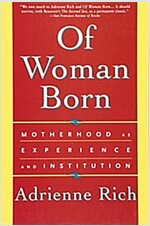

<장면 1>
아롱이가 반바지를 찾는다. 엄마, 서랍에 반바지가 없어요. 응, 건조기 안에 있나 보다. 내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꺼내 주려 일어선다. 가져다주면서 말한다. 근데, 아롱아. 이거 봐봐, 앞으로 명심해.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책을 들고 일어서면서 아롱이가 말한다. 엄마, 이거 그거네요. ‘애초에 어머니는 없었다’.
<장면 2>
친구가 그랬다. 여름에는 실론티를 쌓아놓고 마셔야 한다고. 그래서 나도 샀다. 마트에 갔을 때 6개들이 묶음을. 얼음을 너무 많이 넣어서 색이 좀 흐리게 나왔다. 주인공은 책이니까, 하면서 한 컷 찍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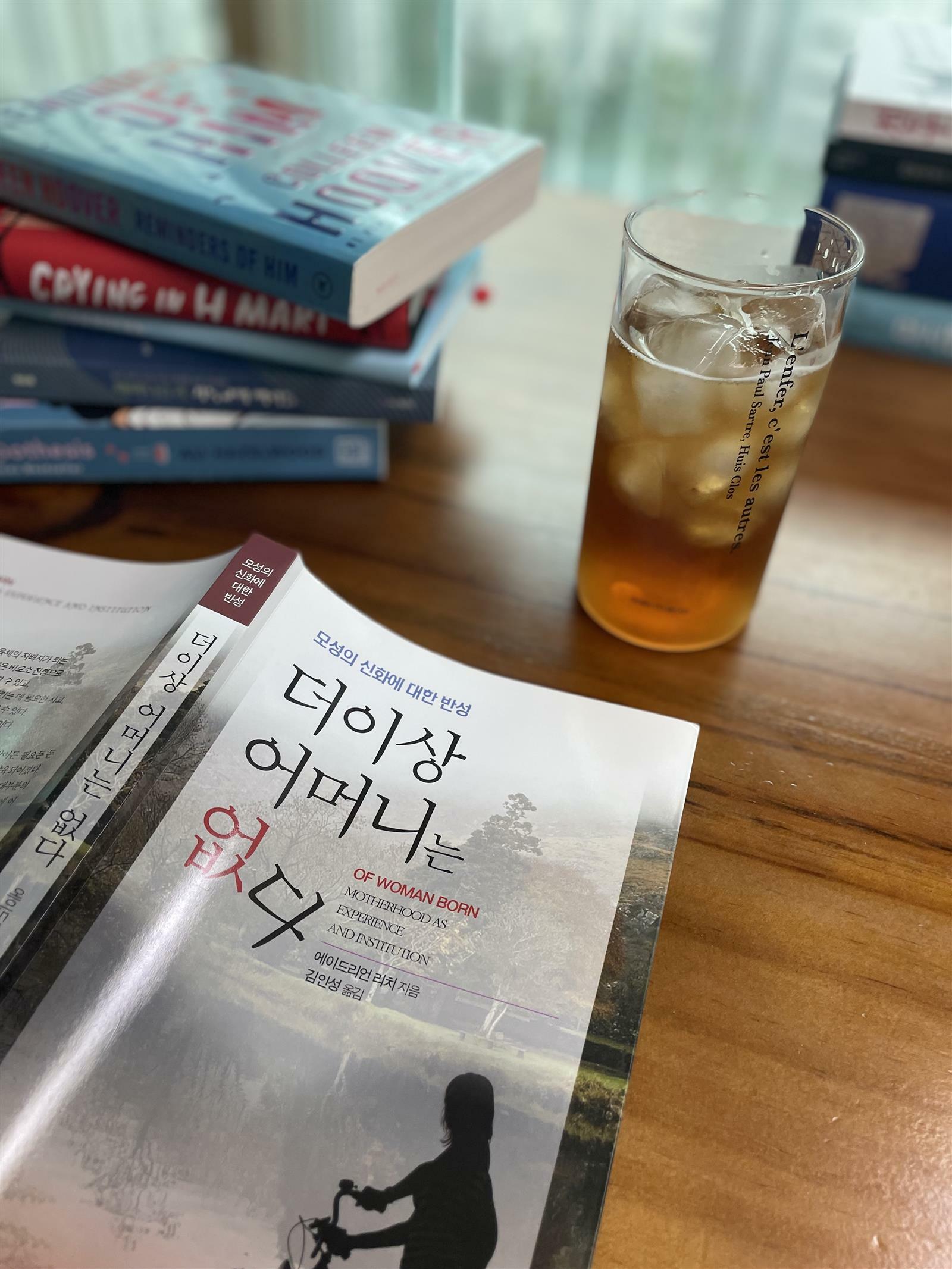
<장면 3>
주말에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탄탄면을 먹으러 갔다. 역시 손에 들고 있던 책과 사진 한 장을 찍는다. <작품 제목 :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그래서 외식이다.>

몇 월이던가. 아무튼 연초에 필리스 체슬러의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페미니스트』를 상반기의 책으로 고르자 알라딘 친구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며 하하 웃었다. 7월의 둘째 주, 나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 책을 하반기의 책으로 꼽는다. 아직 신에게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 남아있습니다만, 그 어느 누구도 에이드리언 리치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옵니다.
이 책의 한 문장을 가지고 글 한 편을 쓸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힘을 가진 책이다.
여성 수장의 위대한 어머니는 원래 어둠과 빛, 바다의 심연과 하늘의 지고함으로 의인화되었다. 바로 가부장적 우주 생성론이 발달하면서부터 비로소 여성은 순전한 ‘흙’의 존재로 한정되었고 어둠, 무의식, 잠으로 표현되었다. (124쪽)
레이첼 레비에 의하면 가부장제 이전의 의식은 처음에는 여성적이라고 느껴지는 본질적인 단일 통일체로 시작하여 계속 발전하면서 여성적 존재가 변천의 유동성을 주재한다고 생각했다. “… 신석기 시대 유물에는 남성을 신성시하는 어떤 숭배도 발견되지 않는다. … 여성의 힘이 그 당시 조각의 가장 큰 주제였다. “(131쪽)

『가부장제의 창조』에서는 여신의 몰락과 일신교의 확립 과정이 자세하게 다루어진다. 현재 남겨진 기록의 대부분이 이 시대의 것이다. 에이드리언 리치는 어머니 여신의 평가 절하와 그와 동시에 일어났던 인간 여성의 권위의 축소를 추적한다. 어머니 여신이 남신의 아내가 된 순간, 이제 아이는 그녀의 아이가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그의’ 자식이다.
여성은 항상 기다리고 있다고 여겨진다. 질문해 주기를 기다리고, 월경이 찾아올까봐 기다리고 혹은 찾아오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며 월경을 기다리고, 남자들이 전쟁이나 일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새로운 출산을, 폐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41쪽)
이 문단을 읽으면 자연스레 아니 에르노의 『얼어붙은 여자』가 생각난다.

그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길거리의 사람들을 밀치면서 안시를 돌아다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벤치에 앉아서, 오후가 흘러가기를, 아이가 어서 자라기를, 기다려본 적도 절대 없었다. 그는 일이 끝난 후,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넣고, 조용히 안시를 구경했고, 그에게는 모든 공간이 자유로웠다. (223쪽)
기다리는 여성의 삶. 남편을, 아이를 기다리는 삶. 기다리는 시간은 쪼개져서 온다. 남겨진 건 모두 자투리 시간.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수영 수업이 끝나기를,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리는 시간과 시간들.
이런 문장도 있다.
가끔 나는 내가 여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닐까하고 반신반의하는 원인이 세 번이나 마취상태에서 아이를 분만한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정한” 어머니는 “분만 과정 내내 깨어 있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196쪽)
만약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어머니를 찾는다면 내가 바로 그런 어머니다. 나는 두 아이를 모두 자연분만으로 낳았다. 새벽 1시에 양수가 터져 (임산부 카페 출산기를 기억하며) 머리만 얼른 감고 병원으로 이동, 새벽 4시부터 아이를 기다렸다. 그렇게도 힘들다는 ‘마른 아이’(양수가 미리 터진 상태의 분만)를 낳기 위해 14시간의 진통을 견뎠다. 오후 6시가 넘어 이제 분만실로 들어가자는 간호사의 말에, 나는 천장을 쳐다보며 형광등이 정말 ‘노란색’으로 변했는지 확인해 보았다. 하얀색이었다. 제정신 체크. 출산 직후에는 뒷처리를 하느라 이리저리 바쁜 간호사들을 불러서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시간이 몇 시, 몇 분이죠?’라고 묻는 여유. 나는 완벽한 제정신, 분만 과정 내내 깨어 있던 사람이다. 둘째 아이 때는 더해서, 아이의 어깨가 내 몸에서 나가던 순간도 기억난다. 완벽하게 제정신, 나는 진정한 어머니인가.
페미니즘은 인간 사회의 여러 부분을 다루고 있다. 철학과 정치에도, 과학과 문학에도 페미니즘의 언어가 필요하고 페미니즘적 해석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임금 노동과 가사 노동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교육과 보육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여성주의 책 같이읽기>에서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골고루 읽고 있고, 나 혼자 읽는 책들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모성에 대한 책에는 손이 가지 않았다.
내게 모성이란, 어머니란, 엄마와 시어머니를 상징한다. 자식을 위한 삶, 완벽한 헌신과 희생이 내가 아는 모성이고, 엄마와 시어머니는 그러한 모성의 현신이다. 나는 모성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들이 ‘모성’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야무진 요즘 엄마도 아닌 나는, 작년 10월에야 ‘수능 표준 점수’가 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모성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 채로 이렇게 살아왔다.
전업주부이니 다른 사회적 일이 없고 그래서 결국 나는 ‘누구의 엄마’로 불리기가 가장 쉬운데, 나는 그러기가 싫어서 오랫동안 그걸 거부해 왔다. 모른 척 해왔다. 에이드리언 리치를 읽으면서,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의 엄마, 여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출산을 하고, 그래서 딸과 아들을 낳고, 그들의 하나밖에 없는 엄마인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엄마로서의 나’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 역시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 에이드리언 리치에게서 그런 자세를 배웠다. 하반기의, 아니 올해의 작가가 될 만하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