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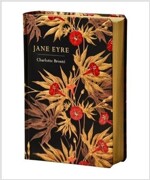
나는 왜 소설가들이 광기의 여자가 그 한가운데 놓여 있는 폭력과 환영과 혼란의 이야기에 창작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었는가 하는 점뿐 아니라, 이런 소설로의 이행이 왜 가족을 감옥과 흡사한 공간으로 변형시키고 제한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도 설명해 보고 싶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장(章)은 왜 미친 여자들이 갑자기 1840년대 후반의 위대한 가정소설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브론테, 개스켈, 디킨스, 새커리의 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듯이, 이런 새로운 빅토리아 소설의 생산은 텍스트에 악마적 여성들을 불러들인 후 그들을 처벌하고 추방하는 것에 달려 있었던 것 같다. 이 작가들이 이런 악마적 여성들을 보여 주는 방식은 이들로부터 모든 사회적 정체성을 벗겨 내는 것이었다. 이 작가들은 이런 정체성의 상실을 젠더 구별의 상실로 표현했다. (331쪽)
1840년대 후반 가정 소설에서 갑자기 떼로 등장하는 ‘미친 여자들’에 대해 낸시 암스트롱은 작가들이 이런 악마적 여성들을 보여주는 방식은 ‘모든 사회적 정체성’을 벗겨 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다락방의 미친 여자』의 공동 저자 길버트와 구바는 “상상력이 구속당했던 여성 작가들에게서 광기의 여성의 기원을 발견했다”고 적었다. (332쪽)
반면에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은 『제인 에어』와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 읽기를 통해 “버사를 야생 속 광기 어린 동물적 존재로 취급하면서, 미쳐 날뛰어 스스로 지른 불에 목숨을 잃게 하는 『제인 에어』의 서사 구조는 서구 주체가 인식하는 타자에 대한 인식의 폭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잠을 잔다』, 46쪽)
또한, 헬렌 티핀은 “『제인 에어』가 일조하는 식민주의 담론에 따르면, 술에 취해 있고 난폭하며 음탕하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은 곧 백인이 아니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하며, “식민주의 이데올로기가 브론테의 서사에 미친 영향”을 파헤쳤다. (『비평 이론의 모든 것』, 884쪽)
즉, 낸시 암스트롱, 길버트와 구바가 ‘미친 여자’를 사회적 정체성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작가의 “분신”으로 해석한 데 반해, 스피박과 티핀은 버사를 ‘미친 여자’로 이해하는 제인 에어의 식민주의적 시선, 백인 위주 세계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었다.
바로 여기다. 나는 너무나 ‘제인’이어서 ‘제인’이기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세상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천애 고아에 못생긴 고집불통. 어른들 말끝마다 토를 달고, 졸도할 정도가 아니라면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아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하고, 살아내야만 하는 젊은 여성. 고용주인 로체스터를 마음에 두고 있지만 스스로는 그의 애정을 얻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다짐하는 사람. 도덕적 우위를 위해 숀필드를 떠나고, 갖은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사랑을 쟁취하는. 사랑하는 로체스터를 구원하는 그런 사람.
하지만, 나는 어쩌면 제인이 아니라 버사이다. 유색인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불에 타 죽는 순간까지 침묵을 강요당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말했다는 이유로 광인 취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나는 오히려 버사에 가깝다. 버사 메이슨. 앙투아네트 코즈웨이. 다만 제인이고 싶을 뿐. 사실은 버사, 버사 메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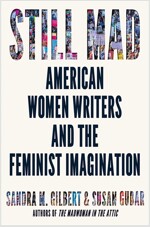
나는 뭐든 미루는 사람이다. 매일 쌓이는 집안일을 최후의 순간까지 미루고 미뤘다가 어쩔 수 없는 순간에야 후다닥 해치우고, 중요한 약속에도 미리 나가는 법이 없어 지하철 안에서도 분초를 다투며 뛰기 일쑤다. 그럼에도 오늘은 많이 아쉬운데, 친애하는 알라딘 이웃님께서 권해 주셨을 때 『다락방의 미친 여자』를 미리 읽어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밀려온다. 다 읽지 못해도 <2부: 허구의 집안에서 - 제인 오스틴의 가능성의 거주인들>, <4부: 샬롯 브론테의 기괴한 자아>만이라도 읽어둘걸. 마침 어제는 친애하는 이웃님께서 이들의 새 책이 나왔다고 알려주셨는데, 미국에서도 막 출간된 터라 조금 기다려야 할 모양이다. 적립금 많이 쌓였을 때 큰맘 먹고 구입했던 『비평 이론의 모든 것』도 얌전히 모셔져 있어서, 이번에 꺼내 보니 완전 새 책이다. 미리미리 읽어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움을 뒤로 하고 책장을 넘긴다. 아직도 343쪽. 시원한 바람에 한껏 여유로운 마음에도 한참 읽어야 할 만큼 남았다. 넉넉히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