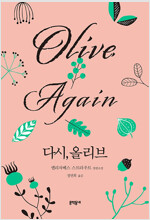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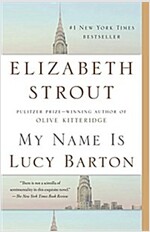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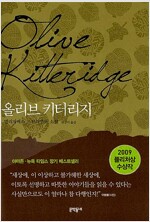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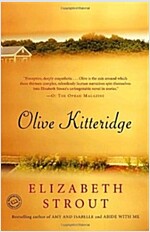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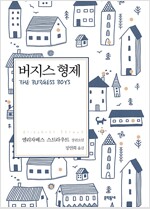
할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책 정리부터.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다시, 올리브』을 이제 막 읽었고, 몇 년 전에 『에이미와 이저벨』을 읽었다. 『My name is Lucy Barton』은 여기저기 들고 다니고 커피랑 사진 찍고 좋은 시간 함께했지만, 끝까지 읽지 못했고, 『Olive, Again』은 일단 준비해둔 상태다. 그녀의 책은 다 읽을 예정이다.
책 뒷면의 소개들이 괜찮다. 쇠락한 육식과 해진 마음에 깃드는 사랑. 아직은 내가 젊다고 생각한다. 머리 중앙에 흰 머리가 수북하고, 종잡을 수 없이 배가 나오고, 근래 눈 밑 주름이 자꾸 거슬리지만, 아직은 젊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아픈 데가 없고 무거운 물건을 불끈불끈 잘도 들고, 그리고 빠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첫 번째 남편 헨리와 두 번째 남편 잭을 떠나보낸 후, 올리브는 혼자 쓰러져 죽을 뻔한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난다. 메이플트리 아파트에 들어가 (올리브가 보기엔) 중늙은이들과 생활하다가 자신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의 죽음과 마주한다. 죽음이 아주 가까이에 왔음을 알게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올리브도 죽음을 잊고 살았다. 그리고 불현듯 깨닫는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지금 내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메이플트리에서 올리브가 새 친구를 사귀는 과정이 너무 좋았다. 나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학교에 다녔다. 지금 사는 곳도 자란 곳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 친구들까지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경기도권에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1시간 이내에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다. 그런 친구들, 언제든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던 친구들을 더는 만날 수 없다는 건 어떤 걸까. 친구들이 세상을 떠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상상할 수가 없다. 올리브처럼 내게도, 죽음은 멀리 있으니까. 저기 저 너머에 그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서로 터놓고 말하는 사이는 아닌, 그 정도 사이니까.
결혼에 대한 부분도 많은 생각을 불러왔다. 올리브가 잭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온전히 그녀의 아들 크리스토퍼가 되어 올리브에게 물었다. 이해가 안 돼요, 엄마. 결혼을 왜 해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결혼하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그렇다. 이미 결혼해 봤다면 그리고 그와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생활을 누려왔다면, 왜 다른 결혼이 필요할까. 왜 다른 사랑이 필요할까. 일평생 사랑이 단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혼은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잭과 올리브가 처음 몇 달 동안 밤마다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잠들고, 함께 8년을 지내고, 피오르를 보기 위해 오슬로행 비행기를 타고 오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올리브가 결혼한 건 정말 잘한 일이구나, 생각하게 됐다.
부모님은 자주 싸우셨다. 부부간에 싸우는 일이란 대개 사소한 일이지만 또 그런 사소한 일에는 삶에 대한 태도가 담겨 있으니까. 아무튼, 부모님은 내내 싸우셨다. 지금은 나이가 나이인 만큼 예전처럼 활달하게 싸우시지는 못하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다. 요즘에도 종종 싸우시는데, 싸운 다음 날 엄마는 통화 중에 아빠에 대해 험담을 하신다. 생김새와 성격, 인생관이 아빠와 96% 일치하는 사람으로서 찔리는 구석이 많기는 하지만, 아무튼 엄마가 욕하는 사람은 아빠이니 그런가보다,의 심정으로 마음 편히 엄마 편이 된다.
시집가서 봤더니 시부모님이 싸우셨다. 우리가 가서 싸우시는 건지, 우리가 갈 때만 싸우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분도 자주 싸우셨다. 보통은 퉁명스럽고 신경질적인 말이 오가는 정도인데, 아무튼 가까이에서 관찰한 두 가정의 부부들이 성실하게 싸우시는 모습을 확인한 후로, 나는 부부란 자고로 죽는 날까지 싸우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혹은 싸우기 위해 결혼했거나.
첫째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낮에 아이를 돌봐 주셨는데, 아이가 제일 먼저 말한 단어가 ‘아빠’였다. 전 세계에서 ‘엄마’는 공통어에 가깝다. 엄마(한국), 마마/맘(영어), 마마(독일어), 마마(중국어), 마마(러시아어).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아닌 ‘아빠’를 말했다. 나는 아직도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말한 아이를 한 명도 보지 못했다. 한 명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집 아이다. (시어머니의 반복 학습 때문일 거라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아무튼 ‘아빠’가 인생 첫 단어였던 첫째는 제 아빠를 좋아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빠하고 놀고 싶어 해서 내게로 오는 일이 없었다. 참 좋았다. 둘째를 낳았는데, 이 애는 아빠를 더 좋아했다. 말 그대로 아빠에게 딱 붙어 있어서 별명이 ‘아빠 껌딱지’였다. 시간이 흘러 총각 소리를 듣는 요즘에도, 두 자리가 나란히 있어도 둘째는 꼭 아빠 위에 앉으려 한다. 둘째도 내게 안 와서, 참 좋았다.
둘째가 하도 제 아빠를 좋아하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주 놀렸다.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빠, 내가 네 아빠랑 결혼해서 ***(남편)이 네 아빠가 된 거야. 아무 대답도 못 하던 둘째가 제법 머리가 굵어졌는지, 지난번에는 이렇게 응수를 하는 거다. 엄마, 근데 엄마가 아빠랑 결혼 안 했으면 나는 없지. 그래 맞아. 순순히 인정했다. 그래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해. 내가 네 아빠랑 결혼했으니까 네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네 아빠가 ***(남편)이 된 거고. 동의해서인지, 어이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둘째는 답이 없다.
『다시, 올리브』를 읽는 중에 알라딘 이웃님의 리뷰를 읽었는데 촉촉하고 말랑말랑하니 너무 좋았다. 인생에 인연이 하나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내 옆의 이 사람이 그런 소중한 인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이 구시대의 유물인 것은 확실하지만, 무조건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을 얻는다는 건, 또 그 나름대로 근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딸기는 이미 맛있는데. 알라딘 이웃님은 딸기를 생크림에 찍어 먹는다고 했다. 마트 생크림이냐, 제과점 생크림이냐 물었더니 친절하게 PB 생크림이라 알려준다.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그가 좋아하는 딸기와 생크림을 샀다. 딸기 먹는데 생크림이 왜 필요해? 라고 물을 것이 분명하지만, 내 마음의 달콤함과 부드러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딸기랑 생크림을 샀다. 딸기를 생크림에 푹 찍어 먹으려고. 딸기를 생크림에 찍을 때는 푹 찍어야 한다. 그래야한다고 한다. 딸기를 생크림에 푹. 푹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