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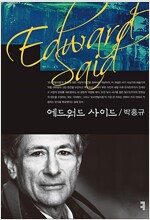



제목도 흥미롭지만, 무엇보다 인터뷰 대상자의 이름이 익숙해 책을 찾아보게 됐다. 박홍규. 박홍규? 박홍규라면… 반 정도 읽다가 현재는 행방이 묘연해 오랜 기간 ‘읽고 있어요’ 중인 『오리엔탈리즘』의 번역자 아닌가? 확인해 보니 맞았다. 그 박홍규 교수가 이 책의 주인공이다.
박홍규 교수는 영남대학교에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노동법을 가르쳤고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한평생 매일같이 도서관에 다니며 빈센트 반 고흐, 이반 일리치, 조지 오웰, 헤르만 헤세, 레프 톨스토이와 마하트마 간디, 한나 아렌트와 헨리 데이비드 소로, 미셸 푸코와 루쉰과 몽테뉴 등에 관한 150여 권의 책을 쓰고 번역했다. 오전 2-3시 기상, 여름에는 오전 7시에 아내와 함께 논일을 나가고 퇴근 후 한 시간 더 일하면서 600평의 땅을 일궈 나간다. 자급자족의 실천이다. 인터뷰 형식이어서 그의 삶과 독서, 개인과 사회에 대한 그의 생각을 비교적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교수님이 1980년대에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먼저 우리말로 옮기셨던 것도 사이드를 번역하게 되신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푸코 말씀을 해주셔서 말인데, 1995년이었나요? 교수신문사에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번역서 10권을 꼽았는데, 그중 제가 옮긴 책이 두 권이나 있었어요. 『오리엔탈리즘』과 『감시와 처벌』이 10권 중에서 2권을 차지했었는데요, 제 자랑 같지만 이건 퍽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웃음) (120쪽)
『오리엔탈리즘』을 번역하게 된 사연이 무척이나 흥미롭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책을 읽고 있는 박홍규 교수를 보고 한국에서 온 영문과 교수가 이런 책도 읽느냐 물었다고 한다. 10여 년이나 된 이 책이 왜 한국에 번역이 안 됐는지 궁금하다 했더니, 그는 그 책을 번역할 사람이 없을 거다, 한국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자기가 보기에 그 책이 읽힐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다. 오기가 생긴 박홍규 교수는 그 날밤 아내에게 내가 이 책을 번역하겠노라 말했다고. 이는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지만, 그의 말을 찬찬히 따라가 보면 한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팽배했던 서양에 대한 맹신과 서양 중심적 사고가 그를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번역으로 이끌었던 게 아닌가 싶다.
또 한 가지는 그가 가진 위치, 서울의 좋은 대학, 한국을 대표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그의 위치가 ‘변방으로서의 아시아’를 인식하게 했던 것 같다. 세계 최고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조차 누구는 아버지가 대법원장이네, 누구는 아버지가 대법관이네, 라며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그들로서는, (자기들이 보기에 시골의) 지방대를 나온 박홍규 교수가 자신들과 같은 ‘세계의 중심’, 하버드에 속한다는 걸 참아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너서클은 점점 더 좁아진다. 자신이 내부에 속한다고 안심하는 이들은 그 원을 점점 더 작게 그린다. 그들만의 법칙대로라면, 박홍규 교수는 처음의 원이 그려질 때부터 원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치에서만 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했다고 생각한다. 변방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오리엔탈리즘’의 진실을 밝혀줬다고 할까.
가난하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 빈집에 들어가기 싫어 헌책방을 헤매던 중학교 남자아이의 이야기는 ‘진지하고 성실한 독서’로 이끄는 힘이 ‘외로움’에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책을 읽지 않는다고, 슬플 때, 분할 때, 억울할 때 읽는다는 유시민 작가의 말도 기억나게 한다. 부제도 고독한 독서인. 추천사를 쓴 정혜윤 피디도 이 책은 시종일관 ‘고독의 책’이었다고 말한다.
어젯밤에 시작해 반 정도 읽었다. 나도 잠시 고독하고 싶으니, 끝이 없는 것처럼 이어지는 휴일이지만, 오늘은 모두 늦잠 자기를.
나도 좀 고독해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