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페이퍼를 적는다. 서재 일로만 치면 여름휴가를 보낸 셈인데, 실상은 여유가 없었던 것이니까 속도 모르는 휴가였다고 할까(진짜 휴가가 따로 있을지는 아직 미정이다). 아무려나 '복귀' 페이퍼는 '이달의 읽을 만한 책'이다. 이 역시 좀 늦어졌는데, 그래도 '펑크'는 아니라고 자위한다.



1. 문학예술
올여름 블록버스터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키의 신작 <기사단장 죽이기>(문학동네, 2017)가 그중 하나라는 건(어쩌면 유일?)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최근 전작들이 그랬듯이 이번 신작 역시 고액의 선인세가 지불된 것으로 안다. 하루키의 건재를 과시하게 될지, 이름값에 못 미치는 평작에 머무르게 될지 이번 주엔 공개된다. 작품이 많은 만큼 하루키 문학 가이드가 필요한 독자라면 지난봄에 나온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렵다>(책담, 2017)를 참고해도 좋겠다.



국내 소설은 블록버스터라고 하기엔 좀 약해 보이지만 김애란과 김영하의 소설집, 그리고 이정명의 장편 <선한 이웃>(은행나무, 2017) 등이 서가를 차지할 만하다.



예술분야에서는 사이먼 크리칠리의 <데이비드 보위: 그의 영향>(클레마지크, 2017)이 눈길을 끈다. '데이비드 보위'론이어서이기도 하지만 저자가 구면인 철학자여서이기도 하다. <세상의 모든 아침>의 저자이면서 공쿠르 상 수상작가 파스칼 키냐르의 음악론이 <음악 혐오>(프란츠, 2017)인 것도 특이. '공쿠르상 수상 작가 파스칼 키냐르가 말하는 음악의 시원과 본질'이 부제다. 그리고 폴란드 출신 작가 크지슈토프 보디츠코의 <변형적 아방가르드>(워크룸프레스, 2017)는 제목과 표지만으로도 선택하게끔 하는 책.



2. 인문학
인문서로는 "슬라보예 지젝, 지그문트 바우만, 아르준 아파두라이, 폴 메이슨, 판카지 미슈라, 볼프강 슈트렉, 에바 일루즈 등 다양한 국적의 저자들"이 참여한 <거대한 후퇴>(살림, 2017)를 고른다. "1989년 ‘세상의 붕괴’ 이후에 태어난 ‘세계의 붕괴’를 기록한 훌륭한 작품"이라는 프랑스 주간지의 평이 간명하다. 유발 하라리의 신작이지만 원저는 <사피엔스>보다 훨씬 먼저 나왔던 <극한의 경험>(옥당, 2017)도 내게는 올여름 필독서다.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 강의도 진행했던 김에 이번 가을에는 <극한의 경험>도 다뤄볼 계획이다.
조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문화사로는 크리스토프 리바트의 <레스토랑에서>(열린책들, 2017)를 고른다. "독일 출신의 문화사회학자인 크리스토프 리바트의 신간이다. 이 책에서 리바트는 레스토랑이라는 현대적 공간이 빚어내는 다층적 풍경을 조망한다. 사람들이 배를 채우는 음식, 혹은 맛보기를 즐기는 요리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 리바트는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미식의 문화가 싹 트고 꽃을 피운 과정을 조목조목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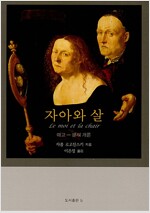
철학 쪽에서는 이번에 재간된 피에르 아도의 <고대철학이란 무엇인가>(열린책들, 2017)과 '문제로 읽는 서양철학사'로서 아르보가스트 슈미트의 <고대와 근대의 논쟁들>(길, 2017) 등이 '수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책들이다. 프랑스 철학자 자콥 로고진스키의 <자아와 살>(도서출판b, 2017)도 마찬가지. 주제에 흥미가 생겨 영역본도 구했다.



3. 사회과학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책들을 고른다. 가벼운 책으로는 에릭 니우와 닉 하나우어의 <민주주의의 정원>(웅진지식하우스, 2017)이 있다. "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시장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며 운영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민주주의의 정원>은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새로운 세계상을 ‘시민과 경제, 그리고 정부’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엮어 제시한다."
그리고 좀 무거운 책으로는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내인생의책, 2017).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 마치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처럼, 민주주의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 책은 그 과정과 이유, 대안을 밝히고 있다."(아스트라 테일러)는 소개가 와 닿는다. 더불어 대니얼 벨의 <차이나 모델,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서해문집, 2017)도 눈길을 그는 책. '대의민주주의의 덫과 현능정치의 도전'이란 부제에서 내용을 어림해볼 수 있다. '현능주의'란 말의 뜻은 아래 소개를 참조.
"지난 30년간 중국에서는 ‘현능주의(賢能主義, meritocracy)’라고 표현할 만한 하나의 정치체제가 형성되어 왔는데, 이 책은 이 특이한 정치체제의 이념과 실제를 담고 있다. 즉 품성[賢]과 능력[能]이 뛰어난 지도자의 선발을 선거에만 맡기지 않는 현능주의 정치체제를 다룬 책이다(‘meritocracy’는 흔히 ‘능력주의’ 혹은 ‘실력주의’로 번역되지만, 거기에는 ‘품성’의 뜻이 빠져 있기에 저자는 ‘현능주의’라는 용어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4. 과학
과학 분야에서는 먼저 피터 갤리슨 하버드대 교수의 <아인슈타인의 시계, 푸앵카레의 지도>(동아시아, 2017)를 고른다. "저명한 하버드대 과학사학자 피터 갤리슨의 이 책은 그야말로 경이롭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시계 특허나 제국 경영에 필수적이었던 지도 제작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벌써부터 이 책에 대한 우리 독자들의 반응이 기대된다."(이상욱 교수) 나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학저널리스트 캐슬린 매콜리프의 <숙주 인간>(이와우, 2017).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는 내 몸속 작은 생명체 이야기'가 부제다(분야로는 '신경기생생물학' 이야기다). 믿거나 말거나 내지 '서프라이즈'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 페이지마다 등장한다. "2016년 아마존 올해의 과학책.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 몸속에 오랜 시간 거주해 온 기생생물과 미생물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나아가 우리들의 도덕관과 사회적 이념까지 조종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올여름의 과학서로 유력하다.
영화 <컨택트>와 그 원작인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 덕에 관심을 갖게 된 주제가 '미래 기억'인데, 이와 관련하여 독일 저자들이 쓴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문예출판사, 2017)도 관심도서다. "이 책의 저자인 한나 모니어는 세포생물학적 성과를 통해 세계적인 과학자로 인정을 받았다. 2004년 독일 과학재단에서 매년 최고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라이프니츠 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한나 모니어의 박사학위 논문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에 나오는 질투에 대한 연구였다. 공저자인 마르틴 게스만은 독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철학자로 이 책에서도 기억에 대한 뇌과학 이론을 철학적 담론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5. 책읽기/글쓰기
알라딘에서 인지도가 높은 이동진의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이동진 독서법>(예담, 2017)과 금정연의 <실패를 모르는 문장들>(어크로스, 2017)을 제외하고 세 권을 고른다. 출판평론가 장동석의 독서록이자 독서론 <다른 생각의 탄생>(현암사, 2017), 그리고 기자이자 번역자였으며 현재는 <미스테리아> 편집장 김용언의 <문학소녀>(반비, 2017), 고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시도, 강신장의 <고전, 결박을 풀다>(모네상스, 2017) 등이다...
17. 07. 09.



P.S. '이달의 읽을 만한 고전'으로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을 고른다. 김석희 선생의 번역본으로 새로 출간된 게 계기인데, 올해가 소로 탄생 200주년이 된다는 건 이번에 알았다. 그간에 많이 읽힌 은행나무판과 펭귄클래식판을 고려하면 <월든> 번역판도 3파전이 되는 셈. 개인적으로는 내년 1학기에 미국 고전문학 강의(19세기 미국문학) 때 새 번역본으로 읽어볼 계획이다. 이번 여름에 미리 읽어도 좋겠다. 아무 때면 어떤가. 의미 있는 독서 거리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책들을 일컬어 고전이라 부르거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