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중앙선데이에 실은 '로쟈의 문학을 낳은 문학'을 옮겨놓는다. 보르헤스의 단편 '페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를 조명하는 글이다. 당연히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없었다면 쓰이지 못했을 작품. 그렇지만 보르헤스는 또 보르헤스식의 기상천외한 단편을 썼다. 문학 독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작품이지만, 생소한 독자들도 있을 듯하여 이 연재에서 다뤘다.



중앙선데이(14. 04. 20) 다시 쓰기는 베끼기인가 창조인가
보르헤스의 미학이 가장 압축적으로 제시된 작품은 『픽션들』에 수록된 단편소설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1939)다. 『돈키호테』의 저자는 세르반테스 아니냐고? 물론이다. 하지만 보르헤스는 또 다른 저자를 우리에게 소개한다. 그가 우리에게 안내하는 이야기의 미궁은 어떤 것인가. ‘메나르의 진정한 친구들’의 일원임을 자임하는 소설의 화자는 메나르가 남긴 작품들의 목록을 정리하면서 유작들 가운데 특별히 『돈키호테』를 자세히 언급한다.
화자가 ‘우리 시대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메나르의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의 “1권 9장과 38장, 그리고 22장 일부”로 구성돼 있다. 세르반테스의 걸작에 대한 ‘다시 쓰기’를 시도한 것인가? 놀랍게도 메나르의 기획은 현대판 『돈키호테』를 쓰는 게 아니라(“그것은 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자체를 쓰는 것이었다.
가령 『돈키호테』 9장에서 세르반테스는 “역사는 ‘진실’의 어머니이자 시간의 적이며, 행위들의 창고이자 과거의 증인이며, 현재에 대한 표본이자 조언자이고, 미래에 대한 상담자다”라고 썼다. 보르헤스의 화자에 따르면 이것은 17세기 작가가 쓴, 역사에 대한 단순한 수사적 찬양에 불과하다. 이것을 메나르는 “역사는 ‘진실’의 어머니이자 시간의 적이며, 행위들의 창고이자 과거의 증인이며, 현재에 대한 표본이자 조언자이고, 미래에 대한 상담자다”라고 다시 쓴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맞다, 똑같다. 그런데 다르다.
텍스트 차원에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메나르의 『돈키호테』 사이에는 아무 차이도 없지만, 그것을 쓰는 행위에서는 두 작품 간에 차이를 빚어낸다. 문체를 예로 들자면, 자기 시대의 스페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했던 세르반테스와 달리 20세기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메나르에게 17세기 스페인어 문장은 고어체인 데다 다소 부자연스럽기까지 하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텍스트라 하더라도 그 텍스트를 읽는 지평이 달라짐에 따라 작품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메나르는 자신의 ‘자상한 선구자’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쓴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세르반테스는 익숙한 언어와 타성적인 상상에 이끌려 약간 마구잡이로 그 불멸의 작품을 써 내려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메나르 자신은 이 우발적인 작품을 문자 그대로 다시 쓰는 ‘신비로운 의무’를 수행했다. 그렇게 새롭게 쓰인 『돈키호테』에 대해 ‘명민하지 못한’ 독자들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글자 그대로 옮겨졌다’라고 우길 테지만, 화자의 생각은 다르다. “피에르 메나르의 작품은 세르반테스의 작품보다 거의 무한할 정도로 풍요롭다.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더 ‘모호’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모호성은 풍요로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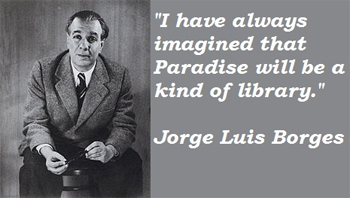
이렇게 보르헤스는 피에르 메나르라는 가상의 인물을 『돈키호테』의 또 다른 저자로 창조해 낸다. 이것은 보르헤스의 창작 방법에 친숙한 독자라면 전형적인 ‘수작’임을 눈치챌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작가와 소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논평하는 것이 보르헤스의 장기이니 말이다. “메나르는 (아마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기법-계획적인 시대착오와 잘못된 원저자 설정-을 통해 꼼꼼하게 흔적을 남기는 기술인 독서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저자는 마치 신처럼 작품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간주돼 왔지만, 정작 작품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독서라면 저자는 한갓 기능으로 전락한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구호는 그렇게 해서 탄생한다. 그리고 보르헤스는 그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그런데 ‘다시 쓰기’ 전략을 통해 저자와 텍스트의 관계를 유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세르반테스야말로 원조가 아닐까?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자신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의 역사학자 베닝헬리가 쓴 글을 각색한 작품이라고 했다. “이 텍스트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굳이 문제를 삼자면 아마도 작가가 아라비아 사람이라는 게 문제일 것이다. 아라비아인들은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이다. (…) 이 이야기에서 유익한 것이 빠져 있다면 주제의 문제가 아니라 알량한 작자에 의해 기술된 탓이라고 생각한다.” 베닝헬리는 물론 세르반테스가 창조한 가공의 인물이다. 화자에 따르면 베닝헬리의 ‘원작’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아라비아어 원문을 스페인어로 옮긴 무명의 번역자도 중간에 끼게 되기에 이 작품의 ‘저자’는 여럿이 된다.
보르헤스는 비록 세르반테스처럼 방대한 분량의 장편소설을 쓸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문학적 유희 정신을 충실히 계승한 상속자다. 그는 유명한 자전적 산문의 제목을 ‘보르헤스와 나’라고 붙였는데, 세르반테스 역시 ‘세르반테스와 나’라는 글을 남겼다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겠다. 세르반테스야말로 작가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그런 가면을 쓰고서 연기할 줄 아는 작가였기 때문이다.
14. 0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