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겨레에 게재된 '로쟈의 인문학 서재'를 옮겨온다(http://h21.hani.co.kr/section-021162000/2007/09/021162000200709200678067.html). 이번이 세번째 연재인데, 매번 '초읽기'에 내몰려 쓰는 바람에 한두 가지씩 아쉬움을 갖게 되지만 그만하면 선방('선빵'이 아니라)이라고 자위하는 편이다. 이 글도 미처 주문했던 원서가 도착하기 전에 씌어진 것이다(책은 원고를 보내고 수시간 뒤에 받았다). 그런 식으로 글은 자신의 운명을 갖는다. 아무리 짧은 글이더라도.

한겨레21(07. 09. 20) 부시 안에 빈라덴이 있다
20세기가 10월 혁명과 함께 시작했다면 21세기는 9월 테러와 함께 막이 올랐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이 스펙터클 어드벤처 뺨치는 테러사건과 그에 뒤이은 반테러 전쟁 때문에 현생 인류가 평온하게 지내기는 이번 세기도 이미 글러먹은 듯하다. 6주기를 맞이하여 백악관은 이렇게 말했다. “테러와의 전쟁은 군사적인 대결을 능가하는 것으로, 21세기의 중대한 이념투쟁이다.” 그리고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이렇게 보고했다.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를 완전 소탕하려면 앞으로도 수십 년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21세기의 이 중대한 ‘이념투쟁’은 우리의 생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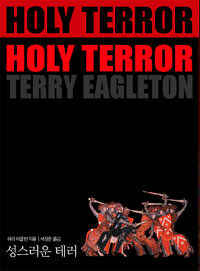
과연 다른 길은 없는 것일까? 당장은 ‘그라운드 제로’에서 생각의 골을 더 깊게 파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영국의 문학평론가 테리 이글턴의 <성스러운 테러>(생각의나무 펴냄)가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 ‘깊게 파기’이다. 저자는 ‘서구 문명사에 스며 있는 테러의 계보학에 대한 고찰’로 우리를 초대한다.
‘테러리즘의 의미’를 묻기 위해서 그가 먼저 확인해두는 것은 테러리즘이란 말이 요즘의 용례보다 훨씬 복잡하면서도 넓은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때의 테러리즘은 인류의 기원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며 축복과 저주, 성과 속을 모두 의미할 만큼 오지랖이 넓다. 그에 따르면 “고대 문명에는 창조적인 테러와 파괴적인 테러, 생명을 부여하는 테러와 죽음을 불러오는 테러가 동시에 존재”했다. 이러한 테러의 양가성은 곧 신성(the sacred) 자체의 양가성이기도 하다.
<성스러운 테러>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그 양가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글턴이 제시하고 있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바쿠스> 읽기다. 이 드라마는 ‘바쿠스’ 곧 디오니소스에 관한 이야기다. 이글턴이 ‘최초의 테러리스트 지도자 중 하나’로 지목하는 주신(酒神) 디오니소스는 알다시피 “포도주와 가무, 환희와 연극, 풍요와 과잉, 영감의 신”이지만 동시에 “탐욕적이고 폭력적이며 차이를 적대하는 획일성의 지지자”이다. 그의 이 양면적인 성격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다. 대저 이 디오니소스를 어찌할 것인가?
<바쿠스>에 등장하는 테베(테바이)의 지도자 펜테우스는,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테베를 찾아와 여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흥청망청 숭배하도록 한 디오니소스에게 적개심을 품고서 상식 밖의 폭력으로 대응한다. 그는 주신의 머리를 베고 쇠지레로 그의 성소를 부숴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심지어 무질서의 신 디오니소스가 화해를 제안했을 때조차도 이를 경멸하듯 거절하며 아예 신을 감옥에 가두어버린다. 화가 난 디오니소스가 지진을 일으켜 감옥을 나온 뒤에 무자비한 복수를 감행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에우리피데스의 극에서 이렇듯 서로 충돌하고 있는 디오니소스와 펜테우스 가운데 누가 테러리스트인지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다. 펜테우스 또한 디오니소스와 똑같은 논리 및 감수성으로 전투에 나서면서 디오니소스 못지않은 광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우리는 <바쿠스>가 “분명 테러리즘과 부당한 정치적 대응 사이의 결정적 유사성을 강조하는 작품”이라는 이글턴의 평가에 공감하게 된다. 이 그리스 고전 비극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에우리피데스의 위대한 극은 디오니소스를 신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에게 정당한 대응을 하느냐의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킨다. 그 정당한 대응이란 바로 ‘경외심’(reverence)이다. 경외심이란 맹목적인 억압의 반대말이면서 디오니소스가 펜테우스의 타자가 아니라 펜테우스 안에 잠복한, 자아의 또 다른 중심이라는 걸 인정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즉,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말하는 태도다. ‘테러 시대’의 예지는 먼 곳에 있지 않은 것이다.
07. 09. 22.





P.S. 칼럼에서 언급되고 있는 에우리피데스의 <바쿠스>는 두 가지 번역본으로 국내에 소개돼 있다. 하나는 희랍어 원전 번역 <에우리피데스 비극>(단국대출판부, 1999)의 '박코스의 여신도들'이고, 다른 하나는 영역본을 옮긴 <그리스 비극>(현암사, 2006)의 '바코스의 여신도들'이다. '바쿠스'는 물론 '디오니소스'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다. 거기에 덧붙여, 천병희의 <그리스 비극의 이해>(문예출판사, 2002), 김상봉의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한길사, 2003), 그리고 사이먼 골드힐의 <러브, 섹스 그리고 비극>(예경, 2006)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참고문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