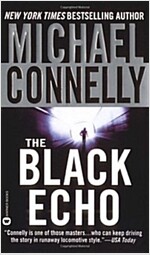
그 유명한 해리 보슈 시리즈를 드디어 시작했다.
1권만 읽는 사람은 없다더니 과연. 1992년 이야기라 휴대폰 이전 시기의 박진감 넘치는 아날로그 세상도 읽을 수 있다. 잠복근무 중의 형사 두 명 중 하나는 본부에 연락하느라 공중전화기로 달려가고, 도청장치는 전화기 송화기에 건전지를 붙여서 설치한다. 비상시에 형사들은 삐삐로 호출되며, 형사 보고서 작성시엔 타자기 혹은 컴퓨터 앞에서 순번을 기다린다. 중요문서는 전화나 종이로 전달되고 무엇보다 지도. 종이 지도 위의 탈출구 표시 푸른 잉크는 번져서 주인공을 좌절시키며 어쩐지 그 사람 싫더라니.... 하면 꼭 일이 터지고, 모든 일의 시작은 인간의 욕심과 희망, 그리고 과거와 업보, 복수, 혹은 정의 실현이라고 한다.
해리 보슈 시리즈가 십여 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살짝, 보슈가 죽을까봐 조금 걱정했지만 정석적으로 착착착 진행된다. 대강의 줄거리나 플롯은 모르고 읽는 게 낫다. 예측가능한 설정과 우연이 많기 때문이다. 유일한 여성 캐릭터 FBI 요원 엘리너가 '예쁘다'는 칭찬에 '고맙다'고 대답하는 장면이나 그녀의 사연이 구구절절 아부지, 오라버니를 부르고 있어서 갑갑했다. 그래도 재미있다는 게 이 책의 힘 혹은 나라는 독자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