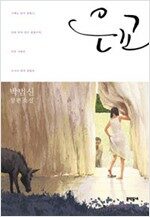 지난 주, 고등학교 졸업반을 함께한 친구 두명과 꽃구경을 했다.
지난 주, 고등학교 졸업반을 함께한 친구 두명과 꽃구경을 했다.
대학도 같이 다녔는데 결혼하고 아이낳고 이러저러 나이를 먹어가며
새록새록 또다른 면이 보인다.
아침에 갑자기 벚꽃이 한창 너무 이쁘던데 가자는 연락이 오고 우리는 무조건 뭉쳤다.
시내의 약간 변두리 동네인데 벚꽃터널이 새파란 하늘 아래 눈부셨다.
우리는 그길을 걸었다. 그늘에 앉아 잠시 커피를 마셨다.
꽃이 예쁘다는 걸 예전엔 몰랐단 말에 난 애잔한 거지, 질 것을 알고 있으니,라고 웅얼거렸다.
여린 쑥이 지천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쑥국 한 번 끓여먹으라며 둘이서 내 몫을 뜯어줬다.
난 그냥 앉아서 작은아이랑 갈등한 이야기를 했고
'넌 아직 젊었나보다, 쑥도 안 뜯고'란 그럴싸한 말을 들었다.
그놈의 열정은 언제 죽을건지,라는 말을 들은 건 얼마전 전화통화에서다.
봄햇살을 맞으며 그냥 걸었고 그냥 좋았다.
징글징글하게도 가슴속 그리움 한뼘은 아무렇게나 자란 여린 쑥처럼 자라고 있었지만.
박범신 갈망 3부작의 마지막 '은교'를 녹음하고 지금 1차 편집 한가운데쯤에 있다.
사실 박범신의 소설에 마음을 둔 적이 없었는데 편견이었던지, 이 작품은 뭉클하고 뜨겁다.
특이한 구성으로 들려주는 고백의 언사들을 엿보며
말 되어지지 않은 것들 속에서 진실은 얼마나 고독할까 싶었다.
옮겨놓고 싶은 문장도 아주 많다.
이 소설의 단어는 '관능' 혹은 '죽음의 욕망'이라 말하고 싶다.
아니 '사랑하는 자, 즉 비애를 끌어안고 살아야하는, 존재의 슬픔'이라 말해야될지.
시인은 죽어서도 살아남는 자, 이어야 했던 주인공 이적요의 예술가적 욕망이 노인의 그것과 병치되어 더 뜨겁다.
작가는 시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지 소설을 잇는 맥을 시로 구성하고 있다.
그 시들은 주인공 이적요 시인의 내밀한 감정과 내적갈등을 적재적소에서 비춰준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가 될 듯, 아름답고 처절하기도 하다.
사람들이 언제 밟을지도 모르는 낮은 땅 위로 아무렇게나 자라나는 여린 쑥처럼,
이적요 시인의 집뜰 소나무 짙은 등걸처럼,
"육체는 다만, 풀과 같은가." (은교, 139쪽)
존재의 욕망과 생명의 갈망은 그렇게 무섭도록 서글프고 애틋하다.
순간순간 죽음을 앞당기고 그것을 꿈꾸고 있듯이.
<은교>에 나오는 시들을 몇 적어본다.
그리하여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쉴새없이 입속에서 달콤한 럼주를 씹는다
나의 추억은 눈썹과 함께 우거져갔다
그리고 허무 - 털이 숭숭한 악마의 손톱이
나의 목덜미를 잡아 젖혀
등을 휘어잡는 것을 느낀다.
- K. 크롤로 [럼주병을 가진 자화상] 전문
나의 머리는 반백이 되고
나의 배는 복통처럼 불러지고
나의 기침은 그칠 새 없다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
젊었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참말로
해를 쪼이고 있는 도마뱀처럼
나의 발가락이 물가에서
갈색이 되어가는 것을 쳐다보며
나의 발이
그 머리를 갸우뚱거리는 걸 바라보았었다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서
- J. 프레베르 [늙는다]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포악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마음속에서 참는 것이 더 고상한가
아니면 고난의 바다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어 반대함으로써
이를 근절시키는 것이 고상한가
- Shakespeare, [햄릿]에서
쭈글거리는 노파는
귀여운 아기를 보자 마음이 참 기뻤다
모두가, 좋아하고 뜻을 받아주는 그 귀여운 아기는
노파처럼 이가 없고 머리털도 없었다
- C.P. 보들레르 [노파의 절망]에서
밤에 사랑의 추가
항시와 전무 사이를 흔들 때에
너의 언어는 가슴의 달에 부딪히고
소낙비 올 듯한 너의 푸른 눈은
지상의 천국을 주었다
- P. 첼란 [밤에] 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며 이 두 손에 생각이 미치면
발을 알고 허리를 알고
그리고 모양 없는 성기를 똑똑히 안다면
이것이 육체인 것이다 잠을 욕심내고
언젠가는 죽지 않으면 안 될 육체
그것은 지칠 대로 지쳐서 어제에서 내일로
끌려다니며 '언제'와 '어디' 사이에 끼여있는 베개를 쥐어 뜯으며
떨면서 그는 묻고 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걸까?
형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
- H.E. 홀투젠 [시간과 죽음에 관한 여덟개의 바리아시옹]에서
사람과 사람을 서로 물어뜯게 하는 곡예사가
무대 위에 올려놓으려고 해도 나는 믿지 않는다
살해는 언제나 무대 위에서 행해진다
나락을 지나서 묘지에 매장된다
그러나 나를 죽인 사나이는 무대 위에서 우쭐대고 있다
- 요시모토 류메이, [사랑노래] 에서
저 소리 없는
청산이며 바위의 아우성은
네가 다 들어가버렸기 때문이다
겹겹 메아리로 울려 돌아가는 정적 속
어쩌면 제 안으로만 스며 흐르는
음향의 강물!
- 문덕수, [침묵]에서
사랑받는 것은 타버리는 것
사랑하는 것은 어둔 밤에만 켠 램프의 아름다운 불빛
사랑받는 것은 꺼지는 것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긴 긴 지속
- R.M. 릴케 [말테의 수기]에서
모든 나의 괴로움 사이 죽음과 나 사이
내 절망과 살아가는 이유 사이에는
不正과 용서할 수 없는 인류의 불행이 있고
내 분노가 있다.
- P. 엘뤼아르 [사랑의 힘에 대하여]에서
그냥 헤어질 수는 없어야 했을 것이었다
내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울든가 어쨌어야 했을 것이었다
나도 그랬고 그도 그랬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그도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 박남수 [손]에서
땅거미 짙어가는 어둠을 골라 짚고
끝없는 벌판길을 걸어가며
누이여, 나는 수수 모가지에 매달린
작은 씨앗의 촛불 같은 것을 생각하였다
가고 가는 우리들 생의 벌판길에는
문드러진 살점이 하나,
피가 하나,
이제 벌판을 흔들고 지나가는
무풍의 바람이 되려고 한다
마지막 네 뒷모습을 지키는
작은 촛불의 그림자가 되려고 한다
저무는 12월의 저녁달
자지러진 꿈,
꿈 밖의 누이여
- 박정만, [누이여 12월이 저문다]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