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소설가, 시인, 평론가, 번역가, 서평가, 영화감독 등등.
문화계 인사 스무 명이 각자 좋아하는 ‘연애 소설’을 뽑았다.
참담하다. 스무 편이 넘는 <연애 소설>중 내가 읽은 작품은 다섯 편 뿐이었다.
모든 소설을 연애소설이라 말할 순 없지만, 대부분의 소설은 연애 소설 아닌가.
특히나 고전 중 사랑을 소재로 하지 않은 작품은 언뜻 떠올리기가 힘들다.
나라면 아룬다티 로이의 <작은 것들의 신>,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코엘료의 <오, 자히르>, 안나 가발다의 <나는 그녀를 사랑했네>를 뽑겠다.
스무 명의 문화계 인사 중 요조님의 첫 등장은 왠지 자연스럽다.
정성일 평론가가 첫 등장이었다면, 서민 박사가 첫 등장이었다면......음.....
......어쩜 다들 이리 글을 잘 쓸까.
요조 - <야행>, 김승옥

어쩌면 이 단편을 읽었었는지도. 민음사 <무진기행>에도 실려있으니. 김훈은 <라면을 끓이며>에서 아버지를 회고하기도 한다. 그의 아버지 역시 문인이셨다. 하루는 김훈의 아버지와 문인 지우들이 모여 김승옥 이야기를 한다. 김승옥의 문장은 그 당시에도 전대미문이었나 보다.
<야행>도 발칙하다. 육교 위에서 처음 본 여자의 손을 잡고 여관을 가는 남자나 그 남자를 잊지 못해 하염없이 밤길을 걷는 여자나. 그녀가 바라는 것은 파멸이 아니라 구원이었다니.
요조님의 서점, 꼭 가보고 싶다. 서점 잘 되시길.
김보통 – <속 깊은 이성친구> 장 자끄 상뻬.

박현주 - <채굴장으로>, 이노우에 아레노
<마츠 이스라엘손의 이야기> [레몬 테이블]수록, 줄리언 반스


미리엄- 웹스터 온라인 사전 11판에 ‘some’은 ‘알려지지 않고 결정화되지 않고 특정화되지 않은 단위나 존재를 묘사하는 단어’라고 쓰여있다.
두 작품 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연애 소설이라 할 수 있는 건가.
죽어가는 남자가 임종 침대에서까지 깊은 무의식의 심연에서 퍼 올리는 기억이 될 정도로 굳건히 자리 잡은, 언어 너머의 마음이 있다는 환상을 주는 것이 연애소설의 본디 의미일 것이다. 우리의 말하지 않은 기억은 고스란히 잊히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묻히므로 그 존재조차 증명할 수 없다. 그 마음을 그대로 당신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모르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조차도 이 감정이 과연 실제의 것이었나 믿지 못하고 불확실하게 흔들릴 때, 어떤 소설은 그게 환영이 아니니 부인하지 말라고 말해 준다.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다고, 세상에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때도 그 마음은 존재하고 있었다고.
정지돈 - <몰타의 매> 대실 해밋, <독보건곤> 용대운, <규방철학> 사드.



후장사실주의자답다. 연애소설로 사드의 <규방철학>을 뽑다니.
나는 누구와도 다르다. 그러나 나는 누구와도 같다.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는 누구와도 같지만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는 누구와도 다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김소연 - <요오꼬, 아내와의 칩거> 후루이 요시끼찌

서민 - <사랑이 달린다>, <사랑이 채우다> 심윤경


역시나 두 번째 아내 자랑으로.
황인찬 - <독학자>, 배수아

이도우 - <워싱턴 스퀘어>, 헨리 제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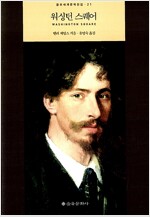
언젠가 인상적으로 읽은 심리학 에세이 <가스등 이펙트>에 ‘가스라이터’와 ‘가스라이티’라는 흥미로운 낱말이 있었다.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상대방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의 심리를 이 책의 저자 로빈스턴은 ‘가스등 이펙트’라 이름 붙였는데, 이 비유 역시 고전영화 <가스등>에서 따온 것이다. 조종하는 가스라이터와 조종받는 가스라이티.
“한번 각인된 것은 간직하는 아이니까요. 캐서린은 흠집이 난 구리 주전자 같아요. 주전자를 윤이 나게 닦아 놓을 수 있지만 흠집을 지울 수는 없거든요.”
백민석 – 철도원, 러브레터 <철도원> 성야의 초상 <은빛 비>, 올림포스의 성녀 <산다화> 아사다 지로.



김민정 - <눈> 막상스 페르민.

눈이네, 라고 말하는 순간 여자의 심장은 뜨거워졌다. 사랑해, 라고 말하는 순간과 무엇이 다르리,
“시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글이라는 팽팽한 줄 위에 한없이 머무르는 것. 꿈의 고도에서 삶의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 단 한 순간이라도 상상의 줄에서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야. 참으로, 가장 어려운 일은 언어의 곡예사가 되는 일이지.”
page 42. 그의 성기가 시든 아티초크처럼 늘어질 때까지, 그리고 처녀의 그곳에 보랏빛 멍이 들 때까지.
아티초크. 여자는 사전부터 찾았다. 쌍덕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엉겅퀴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잎은 어긋나고 깃 모양으로 깊게 갈라진다. 잎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솜 같은 흰색 털이 빽빽이 있다. 꽃은 여름에 자줏빛으로 피고 두상화를 이루며 달린다.
박준 - <상실의 시대>, 무라카미 하루키

김중혁 - 세 번째 이자 마지막, <축복 받은 집> 수록, 줌파 라이리.

밀란 쿤데라의 말. “필연과는 달리 우연에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 하나의 사랑이 잊히지 않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성 프란체스코의 어깨에 새들이 모여 앉듯 첫 순간부터 여러 우연이 합해져야 한다.”
“모든 이야기는 끝까지 계속 갔을 때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 그 사실을 숨기려는 사람은 진정한 이야기꾼이 아니다. ”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말이다.
안은별 - <산시로>, 나스메 소세키

김종관 - <포스트 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 제임스 M 케인

배명훈 - <데브다스> 사라트찬드라 차토파드히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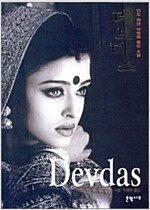
정성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백야>, 도스토예프스키

금정연 - <신들은 바다로 떠났다> 존 반빌, < 안 그러면 아비규환> 닉 혼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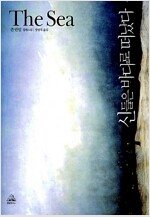

정세랑 - <제인 오스틴 북 클럽> 커렌 조이 파울러, <시라노> 에드몽 로스탕


조금 더 현대적인 사랑 이야기를 읽고 실을 때는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의 작품들에 손이 간다. <여명>도 좋지만 <암고양이> 쪽이 더 연애소설이다.
불타오른 다음 파멸하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에 대해서라면 의외로 존 스칼지가 잘 쓴다. <노인의 전쟁>, <유령 여단>, <마지막 행성>, <조이 이야기>로 이어지는 4부작의 주인공인 존 페리와 제인 세이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박솔뫼 - <아수라 걸> 마이조 오타로

닳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래서 한번 해 봤는데, 닳아 버렸다. 내 자존심이.
이제와서 되돌려 달라고 해 봐야 녀석이 다시 되돌려 줄 리도 없을뿐더러.
원래 자존심은 되돌려 받는 게 아니라 되찾는 거다.
주영준,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무라카미 류

리뷰를 쓰기 위해 다시 책을 읽으니 이상하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정성일이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때문일까, <백야>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그의 영화에 출연한 요조님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