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해 봄의 불확실성
저자 시그리드 누네즈
열린책들
2025-01-20
원제 : The Vulnerables
소설 > 영미소설
소설 > 세계의 문학 > 미국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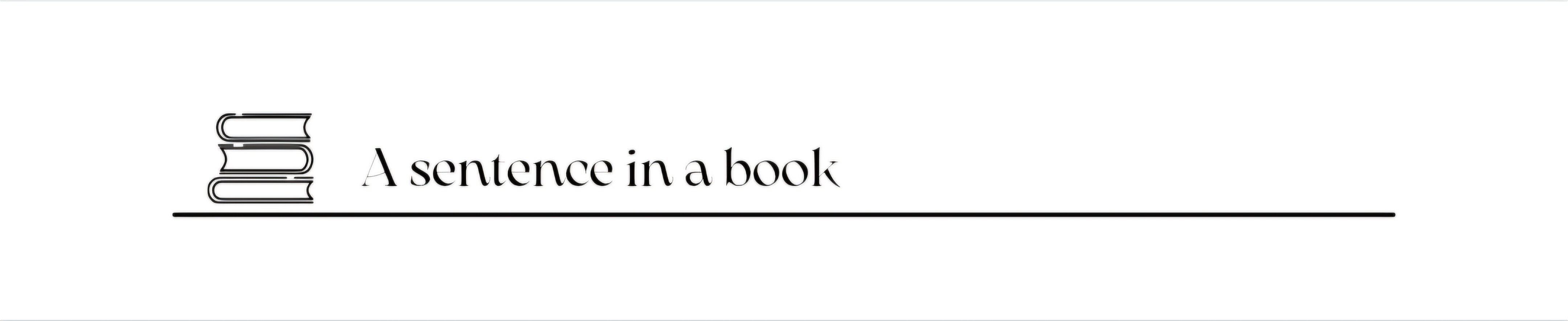
<불확실한 봄이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이 문장 말고는 내용이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나도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을 읽고 지금까지 기억나는 건 소설의 서두, 그러니까 그 첫 문장으로 시작하여 날씨에 대한 서술이 이어지 것뿐이었다.
책을 쓸 때 날씨 이야기로 시작하지 말 것! 글쓰기의 기본 규칙 중 하나다. 나로선 왜 그래야 하는지 도통 납득할 수 없지만 말이다.
<무자비한 11월 날씨>는 찰스 디킨스의 『황폐한 집』 세 번째 문장이다. 그다음부터 디킨스는 그 유명한 안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다.
<폭풍우 치는 어두운 밤이었다.> 나는 이 문장이 소설을 시작하는 최악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것도 도무지 납득 할 수가 없다(누구의 주장인지 잊었다. 이것도 찾아봐야겠다.) 따분한 동시에 지나치게 신파적이라는 이유로 경멸의 대상이 된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날씨를 화젯거리로 삼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상상력 결핍이라는 표현을 썼다. 물론 그가 살던 시대에 날씨 ㅡ 특히 영국의 날씨 ㅡ 는 따분한 것이었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훨씬 더 변덕스럽고, 종종 세상의 종말을 불러올 대재앙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은, 디킨스가 이야기한 건 정상적인 안개, 즉 응결된 수증기, 낮게 깔린 구름이 아니라 런던의 지독한 산업 오염이 유발한 독기였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봄이었다.
한동안 나는 책을 읽을 수가 없었고 다시 글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 그건 그해 봄의 많은 불확실성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내가 아는 작가 중에 그런 체험을 하지 않은 이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왜 평생 애도하며 사는 기분인지 알고 싶다. 그 감정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고 도무지 사라지려 하질 않는다.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모든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 하고 내가 한때 무척 사랑했던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이건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기억한다, 그 애의 귀를. 작은 속닥거림과 킥킥거림까지 들을 수 있는 크기와 모양을 가진 귀. 그는 앞줄에 구부정하니 앉아 미동조차 없었다. 맹수를 만난 먹잇감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의 두개골에 구멍을 내어 그 구멍으로 빨간 페인트를 붓고 있기라도 하듯 어두운 홍조가 서서히 그의 목덜미를 타고 올라갔고, 그러잖아도 큰 귀가 피가 몰려 더 커진 것 같았다. 그러자 다들 한 마디씩 했고 ㅡ 쟤 귀 좀 봐! 쟤 귀 좀 봐! ㅡ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른 후에야 잠잠해졌다.
내가 나빴다, 맞다. 하지만 그 대가를 한 번이 아니라 너무 여러 차례 치르도록 만든 것에 대해선 신들에게 따지고 싶다.
나는 유레카가 나와 놀고 있지 않을 때, 내가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을 때 그 새를 지켜보는 게 좋았다. 새들은 세상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룡이다. 나는 그 경이로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유레카를 지켜보는 게 좋았다.
「요즘은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이해하려는 시도도 하지 마.」
나는 의자 위에 서 있었고, 엄마는 입에 옷핀을 물고 말했다.엄마는 용케 옷핀을 떨어뜨리거나 삼키지 않고 말할 수 있었다. 엄마의 또 다른 이미지: 저녁마다 흔들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수를 놓는, 1백 년 전의 장면처럼 보이는 모습. 그리고 사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슬픔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내가 일찌감치 알 수 있도록 해준 건 엄마였다.
난 시인이 될 거야.
그때 그 경이로운 깨달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가 거기 개울 속 바위 위에 앉아서 방금 겪은 몹시도 기이한 일을 모조리 이야기하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글이 잘 안 써진다고 말했을 때, 그럼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는 걸까?
편집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상상해 보라: 꼭 완벽한 글을 쓸 필요는 없어요.
「매우 불완전한 글이 될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가 새 소설을 시작하면서 일기에 쓴 말이다. 그럼에도, 열성적이었다.
언젠가, 소녀 시절에, 나는 벽에 기대어 서서 여학생들 무리가 수녀의 인솔 아래 공원으로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여학생들은 교복 차림이었다. 흰 블라우스에 진청색 플레어스커트. 그들은 둘씩 짝을 지어 손을 잡고 걸었다. 수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더니 그들에게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무슨 말을 했다. 그러자 여학생들이 짝지어 뿔뿔이 흩어졌다. 한 마리 애벌레에서 날아오르는 열두 마리 나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