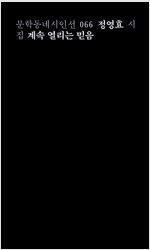
이런 제목의 책이 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눈에 익은 책이고 많이 들었던 책이다.
이 책, 『내 옆에 있는 사람』 저자 옆에 앉았다.
마지막 시의 한 연을 고쳐 가느라, 아니 고쳐야한다고 생각하느라,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옆에 앉을 수도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고, 책을 준비하지 않아 싸인 받을 기회를 놓쳐 버린 것을 야나님 탓으로 돌렸다.
이 자리를 빌어 야나님에게 쏘리를 전한다. 야나님, 쏘리~
[내 옆에 있는 사람], [찬란], [눈사람 여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렵다. 어렵다고 느낀다.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정이 샘솟는, 살갑게 대하고 싶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시창작 수업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좋은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던 거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많이 웃었다. 그 시간들이 참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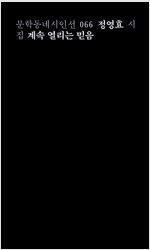 지지난주였던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아팠다. 나는 타고난 저질체력이라 몸을 아끼는 편인데, 전날 밤에 흥에 겨워 너무 신나게 연주해서 그런가. 손목, 팔, 어깨에 통증이 느껴졌다. 밥을 준비해서 먹이고 각각 자기의 자리로 보내놓고는 시집을 들고 침대에 누웠다. 시를 다섯 개 읽었다. 너무 많이 읽기에는 어려운 시다,라고 생각했다.
지지난주였던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아팠다. 나는 타고난 저질체력이라 몸을 아끼는 편인데, 전날 밤에 흥에 겨워 너무 신나게 연주해서 그런가. 손목, 팔, 어깨에 통증이 느껴졌다. 밥을 준비해서 먹이고 각각 자기의 자리로 보내놓고는 시집을 들고 침대에 누웠다. 시를 다섯 개 읽었다. 너무 많이 읽기에는 어려운 시다,라고 생각했다.
시 다섯 개를 읽고는 잠이 들어서 한 시간을 잤다. 정확히는 50분 정도 잔 것 같은데, 일어나니 몸이 가뿐하니 방금 전의 통증이 거짓말 같았다. 한 시간의 단잠이 몸살을 이기게 했나,라고 생각했다가 침대 머리 맡, 시집에 눈이 갔다.
나를 낫게 한 건, 시였다. 이 시, 아마도 이 시가 아니었나 싶다.
시를 읽고 나았다. 시를 읽고, 나는 나았다.
일어나지 않는 일
정영효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려고
기분과 눈빛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그런 상황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태어났으면 좋을 사람과 사귀면 건강해지고
가지 못하는 나라의 소식을 듣는 게 오히려 경험적이다
오 분을 먼저 걱정할 때마다 오 분간만 해야 하는 생각
우연히 마주쳤는데 마주치지 않더라도 생기는 일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곳에서 멈춰야 할 순간이 생긴다
하나쯤 붙잡고 싶은 의지라는 것
졸음이 묶인 개의 꼬리를 풀어주고
정오에 들리는 종소리가 누군가를 신실하게 만들 듯
가까이할수록 멀리서 진실이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를 바라보며 떨어진 과거를 찾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란 쉽지 않다
유일한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다만 당장을 불러보면서
이제부터 끝으로 밀려나는 세계를 믿고
문을 잠근 채 누워 있는 너를 친구로 여기고
꿈을 가진 자의 속물을 감춰주는
그런 상황을 기다리며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나에 대해서만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