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 인문학 강좌의 아홉번째 책이자 마지막 책을 어제 마쳤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의 연속이라 끝나고 나니 좀 홀가분한 심정이다. 비대면 수업이라 해서 신청했는데, 줌으로 진행되다 보니 언뜻 대면과 비슷했고, 수업만 들으려고 했는데 수업과 토론 비중이 1:1이었다.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어린애마냥 다시 배웠다.
다음주는 추석이고, 그 다음주가 마지막 시간인데, 선생님은 ‘내 인생의 책’을 한 권씩 골라서 서로에게 추천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셨다. 아, 내 인생의 책이라. 내 인생의 책, 내 인생의 책. 내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서 ‘내 인생의 책’을 한 권만 고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짜파구리를 그릇에 담는 아이에게 물었다. 다음주에는 내 인생의 책을 서로 소개하기로 했어. 나 뭐할까? 내 인생의 책이 뭐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가 대답한다. 제인 에어, 제인 에어야. 아, 글쿠나. 내 인생의 책은 제인 에어구나. 내가 그렇게 말했구나. 내 인생의 책은 제인 에어라고, 내가 여러 번 말했구나. 어느 출판사였는지 기억도 나지않는, 불타오르는 빨간색 표지의 제인 에어. 그 때부터 오늘까지, 내 인생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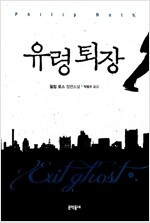
예전에 알라딘에서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가지고 갈 책 3권을 골라보라는 ‘책의 날’ 이벤트가 있었는데(요즘에는 안 물어보는 겁니까, 알라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제인 에어, 그리고 유령퇴장을 골랐던 것 같다. 그러니까, 4년 전이라면 내 인생의 책은, 영원한 나의 등불 성경과 내 인생의 동반자 제인 에어를 베이스로 깐 상태에서, 필립 로스의 『유령퇴장』이라 하겠다. 지금이라면 어떨까.

내 인생의 책이요? 어떻게 한 권만 고른다는 말입니까. 이 잔인한 나의 숙제여. 내 ‘인생’만큼 ‘추천’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면, 정희진 선생님 책을 고르고 싶다. 선생님 책은 모두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한 권만 고르라고 한다면, 공동 저작인 도란스 기획총서 1권 『양성평등에 반대한다』를 꼽고 싶다. <양성평등에 반대한다>도 좋지만, <들어가는 말 : 여성주의는 양성평등일까?>도 좋다. 나는 아직도 이 책에는 밑줄을 긋지 못 하고 있어서, 이 책은 새 책처럼 여전히 깨끗하다. 줄을 그을 수가 없다. 밑줄을 그어야 한다면,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모두 그어야 한다.



페미니즘 책 가운데서 고를 수 있다면, 거다 러너의 『가부장제의 창조』와 마리아 미즈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도 좋겠다. 하지만 처음 페미니즘을 읽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엄마는 페미니스트』, 이 책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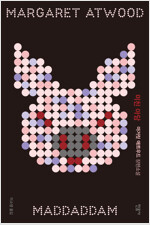
세 권짜리도 괜찮다면 마거릿 애트우드의 미친 아담 3부작을 말하고 싶다. 마거릿 애트우드는 『시녀 이야기』로만 회자되기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넓은 작가가 아닌가 말이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고전이라 ‘추천’에 어울릴만한 책이기는 한데, 올해의 한국 작가에 빛나는 『사람, 장소, 환대』도 꼭 말하고 싶은 책이기는 하다. 올해의 발견 마야 안젤루의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도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올해의 설렘 포인트 백점에 빛나는 『나의 사촌 레이첼』도 빼놓을 수 없겠다. 책을 읽는 모든 순간, 레이첼 발 앞에 모든 것을 던져 놓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나는 완전한 필립으로서, 레이첼을 못내 사랑한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정희진처럼 읽기』다. 2014년에 나왔고 2015년에 읽었다. 추천한 책들이 너무 어려워서 몇 개의 책들만 골라서 읽었는데, 내가 나름 ‘발견’이라고 생각했던 책들은 모두 이 책 안에 ‘있었던’ 책들이라, 재회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읽고 쓰는 것, 책 읽고 공부하는 삶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요즘이다. 책을 읽는다는 게 어떤 일인지,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는 프롤로그 <나에게 책은>이 참 좋다. 정희진처럼은 못 읽지만, 『정희진처럼 읽기』를 읽을 수 있어 다행이다.
그나저나 진짜 내 인생의 책은 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