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을 고백하자면, 나는 지난달에 『성의 변증법』을 읽고 있었다. 자주 봐야해서 빌려 읽을 수 없고, 줄을 치고 싶어 도서관 책으로 읽을 수 없는 ‘페미니즘 고전’을 책주문 때마다 한 권씩 넣고 있는데 지난달의 책이 『성의 변증법』이었다.
내게 최초의 페미니즘 ‘총격’은 『여성성의 신화』(구, 『여성의 신비』)였고, 나는 이런 대목에 밑줄을 그었다.
구운 감자요리는 세계만큼 크지 않으며, 거실 마루바닥을 청소하는 일은 충분한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지력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일이 아니다. 여성은 헝겊 인형이나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다.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인간의 자신의 사고력으로 사상과 비전을 세우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면서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음식과 섹스가 필요하지만, 사랑할 때, 인간으로서 사랑할 때, 그리고 과거와 다른 미래를 발견하고 창조하고 계획할 때 비로소 한 사람, 한 인간일 수 있다. (『여성의 신비』, 131쪽)
그 다음 충격 지점은 『캘리번과 마녀』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혁명의 영점』이다. 나는 이전에 이 책을 읽었고, 이번에 <여성주의 책 같이 읽기 : 2월의 도서>로서 이 책을 다시 읽게 되었는데, 같이읽기를 결정하면서 이번에는 재독이니 ‘읽기’만큼 읽은 내용을 ‘정리’하는 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다짐했었다. 하지만! 이 책은 얼마나 뜨거운지 혁명의 제로 포인트로 나를 다시 초대하고야 한다.
앎의 위치성,은 정희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번 생각해 보았던 대목이어서, 나는 ‘페미니즘’ 책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책’을 한가히 읽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사회적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사회적 분류에 따른 내 위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멸시를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시선을 모른 척 했을 때 사회적이라고 할 수 없는 내 사회적 위치의 편의와 혜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지난 번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이 책을 읽었던 것이라면,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발을 들여놓고 책을 읽어가는 느낌이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 우리는 하녀이자 매춘부이고 간호사이자 정신과 의사이다.(45쪽) 지난 번에는 삼색볼펜의 파란색으로 밑줄을 그었다면, 이번에는 형광펜이 등장한다.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형광펜이,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는 노동을 노동이라고 호명함으로써 이제까지 전혀 몰랐던 사랑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섹슈얼리티를 새롭게 창조하고 싶다. 그리고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 가지가 아닌 수많은 종류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동시에 수많은 일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녀이자 매춘부이고 간호사이자 정신과 의사이다. (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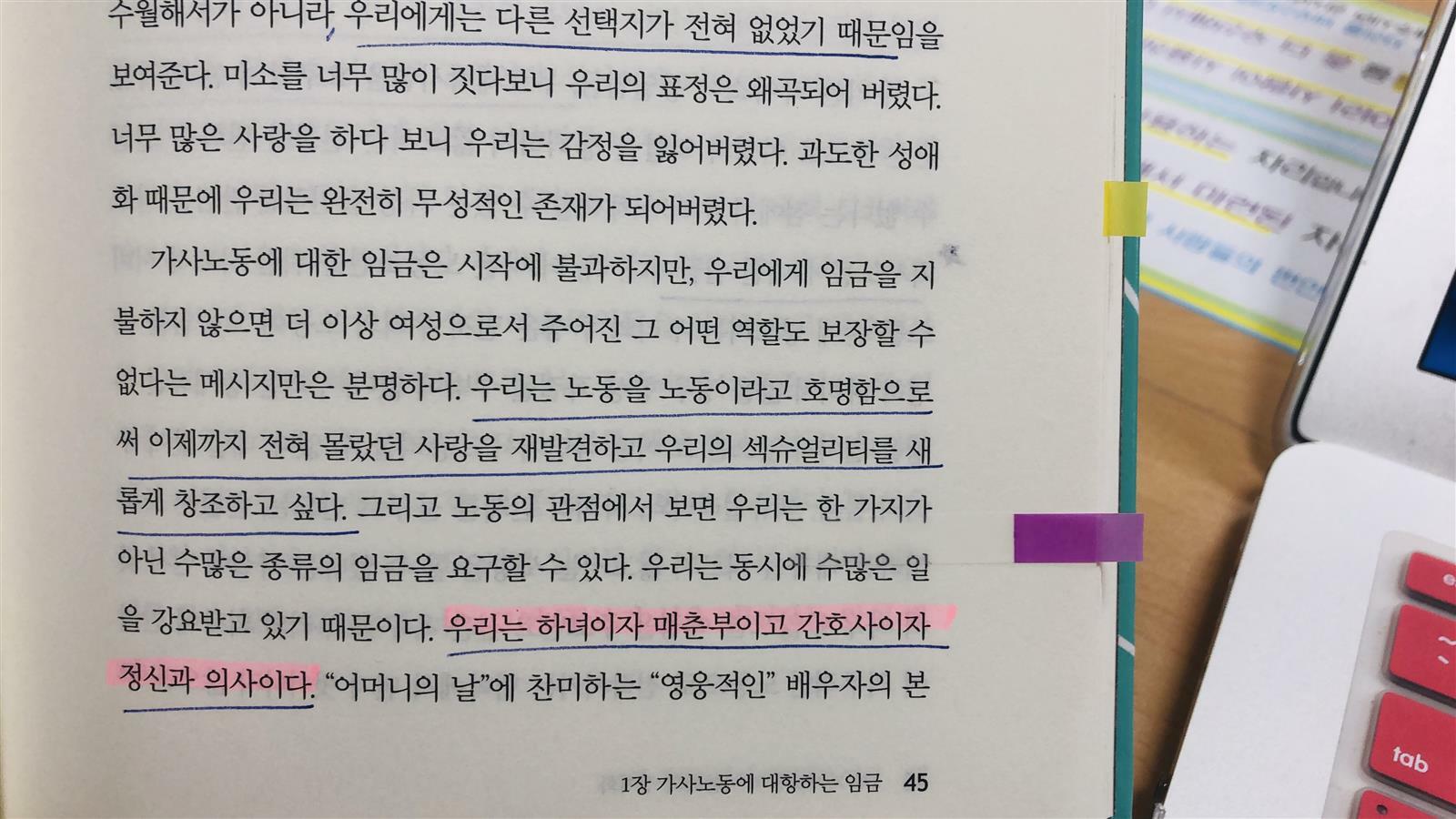
생각해보니, 『성의 변증법』은 시작부터 형광펜이었다. 이 무시무시한 책은 ‘형광펜’의 등장을 당연시한다. 읽는 이를 압도해 버린다. 이 책에 다른 제목을 붙여야 한다면, 그 제목은 공히 ‘혁명의 영점’이 될 것이다.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페미니즘은 사회적 평등을 위한 진지한 정치운동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의 두 번째 물결이다. 그 목적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견고한 계급-카스트 제도를 뒤집어 엎는 것이다. 그것은 전형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성에 기초한 계급제도를 부당하게 정당화하고 외면적으로도 영구화하면서 수천 년 동안 굳어져 내려온 제도이다. (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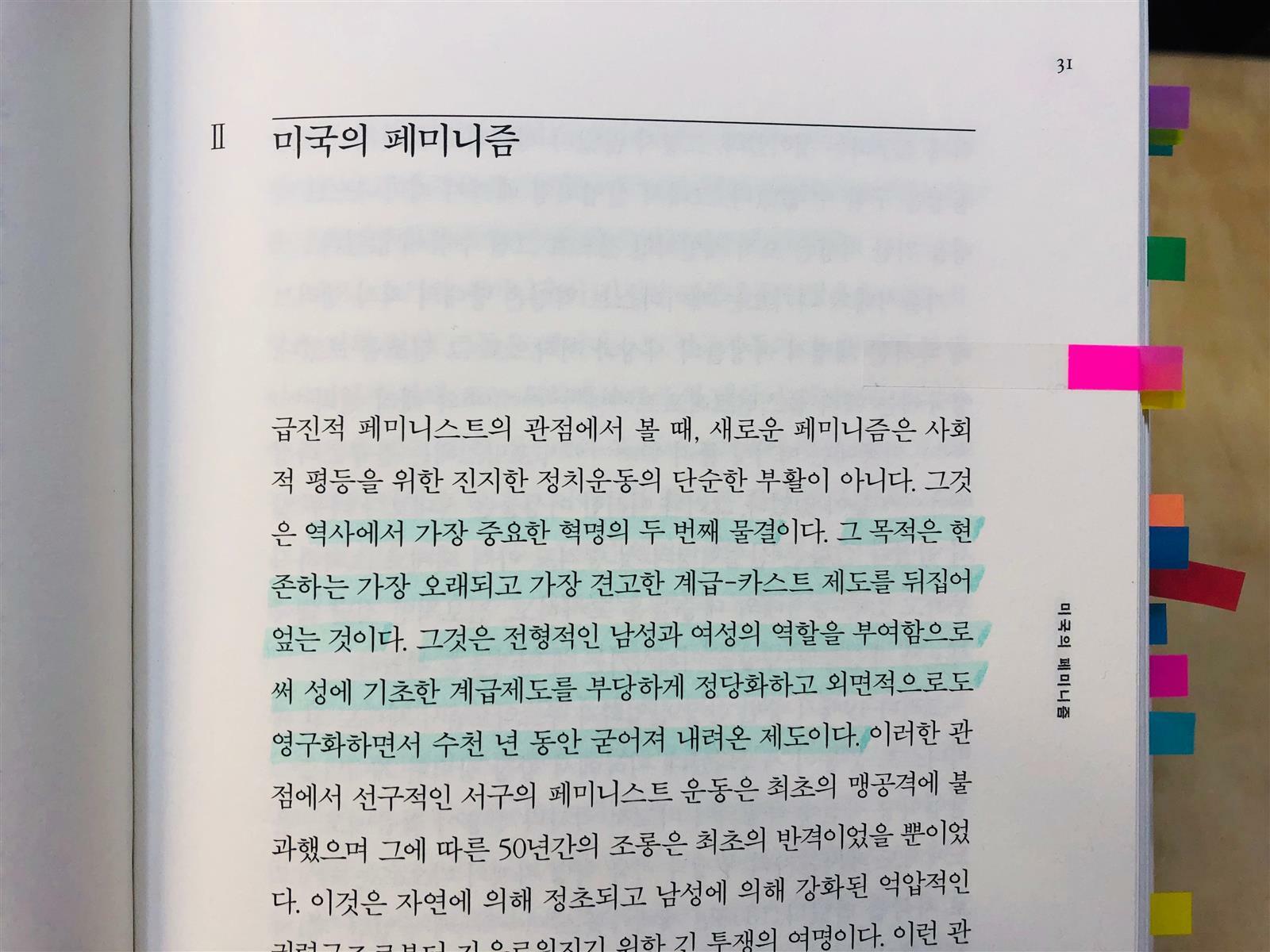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견고한 구분, 성에 기초한 계급제도, 성-카스트의 붕괴가 가능할까. 여성이, 여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
답을 찾을 때까지. 미세먼지 속 뿌연 현실이 확실한 한 개의 정답을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그 답을 찾을 때까지. 단발머리의 밑줄 긋기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