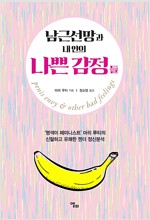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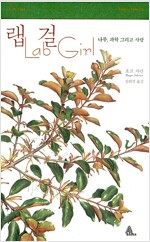
진화심리학을 상대로 뜨거운 맞짱을 뜬 역작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의 저자 마리 루티의 신작이다. 개인적인 경험과 이론을 융합해 쓰는 페미니즘 글쓰기에 따라 이 책에는 저자 개인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소련 국경 근처 핀란드의 가난한 마을, 온 몸을 에일 듯한 혹독한 긴 겨울, 그리고 여성들에게 불모지나 마찬가지인 철학 분야에서의 직업적 성취. 『랩 걸』의 호프 자런이 겹쳐진다. 스칸디나비아의 딸들은 모두 이렇게 강한가.
저자가 신자유주의 사회의 네 기둥으로 지적한 성과, 생산성, 자기계발, 긍정이 유발하는 ‘나쁜 감정’에 대한 고찰이 푸코 이론과 함께 이어지고 이성애가부장제의 근간인 결혼 제도의 허상 역시 가차없이 폭로된다. 낭만적 사랑에 대한 종교적 맹신을 지적하는 부분이 관심을 끈다. 온 세상이 한 목소리로 사랑이 인생의 전부라고, 사랑의 힘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위대한 ‘사랑의 세기’ 에, 사랑의 가면과 화장에 속지 말라는 그녀의 말이 의미 있다.
사랑이 찾아오면 도망치지 말라. 그러나 사랑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 줄 거라고 믿지는 말라. 사랑을 오해해선 안 된다. 사랑이 욕망과 얽혀 있는 한,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속성상 사랑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욕망이 빠진 사랑은? 그 사랑은 쉽게 지루해지고 짜증과 분노 같은 불쾌한 감정을 끌어들인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곧잘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사랑을 회복하려는 감정노동은 감정 자원의 낭비다. 다른 데 썼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냈을. (126쪽)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성소수자들의 운동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끈다. 서로 사랑하는 그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기존의 문화와 문법을 벗어난 그들이 왜 굳이 다시 그 테두리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지 그게 궁금했다. 마리 루티의 글을 읽으며 이해가 됐다.
2016년 8월 미국 입국 거절과 몇 년 후 캐나다 시민권 신청 과정을 통해 저자는 미국과 캐나다 이민국이 그녀가 ‘미혼이고 아이가 없다는 점’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학위 일정과 1년 동안 미국 대학을 방문할 자격 및 상세한 설명이 하버드대학 마크와 함께 고용제안서에 적혀 있는데도, 이미 대학에서 종신재직권을 얻고 책을 여러 권 출판했는데도, 미국과 캐나다는 제각기 그녀의 입국과 이민 신청을 망설인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의 미국 친구 하나와 ‘결혼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일인데 말이다.(117)
정희진과 리베카 솔닛에 이어 나는 마리 루티를 한참 좋아할 판이다. 저자의 제자이기도 한 번역자가 부럽다. 맨 앞줄에 앉아 어느 남자 교수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카리스마와 열정을 보여주는 교수의 강의를 직접 듣고, 그렇게 좋아하던 교수의 책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일은 대단할 뿐 아니라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녀가 부럽다.
이 책의 백뮤직은 김동률의 ‘그림자’ Live.
자기를 불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시라고 이성복 시인은 말했다. 천재 김동률은 ‘나 그대를 보내야만 한다면 차라리 그대를 닮은 그림자로 숨어서 그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리하겠소’라고 노래했다. 스물 넷의 청년이, 젊은 남자가 ‘그대를 닮은 그림자로 숨겠다’고 동굴 같은 목소리로 고백했다는 걸 떠올리며. 생각한다. 젠더 고정 관념과 진화심리학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또 속이려 하는데도, 나는 왜 사랑을 믿는가. 그 미친 들뜬 상태를 아직도 믿고 있는가.
택배 아저씨들은 ‘남기는 말’에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는데도 양수기함에 세제와 샴푸와 운동화를 잘도 놓고 가시던데,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집 양수기함에 무언가를 놓고 가실까.
그게 궁금한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