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막다른 골목이다. 이 책은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만약 그렇다면 어제 종일 읽어
50페이지 밖에 읽지 못한 이유를 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려운 이 책을 왜 읽기 시작했느냐고
묻는다면, 도서관에 걸어가 이 책을 고르고 야무지게 빌려 온 내 자신을 원망해야 하는지, 내게 이 책을 읽어야겠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준 어떤 사람, 소문자
s님을 원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앞부분 마르크스의 생애
부분은 흥미진진하게 읽어나간 것이 위로 아닌 위로일 뿐이다.
그래서 어제는 또 도서관에 갔다. 뉴스피드를 가득 채우는 허수경의 시집을 받기 위해서였다. 상호대차한
허수경의 시집을 들고 ‘바닐라라떼 아이스 연하게’를 주문하고는
자리에 앉아 왼쪽 책날개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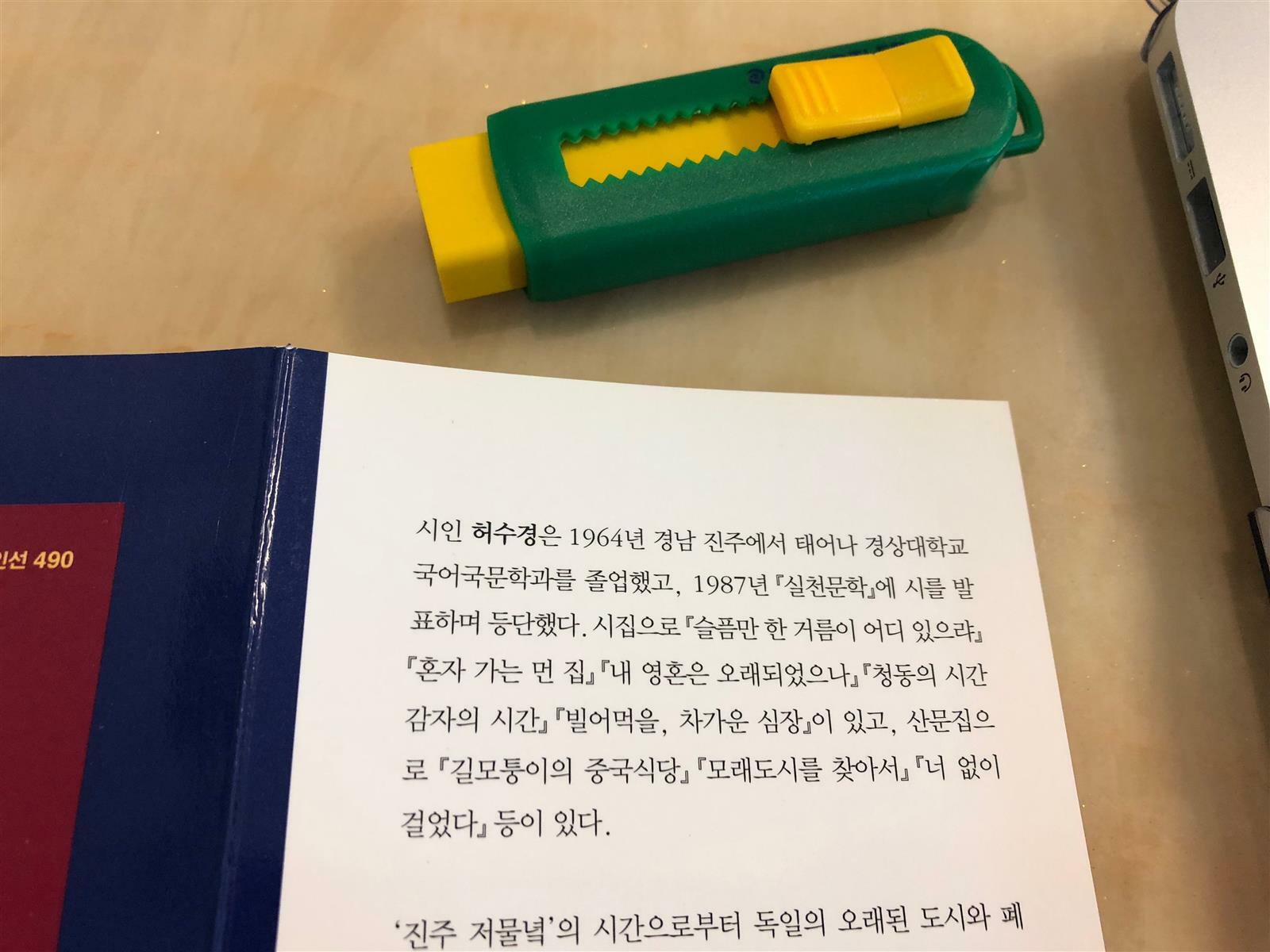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에 꽂힌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는 내게 허수경의 첫번째 시집이다. 그런데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의
이 익숙함은 뭐지? 아, 생각난다.

2년 전 겨울이었던가. 야나문에서
야나님이 만들어준 딸기차를 앞에 두고는 기념샷을 찍겠다며 문학동네 시집 중에서 빨간색 시집을 골라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 그 시집이 바로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이다. 나는 그 해, 그 겨울에, 그 시집을 만났지만 허수경을 읽지 않았고, 이제서야 그녀가 없는 지금에서야 그녀의 시집을 펼친다.
수육 한 점
이 한 점 속, 무엇이 떠나갔나
네 영혼
새우젓에 찍어서
허겁지겁 삼킨다
배고픈 우리를 사해주려무나
네 영혼이 남긴 수육 한 점이여
엄마가 꽁치 김치조림을 만드시던
날이었다. 음~ 맛있겠다.
음~ 맛있어.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비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내게 엄마가 말씀하셨다. 그래, 남이 살이
들어가야 맛있지. 남의 살? 남의 살? 그래, 남의 살. 남.의.살. 남의 살,의 섬뜻함과 남의 살,의 고소함이 공존하는 꽁치 김치조림.
수육 한 점을 남기고 떠난 그
영혼은 배고픈 우리를 달래준다. 우리를 살린다.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나를 다시 살게 해 주고 수육 한 점을 남겨준 그 영혼은 그렇게 떠나간다.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인간이 그렇다. 인간은 흠~ 삼키고 후~ 뱉는다. 물을
마셔야 하고 또 물을 마신다. 무엇보다 먹어야 한다. 먹지 않으면
인간은 죽는다. 오늘 내가 먹은 것들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 수 있다.
위대한 식물이 아닌 평범한 동물로
살아가는 한 인간은 이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우린 무언가를 먹어야 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 무언가는 죽어야 한다. 내 존재 자체가 무언가의
죽음 위에서만이 가능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오랜 소망을 난 최근에서야 버렸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나는 알아버렸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결심했다.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오늘의 나를 위해 죽어간 무엇이 있다는 걸 잊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말이다. 무언가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임을 잊지 않고 싶다.
식물 같은 인간으로 살고
싶다. 수육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수육을 가끔 먹기는 하지만, 수육을 많이 먹지는 않는 그런
인간.
식물 같은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