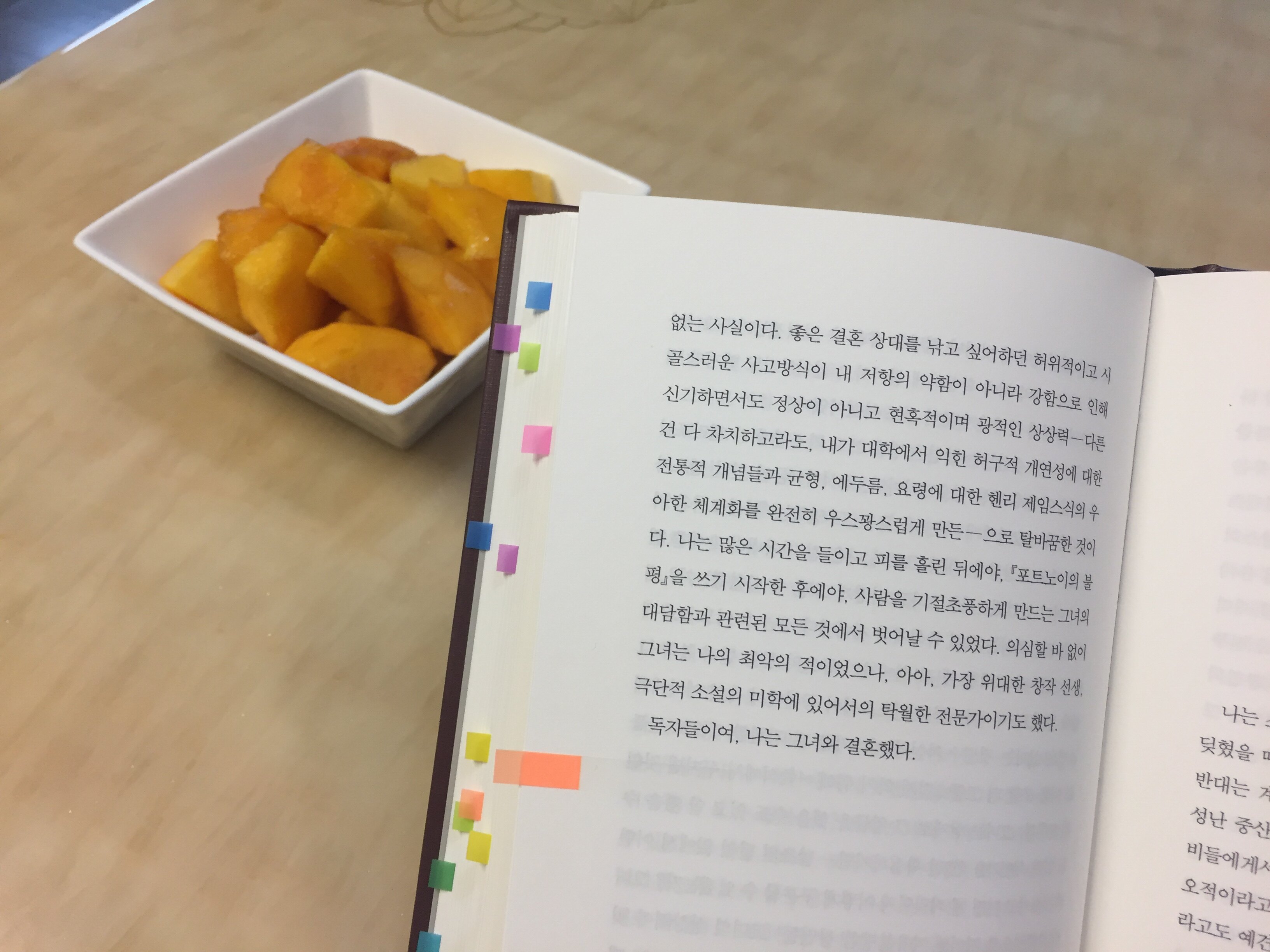-

-
사실들 - 한 소설가의 자서전
필립 로스 지음, 민승남 옮김 / 문학동네 / 2018년 7월
평점 :



『사실들』의 부제는
‘한 소설가의 자서전’이다.
한 소설가는 필립 로스.
1.
소설가의 진화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소설가’는 자신이 그리려는 세상,
혹은 자신이 그려내고 싶은 세계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데뷔 전에 이미 결정했다고. 그래서 소설을 쓸 때, 자신이 계획한대로 예정한 대로 ‘소설을 써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 혹은 두 개라고 생각했다. 쓰고 싶은 한 가지에 대한 다양한 변주만이 가능할 뿐이라고
말이다. 필립 로스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필립
로스의 초기작들은 ‘유대인의 삶’에 대한 냉철한 고찰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필립 로스가 평생 동안 ‘유대인의 삶’ 또는 ‘유대인으로서의
삶’에 그토록 천착하게 된 것은 그의 의도였기 보다는 그의 첫번째 소설에 대한 유대인들의 ‘폭발적인’ 반응 때문이었다.
유대인
집단은 한때 나를 껴안아 더할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던 반면 광적인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다. 내가 쓴
모든 글이 수치스러운 것이고 모든 유대인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성을 지녔다는 말을 들은 마당에 어떻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광적인 안정감, 광적인 불안감 –
유대인의 드라마가 그 이중성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 그날 밤의 사건보다 더 잘 입증해줄 수 있는 것 내 평생 없었다.
내가
예시바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도 글감을 찾기 위해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작가라면, 작가가 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내가 초반부터 유대인들의 성난 저항을 불러일으켜 예시바에서 당한 수모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었다. 유명 상표를 갖게 되었으니까. (189쪽)
2.
소설가의 사랑
먼저 필립 로스를 좀 욕하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보겠다. <사실들>이라는
제목에서부터 필립 로스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사건들 혹은 기억들이 아니라, 사실들이다. 그래서 필립 로스가 사랑했던 혹은 그를 사랑했던 여성들의
목소리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필립 로스의 입장에서 쓴 글임은 확실하다.
만나는 여자가 임신할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쿵당쿵당 걱정스러웠다면 남성 피임 용구를 사용하셨으면 좋았을텐데… <프렌즈> 시즌 8에서는 레이첼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로스와 조이가 남성 피임 용구의 효능이 97%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되고 경악하는 장면이 있다. 물론 3%의 놀라운 생명력에 대해 모른 척 하자는 뜻이 아니다. 97%의
확실성을 가진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97%는 정말 놀라운 수치다. 확실하고 검증된 남성 피임 용구를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164쪽 “독자들이여,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는 『제인
에어』 “독자여, 나는 그와 결혼했다.”의 패러디로 읽힌다. 그녀의 끝없는 요구와 그녀에게 빚진 모든 것들
앞에서 비정해 보이는 것에 겁을 먹었기 때문에, 아이를 지우면 그녀와 결혼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와 결혼했다. 결국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 놓은 후에야 두 사람은 헤어질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은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지옥 그 자체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산다는 것. 어쩔
수 없이 산다는 것.
나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피를 흘린 뒤에야, <포트노이의 불평>을
쓰기 시작한 후에야, 사람을 기절초풍하게 만드는 그녀의 담대함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녀는 나의 최악의 적이었으나, 아아, 가장 위대한 창작 선생, 극단적 소설의 미학에 있어서의 탁월한 전문가이기도
했다.
독자들이여,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 (164쪽)
3.
은 쓸 수가 없는데, 책을 아직 끝까지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 책의 앞부분은 작가 로스가 주커먼에
게 쓸 글이고, 마지막은 작가 주커먼이 로스에게 쓴 글이다. 작가 주커먼은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사실’은 아니지 않냐고 작가 로스에게 따질
작정으로 보인다. 나는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 50여쪽 남은
책을 마저 읽을 것인지 아니면 이 글을 쓸지 결정해야 했다.
아직도 방학. 아롱이가 오늘의 유일하고 제일 중요한 일정인 ‘바둑 학원’에 가면 내게는 딱 1시간 30분이
남기 때문이다. 아롱이가 이제 막 바둑학원에 갔다고, 오늘
학교에 가지 않은 1인에게 전하니, “엄마, **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좋아?”라고 묻는다.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아니긴 한데, 아니긴 하지만, 사실 확신에 찬 대답은 아니었다. 어제의 승자가 잭 리처였다면, 오늘의 승자는 복숭아이기에. 아아, 복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