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1일 1그림은 그렸으나,
퇴근 시간이 '땡~!'하자 미친 듯 달려나갔을 뿐이고, ㅋ~.
어제 친구와 카톡으로 이런 대화를 나눴다.
나 ; 난 어떤 땐 O를 보면 부럽다.
나두 나이 오십 먹으면 O처럼 될 수 있을까?
O ; ㅋ 나처럼이 어떤 건데
나 ;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거...ㅋㅋㅋ
O ; 그건 게을러서 그렇다 ㅋ
나 ; 그럼 나도 내년엔 게을러지겠다.
O ; 그치, 그럼 안달복달 안하게 된다 ㅋ
나이 마흔을 바깥 사물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불혹(不惑)이라 했단다.
그전까지는 오락가락 우왕좌왕해서 판단을 세울 수 없었다면,
마흔 살이 넘게 되면 그런 판단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란다.
난 불혹을 넘긴지 한참인데 미혹되기만 할 뿐이고~--;
마흔에서 쉰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뽕나무 상'
자를 쓰는 상년(桑年)이 있단다.
마흔 여덟 살을 상년(桑年)이라고 부른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된소리 내기를 사용하면 '쌍년'이 된다, ㅋ~.
이 상년(桑年)이라는 말은 글자를 파자(破字)해서 만든 것이다.
상(桑)자는 흔히 십(十)자 세 개 밑에 나무 목(木)자 형태의 속자를 쓴다.
이 글자를 하나하나 분해하면 열 십(十)자 네 개와 여덟 팔(八)자 하나, 그래서 (10×4)+8=48이 된다.
내가 내년에 그런 '쌍년'같은 '상년'을 맞게 된다.
부디 안달루시아가 되어 일희일비하지 않는 진중함을 배우고 싶다.
웬만해선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말이다.
그게 게으름으로 비춰진다고 해도 그 또한 나쁘지 않을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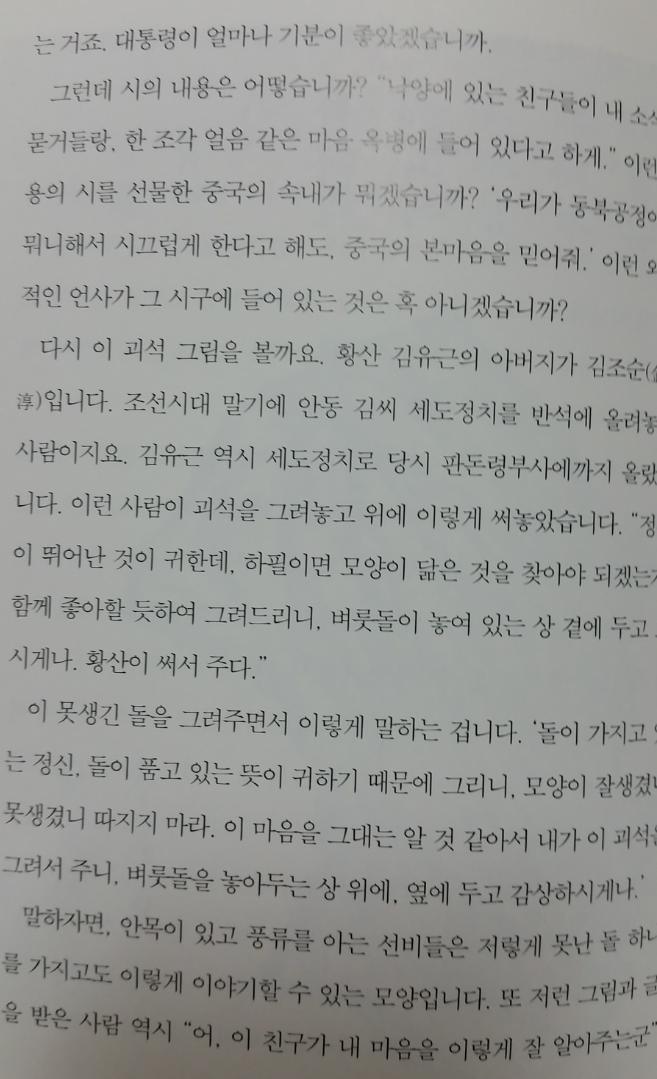
이렇게 멋진 글을 쓴 사람은 당근 손철주다.
친구에게 이 글을 얘기하며 '못생긴 돌'에 힘 주었더니,
온재부터 손철주를 읽었는데 아직도 손철주냐고 놀리는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빨리 맨 뒷장에 이르는 게 아쉬워서 라고 설레발을 치지만,
실은 눈이 쉬이 피로하여 책을 읽는게 녹록지 않다.
그에 비하면 그림은 그리는 것도 그렇고 감상하는 것도 그렇고,
눈에 부담을 휠씬 덜 준다.
늘상 강조하지만, 내가 그리는 그림 또한, 나 좋아서 아무렇게나 뚝딱이기 때문에 피로하면 안 그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눈에 압박감이 덜 하다.

흥, 손철주의 음악이 있는 옛 그림 강의
손철주 지음 / 김영사 /
2016년 11월
손철주의 책을 보게 되면, 친구와의 사귐에 대해 이렇게 귀띔을 해준다.
친구와의 사귐에서 미더운 우애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친구와 친구 사이의 미더움이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소통(疏通)에서 생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가 소통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어느 분야나 조직을 막론하고 소통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ㆍㆍㆍㆍㆍㆍ그러니까 소통의 전제로 첫째,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둘째, 대화에 있어서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겠습니다. 소통이 되려면 수평적이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처럼 서로 나란히 마주 보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여야 하는 것이죠. 셋째, 상대방을 불편한 자리에 놓아두고서는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에 편안히 앉아 있고 상대방은 바깥에 불편하게 서 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대화하자"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림을 보면, 이 집에 사는 아이도 손님을 모시고 온 시동에게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마당을 내어줍니다. 신분과 계층 간의 간격을 허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때어주면서, 내가 앉아 있는 의자를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통의 시작입니다.
요즘 참 많은 사람이 소통을 애기하지만, 좀 갑갑합니다. 네가 나를 알게 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게 소통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알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곧 소통입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문을 활짝 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나누고, 바깥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안으로 맞아들여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나를 알리려고 하지 않고 ,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쩌나 안타까워하다 보면 자연스레 스통이 되지 않겠습니까.(128쪽)
'소통'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잘못된 발상이란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줬으면 나를 제대로 해석해주길 염원한다.
내가 너를 알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지 않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좌절한다.
이같은 내 마음을아는지, 최승자는 이런 시 한편을 남겼다, ㅋ~.
번역해다오
- 최 승 자 -
침묵은 공기이고
언어는 벽돌이다
바람은 벽돌담 사이를
통과할 수 있다
나는 네 발목을 붙잡고 싶지 않다
지금 내 손은 벽돌이지만
네 발은 공기이다
통과하라. 나를.
그러나 그 전에 번역해다오 나를
내 침묵을 언어로
내 언어를 침묵으로
그것이 네가 내 인생을 거쳐가면서
풀어야 할 통행료이다.

연인들
최승자 지음 / 문학동네 /
1999년 1월
하려던 얘긴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진중함도 아니고, '나를 번역해다오'하는 소통에 관한 애기도 아니다.
그동안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진 덕에 이리저리 튀는 짬뽕공 같은 나를 이해해주려 애쓰신 알라딘 서재 이웃들에게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내가 너를 알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끝으로 어제, 오늘 이틀에 걸친 '1일1그림'의 제목은 '고맙다, 친구야'이다.
'친구야' 자리에 고마운 알라딘 서재 이웃들의 닉네임을 하나씩 넣어도 좋겠다.
나이가 드는건지, 늙는건지...체력이 딸리고, (달리고,ㅋ~.)
쉽게 소진하고 방전되는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요며칠 시름시름 앓는다.
새해에는 우리 건강 관리 잘 해서 같이 나이 들어 가자, 친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