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to : 한겨레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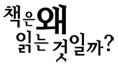
책은 왜 읽는 것일까?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유력한 답의 하나는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책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음을 깨닫게 된다. 물론 책을 읽으면서 기존의 지식과 가치관을 재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책을 포함한 사물들로부터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상을 빼낼 수는 없는 법”이라고 철학자 니체는 쓴 바 있다. 그의 말은 옳다. 동시에 틀리다(옳으면서 동시에 틀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책의 세계에 어울리는 역설이라 하겠다). 나 같으면 니체의 말을,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것을 책을 읽으면서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 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던 어떤 것을 포함해서, 책은 기존의 상식과 주장을 뒤집어엎는 데에 본디 기능이 있다. 그렇다면 왜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존재의 확장과 심화의 길이기 때문이다.
페터 빅셀이라는 스위스 작가가 있다. 그의 책 가운데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제목의 책은 1970년대부터 여러 번에 걸쳐 번역 소개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것이 그가 독일어로 낸 원저의 제목이 아니라 책에 수록된 작품 한 편의 제목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의 작품 여럿을 편역해서 낸 한국어판 책의 제목인 『책상은 책상이다』가 워낙 유명해져서, 페터 빅셀 하면 『책상은 책상이다』의 작가로 통하게끔 되었다. 그의 작품들은 대체로 콩트에 해당하는 짧은 길이의 것들인데, 그 짧은 분량 속에 담긴 통찰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 ‘다르게 생각하기’로서의 책 읽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거리를 벅찰 정도로 많이 전해 주는 책이다.
그의 대표작인 셈인 「책상은 책상이다」는 사물들의 이름에 의문점을 지니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하루하루 변함없는 일상에 권태와 짜증을 느끼게 된 이 남자는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 세상을 삐딱하게 보기 시작한다. 마침내 그는 생각한다: “왜 침대를 그림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의 의문은 일견 어처구니없어 보이지만, 동시에 지극히 타당한 것이기도 하다. 동일한 사물이라도 나라마다 또는 언어권 별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게 엄연한 현실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같은 언어권이라 하더라도 지역과 계층, 연령에 따른 방언까지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개인별 방언’이 없으란 법도 없지 않겠는가. 마침내 그는 사물들을 제멋대로 바꿔 부르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낱말 바꾸기를 시도한다: 침대 → 그림, 책상 → 양탄자, 의자 → 자명종, 신문 → 침대, 거울 → 의자, 자명종 → 사진첩, 장롱 → 신문, 양탄자 → 장롱, 그림 → 책상, 사진첩 → 거울…. 명사 수준을 넘어 동사와 형용사, 능동태와 수동태 수준까지 바꿔 치기를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 난해시를 닮은 이런 근사한(?) 문장이 나온다: “아침에 그 늙은 발은 오랫동안 그림 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아홉 시에 사진첩이 세워졌다. 그 발은 벌떡 시려워서는, 아침이 쳐다보지 않도록 그가 깔아 놓은 장롱 위에서 뒤적여졌다….”
이 가엾은 남자가 결국 다른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뒷이야기는 그닥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무언가 남과 달리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이다. 페터 빅셀의 다른 작품들 역시 이 남자처럼 남다른 개성과 고집을 지닌 인물들을 등장시킨다. 기차 시간표를 줄줄 외우면서 정작 기차는 한 번도 타 보지 않은 사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겠노라며 여든 살 고령에 길을 나서 돌아오지 않는 남자, 40년이 넘도록 작업실에 틀어박혀 ‘텔레비전’을 발명했으나 바깥 세상에서는 벌써 오래 전에 텔레비전이 등장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남자…. 페터 빅셀의 인물들은 비타협적 외골수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확실히 원만하고 상식적이지 않으며, 만약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다면 어쩐지 불편해질 것만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밉거나 한심스럽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가 자명하다고 여기며 반성도 회의도 하지 않은 사물과 상황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옳은 것인가, 상식이란 정말로 보편적 진실 또는 진리일까. 이런 회의와 반성이야말로 예술과 과학의 토대라는 것이 내 믿음이다(그런 점에서 예술과 과학은 통한다). 책을 읽는 일은 오래 입은 옷처럼 편안한 지식과 가치를 다시금 냉정하게 돌아보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는 다소간의 불편과 거부감이 따르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초의 불편과 거부감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발견, 그리고 넓고 깊어진 자기 자신이다.

최재봉│1961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 경희대 영문과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한겨레신문사에서 문학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역사와 만나는 문학기행』 『간이역에서 사이버스페이스까지 - 한국문학의 공간탐사』 『최재봉 기자의 글마을통신』이 있고, 옮긴 책으로 『에드거 스노 자서전』 등이 있다.

*본 칼럼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과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