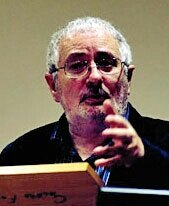제목만 보고 저자를 가늠하기 어려운 책이다. ‘윤리학 연구‘라는 부제도 그 어려움을 덜어주지 않는다. 통상 문학비평가로 알려진 테리 이글턴의 <낯선 사람들과의 불화>(길)다. 번역본을 보고서야 원서 표지가 떠올라 확인해보니 구매내역에 빠져 있다. 늦게라도, 아니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다. 원서도 주문해야겠다.
이글턴의 책도 부쩍 자주 출간되고 있는데 <문학 이벤트>(우물이있는집)가 나온 게 불과 지난해 가을이었다. 미처 한권을 다 읽기 전에 다른 책이 나오는 페이스다(읽고 나서 다음 책을 가다리던 때가 대체 언제였던가). 시험에서 문제를 한창 풀다 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식이니 개운하지는 않다. 방법은 읽던 책도 읽으며 새책도 보는 식으로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이다. ‘두 책 살림‘ 내지 ‘여러 책 살림‘이라고 해야 할까.
원론적으로 보자면 사태가 그 정도에서 수습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저자의 책만 따라붙는 게 아니라서다. 가령 <낯선 사람들과의 불화>에서 이글턴은 ˝이 책의 논점은 꽤 분명하다. 대부분의 윤리 이론들은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라는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학의 세 범주 가운데 하나 혹은 이 세 범주의 이런저런 조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운을 뗀다. 라캉 정신분석의 윤리학적 해석 내지 적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 라캉과 정신분석의 윤리에 관한 책들도 자연스레 떠올릴 수밖에. 대표적으로는 알렌카 주판치치의 <실재의 윤리>(도서출판b)도 바로 거명할 수 있다. 라캉 관련서야 다 거론하려면 입이 아플 정도다. 여하튼 다음 책이 또 도적처럼 출간되기 전에 <낯선 사람들과 불화>는 끝내야겠다. 가급적 봄이 오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