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발견' 거리가 몇 권 되는데, 그 중 하나로 셸던 솔로몬 등이 쓴 <슬픈 불멸주의자>(흐름출판, 2016)를 고른다. '인류 문명을 움직여온 죽음의 사회심리학'이 부제. 죽음을 주제로 한 책은 적잖게 쏟아지고 있지만 '죽음의 사회심리학'이란 문구에 끌려서 관심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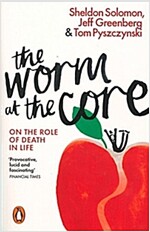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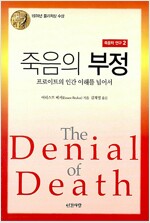
"저자들은 실험집단에게는 그들이 언젠가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통제집단에게는 별다른 언질을 주지 않는 실험을 설계하여 500건이 넘는 실험과 연구를 통해 '죽음의 공포'가 소비, 투표, 재판, 자선활동, 애국심 등 인간의 판단과 활동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동기임을 입증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이 '죽음의 공포'가 주는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원저도 펭귄에서 나왔길래 주문했다. 원제는 '핵심 속의 벌레'. 죽음에 대한 비유겠다. 죽음에 대한 고전적 저작으로는 어네스트 베커의 <죽음의 부정>(인간사랑, 2008)이 있는데, 절판됐고 번역도 신뢰할 만하지 않다. 재번역돼 나오면 좋겠다.



죽음에 관한 의학적 접근으로는 아툴 가완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부키, 2015)가 당분간은 대체불가 도서.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신 없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알마, 2014)는 제쳐놓았던 책인데, 가완디의 책에 이어서 읽어보려고 한다. 유작으로서 히친스의 암 투병기이자 죽음에 대한 사색을 담고 있다. 존 그레이의 <불멸화위원회>(이후, 2012)는 죽음을 극복하려는 '이상한 시도'들을 냉정하게 비판한다. <슬픈 불멸주의자>와 짝이 될 만하다...
16. 11. 06.